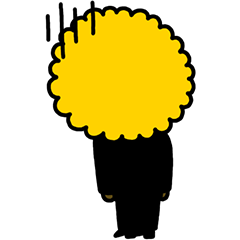일본 요양원에서 만난 전라도 할머니 <5>
by
May 25. 2025
요양원의 데이서비스(주간보호)의 하루일과가 끝날 무렵,
송영차량으로 전라도 할머니를 모시고, 할머니 댁으로 가던 중,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힘 빠진 목소리로, 옆 조수석에 앉아있던 요양보호사에게 말했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너무 피곤한데, 퇴근길에 가볍게 맥주나 한잔 할까요?”

“너~무 좋죠”
그때, 뒤에서 듣고 있던 전라도할머니가 대화 속으로 갑자기 들어오셨다.
“야‼️나도 갈래‼️나도 데꼬가‼️”
“네⁉️그건 쫌...”
“나도 술 좋아해야~ 나도 데꼬가! 내가 사줄랑께!”
“아니... 그건 쫌 곤란...”
떼쓰는 할머니를 달래서 집까지 모셔다 드렸으나
기어이 할머니 댁의 현관문 앞에서 들어가시지 않고, 버티시더니 한 마디를 더하시며 외치셨다.
“내가 술 사준당께‼️“
난처했던 나는 머리를 굴려 얼버무렸다.
“아... 사실, 오늘은 그냥 술 같은 거 안 마시고 집에 가려고요 “
라고 이야기 했으나, 이어지는 한마디.
“그짓말치고 자빠졌네‼️”
그리고 할머니는 정색하며
갑자기 표준어로 덧붙이셨다
“나, 너 그렇게 안 봤다~”
앞으로, 할머니 앞에서 입조심하는 걸로.
할머니도 사실 놀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예상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