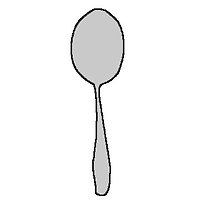저 많은 호박죽은 누가 다 주었을까
41. 단호박죽
꼬리 밟힌 강아지 마냥 낑낑 거리다가, 한 가득 울상인 얼굴로 간신히 말한다.
"....퍼"
"네, 어머님? 뭐라고요? 말씀을 좀 크게 하세요."
"...입....퍼"
"네?"
"엄마 이빨 아퍼"
이 늙은 노인네가 또 한참을 숨겼던 거다.
본인 아픈 걸.
꽁꽁.
으휴, 진짜.
"늙으면 죽어야 혀"
나이 먹으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라지만, 우리 할머니는 진짜 많이도 했다.
새빨간 허풍이라는 것은 모든 식구가 안다. 할머니처럼 자기 몸을 끔찍히 챙기는 사람도 흔치 않으니까.
예를 들어볼까. 남들은 할머니 생신 선물로 건강식품이나 영양제를 종종 한다지만, 우리는 그래본 적이 없다. 왜냐. 어지간한 영양제는 이미 할머니에게 있기 때문이다. 소문난 약은 애진작에 할머니 약통에 들어 찬다. 어디선가 스스로 구해 오신다.
약 뿐이랴. 뭐가 어디에 좋다더라 하면, 악착 같이 찾아 드시고. 뭐가 또 기가 막히다 하면, 또 아득바득 챙기시고. 젊은 우리가 혀를 내두를 정도로 철저하시다.
그러나 이것이 꼭 삶에 대한 집착 때문은 아닌 것 같다. 개똥 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지만, 꼭 이승에 발 붙이고 싶어서만은 아닌 것 같다.
할머니가 스스로를 챙기는 건, 아무래도 당신의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서인 것 같다.
늘그막에 자식놈에게 짐이 될까봐. 행여나 아들 내외의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 닥칠까봐.
그래서 할머니는 건강에 지독하신 것 같다.
안 간다고 떼 쓰는 노인네를 억지로 끌고 간 치과. 치료실에서 나온 할머니가 엄마를 보더니 너털웃음을 터뜨리신다.
"안 올 걸 그랬어 야"
"왜요"
"아파 죽는줄 아라쏘"
너스레 떠는 할머니를 보고 엄마는 안심했다.
늙으면 애가 된다더니. 우리 어머님 귀엽네.
"가요, 어머님"
다음날, 퇴근한 엄마는 할머니부터 찾는다.
"저 왔어요."
"으응. 왔냐."
"이는 좀 어떠세요. 안 아파요?"
"암시롱 안 혀!"
"괜찮으세요?"
"엉! 한 개도 안 아퍼! 거기 치과 선생님이 잘 하는 가벼."
진짜일까.
이미 할머니는 우리에게 양치기다. 아파도 말씀을 안 하시니, 도무지 믿어드릴 수가 없다.
그래, 상식적으로도 쉽게 믿어지지 않는다. 재생력이라곤 떨어질 대로 떨어진 노인이 하루만에 싹 회복을 했을리가 없지 않는가.
"식사는요"
대답을 쭈뼛거리는 할머니 뒤로 허연 스티로폴 일회용기가 보인다.
"으응. 시장을 지나는데, 저그 자근집 총각이 엄마 먹으라면서 줘써."
절반이 채 안 남아있는, 누르죽죽한 무언가.
호박죽이다.
"주는데 그걸 어떻게 안 받냐. 이거 먹었더니 밥 생각이 없어 야."
이것도 늑대다. 뻔하다. 바로 어제 치과 치료를 한 할머니한테, 마침 누군가가 죽을 주었다니. 무슨 우연이 이렇게 겹칠까.
저거, 분명 할머니가 사신 거다. 아직 씹어서 밥을 먹기에는 힘들고, 뭘 안 먹을 수는 없으니, 달달구리한 호박죽을 한 그릇 사신 거다. 자식새끼들 걱정시킬 수 없다면서 굳이 노구를 이끌고 사오신 거다. 꾸역꾸역.
"알겠어요 어머님. 쉬세요."
모른 척.
엄마는 할머니 방의 문을 닫는다.
덜걱.
촌스러운 옥색 문이 닫힌다.
엔간치 커다란 통증이 다시 찾아오기까지, 우리는 할머니의 아픔을 또 모르게 되었다. 자식놈들이 걱정할새라, 할머니는 또 꽁꽁 숨길 거니까.
슬쩍 눈치는 챌 수 있을지도 모른다. 저번처럼 동네 젊은이가 재차 호의를 베풀었거나, 아니면 이번에는 시장 친구분이 선물로 사주시거나, 그것도 아니면 죽집에서 남은 재고를 행인들에게 퍼주어서, 일회용기에 담긴 호박죽이 우리집에 다시 보일 때.
어쩌면 그 때가 할머니의 통증이 재발한 때인지도 모른다. 음식을 씹지 못 할만큼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에게 티를 내지는 않는다. 호박죽을 사오신 마음을 알기에. 그걸 들켰을 때의 마음도 짐작이 가기에.
호박죽 그릇이 높이곰 쌓여가면
그저 순진하게
우리는 궁금해할 뿐이다.
저 많은 호박죽은 누가 다 주었을까
라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다.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다.
이 빠진 할머니가 헤헤 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