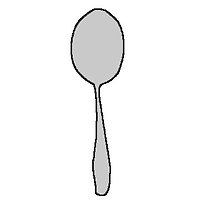by
May 21. 2024
편의점 김밥을 데워먹지 않는 이유
40. 김밥볶음밥
엄마는 보따리상이었다.
스스로의 자존심과 맞바꾼 직업이었다. 몸통만한 나일론 가방을 비껴메고, 때꾹물로 질척거리는 시장바닥을 누비셨다. 생계를 위해서였다.
쨍한 보라색 가방 안에는 이것 저것 많이도 들었었다. 삐에르 가르뎅 윗도리, 메트로시티 3단 우산, 태평양 화장품. 물건 열 개를 팔면 한 개는 꽁으로 생기는 거라면서 참 바삐도 돌아다니셨다.
시장 사람들은 엄마 물건을 간간히 사주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우리 엄마는 시어매를 지극히 모시는 효부로 소문이 나있었기 때문이다. 효심 지극한 아낙네의 부지런함이 구매자들의 마음을 건드린 거다.
시장에서 걸어서 5분쯤 거리에는 초등학교가 하나 있었다. 동네가 동네다보니, 시장집 자식들이 참 많았다. 국민학교 시절에는 아빠와 고모가 그 학교를 다녔고, 초등학교 시절에는 나와 동생이 다녔다.
서른 명이 좀 넘는 한 반에서 네댓 명은 장사꾼 집안이었던 것 같다. 이불가게 딸내미도 있었고, 문방구집 아들내미도 있었다. 나와 동생은 보따리상 아들딸이자, 생선가게 손자 손녀였다.
방문판매원이라는 말을 알게 된 건, 먼 훗날의 일이었다.
우리 부모님도 자식들에게 좋은 걸 입히고, 좋은 걸 먹이고 싶으셨을 거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우리는 빨간 딱지가 언제 날아올지 몰라 두려워했고, 한 달 가까이 라면으로만 끼니를 떼우기도 했다. 종국에는 가게도 넘어가고 집도 날아가며, 할머니는 고모네서 불편한 더부살이를 하기도 했다.
실패였다. 전적으로 우리 엄마 아빠를 탓할 수는 없을지언정, 실패는 실패였다.
안타깝게도 그 실패는 20년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도 그 흔적이 짙다. 엄마 아빠는 아직도 빚을 갚고 있고, 본인 이름으로 된 집을 못 갖고 계시다. 내년이면 다시 또 월세집을 구해야 한다. 이번에는 어디로 갈 수 있을지, 아직 모른다.
요즘은 편의점에 김밥이 참 많다. 처음엔 삼각김밥만 몇 개 파는 것 같더니, 이젠 삼겹살 김밥, 제육볶음 깁밥, 계란말이 김밥까지. 김밥 종류만 수 십 개는 되는 것 같다.
편의점 김밥은 그 특유의 맛이 있다. 딱히 고급진 것도 아니고 감칠맛이 돋는 것도 아닌데, 무언가 묘한 느낌이 있다. 개인적으로 그 느낌이 싫지 않아서 가끔씩 제 돈 주고 사먹기도 한다.
다만, 한 가지. 어떤 김밥을 사먹든, 데워먹지는 못 한다. 냉장진열된 김밥 속 고깃기름이 허옇게 씹힐지언정, 단 1분도 전자레인지에 돌리지는 못 하겠다.
이 역시 흔적이다. 20여 년 전 가난이 남긴.
할머니 생선가게 건너편에는 떡볶이집이 하나 있었다. 이름도 정겨운 만나김밥. 어느 동네나 있을 법한 상호였다.
공교롭게도 그 집 아들이 내 동생과 나이가 같았다. 둘은 초등학교를 함께 다녔다. 2개 학년쯤은 반도 같았던 것 같다.
워낙 생활반경이 비슷하다보니, 엄마들끼리 친해지는 건 마땅한 일이었다. 엄마들은 자식들을 함께 공부시키고, 학교생활을 공유하고, 시장에서 수다를 떨었다.
자연스럽게, 그 쪽은 우리집 사정을 얼추 알게 되었다.
장사치들은 작은 손해도 보지 않으려 한다지만, 시장에서 자란 내겐 그다지 공감되는 말이 아니다. 그 많은 시장 할머니들이 내 손에 얼마나 많은 용돈을 쥐어주셨던가. 그건 결코 이익을 계산한 행동이 아니었다.
떡볶이집 아줌마도 그랬을 거다. 우리 엄마에게서 옷가지를 사간 건. 심지어 단골이 된 건.
필요에 의해서만은 아니었을 거다. 전혀 필요치 않은 물건을 산 건 아니었으되, 우리집을 위한 선의가 조금은 얹어졌을 거다. 그래서 하루종일 불판 앞에서 떡볶이를 팔아가며 얻은 돈을 선뜻 건내었을 거다.
게다가 그게 다가 아니었다. 호의는 더 이어졌다.
여느 때처럼 시장에서 방문판매를 하고 돌아온 엄마. 그 날은 한 쪽 손에 커다란 검정 비닐봉다리를 들고오셨다. 이럴 땐 보통 먹을 거였다.
신나서 엄마에게 쪼르르 달려가 봉다리를 열어보았다. 활짝.
"오, 웬 김밥이에요?"
그 안에는 김밥이 그득히 담겨있었다.
"응, 너희 먹으라고~"
대수롭지 않은 듯 엄마가 얘기하셨다.
하지만 딱 봐도 뭔가 이상했다. 평소에 보던 모양새가 아니었다.
보통 김밥집에서 김밥을 팔 때는, 투명한 플라스틱 용기 안에 가지런히 김밥을 썰어담고 노란 고무줄로 뚜껑이 벌어지지 않게 싸둔다. 김밥천국 이후, 알루미늄 호일로 둘둘싼 포장법이 자리잡기 전까진 그게 국룰이었다.
헌데 엄마가 가져오신 김밥은 해외에서 병행수입하는 벌크 제품 포대 같은 모양새였다. 대충 와르르 쏟아 부은 생김새. 조각난 김밥들과 이탈한 속재료들이 몸을 부대끼며 뒤섞여 있었다.
김밥을 응시하는 시간이 길어지자, 엄마가 털어놓으셨다.
"떡볶이집 아줌마가 너희 먹으라고 주셨어. 어차피 내일이면 못 판다면서."
그랬다. 가게들이 슬슬 문을 닫는 저녁 시간. 내놓았던 김밥을 정리하던 아줌마 눈에 마침 우리 엄마가 보인 거였다.
김밥은 원체 유통기한이 짧다. 한 나절 안에 다 팔아야 한다. 남은 건 버려야 한다.
그래서 아줌마는 겸사겸사 김밥을 봉다리에 쏟아 넣고 우리들 먹이라며 엄마 손에 들려보낸 거였다. 어차피 버릴 거라고, 버리면 아깝지 않냐고 얘기하셨을 거다. 그 말에, 엄마는 큰 미안함 없이 들고 올 수 있으셨을 거다.
그런데 그게 정말 모두 버릴 김밥이었을까. 모를 일이다.
어쩌면 우리집을 위해 짐짓 평소보다 더 많은 김밥을 싸놓으시진 않았었을까. 우리를 향한 은근한 배려가 아니었을까. 그 때도 몰랐지만, 여전히 모를 일이다.
"엄마가 얼른 밥 해줄게?"
부엌을 향하는 엄마 손에서 마구 담긴 김밥 봉다리가 덜렁거렸다.
그리 오래지 않아, 김밥은 볶음밥으로 바뀌어 밥상에 올랐다.
김밥볶음밥은 부스러진 김밥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었다. 볶음밥은 어차피 재료들을 산산히 볶아내는 거니까, 무너진 김밥 꼴이 그닥 이상하지 않았다. 후리가케처럼, 김밥재료는 볶음밥 속 곳곳에 흩뿌려 박혔다.
물론 완벽히 말짱하지는 않았다. 예컨대 김이 그랬다. 한 때 야무지게 갖가지 재료들을 감싸쥐었을 김밥김이 괴이한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거뭇하게 뒤틀린 그것은 흡사 뱀허물 같았다.
어쨌든, 미처 팔리지 못하고 버려질 뻔했던 식은 김밥들은 새로운 쓰임을 받고 모락모락 김을 올렸다. 다소 생소한 음식이었지만, 나와 동생은 와구와구 잘도 먹었다. 팔던 음식이니까, 당연히 맛이 없지 않았다. 처음 몇 번까지는.
그 뒤로, 우리는 김밥볶음밥을 꽤 종종 먹었다.
처음에는 별미였다. 볶음밥에서 우엉 냄새가 나는 것도 새로웠고, 결따라 풀어지는 맛살도 전에 못 보던 거였다.
하지만 거듭해서 먹을 수록, 무언가 자꾸 입에 걸렸다. 익숙해지지 않는 이질감. 따뜻한 단무지였다.
단무지가 있는 건 당연했다. 본래 김밥이었으니까. 단무지는 김밥의 정체성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김밥볶음밥에는 따뜻한 단무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 썰린 김밥들을 그대로 볶아낸 메뉴였으니까.
그러나 그게 그렇게 어색했다. 먹을 수록 이상했다. 모양은 좀 빠져도, 차라리 봉다리에 담긴 김밥을 그냥 주워먹으면 괜찮았는데, 따뜻한 단무지는 좀처럼 적응을 할 수 없었다. 어디선가 비린내가 나는 것도 같았다.
결국 몇 번의 비위상함을 겪은 뒤, 나는 따뜻한 단무지를 못 먹게 되었다.
김밥볶음밥을 먹는 날이 쌓여갈수록, 내 밥그릇에 골라낸 깍뚝 단무지도 점점 높이 쌓여갔다. 쌓인 단무지에서는 한 풀, 남은 김이 희미하게 올랐다.
얼마전에 가족 나들이를 갔다. 아빠 생신기념으로 떠난 1박 2일 나들이. 엄마는 김밥을 싸서 다른 음식들과 함께 아이스박스에 넣으셨다. 김밥은 쉬이 상하니까. 가게에서도 한 나절 밖에 못 버티는 놈이니까.
우리는 가져온 음식들로 숙소에서 저녁상을 차려 먹게 되었다. 그런데, 김밥. 아이스박스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김밥. 그새 딱딱해질정도로 차가워져 있었다.
"전자레인지에 30초만 돌리자."
굳어있는 김밥을 보며 아빠가 말하셨고, 그 말에 엄마는 그릇째 가져가려 하셨다.
"잠깐만요!"
엄마의 손이 그릇에 닿기 전, 내가 다급하게 외쳤다.
"내 것만 덜고요."
그리곤 김밥 몇 개를 앞접시에 옮겨 담았다.
"아니, 그냥 먹으면 차갑다니까? 딱딱한데?"
아들의 행동에 의아한듯 아빠가 말씀을 이으셨다.
"30초만 돌리면 되는데 왜"
"그러면 단무지도 뜨거워지잖아요."
"그게 왜?"
앗.
잠깐 멈칫하다가,
"그러게요. 따뜻한 단무지가 도통 안 먹히네요."
슬쩍 웃으며 아빠에게 말했다. 큰 사연 없다는 듯.
"참 특이하다니까"
전자레인지로 김밥을 가져가며, 엄마가 거드셨다.
다행스럽게 김밥볶음밥의 기억은 두 분께 없는 듯 했다. 식탁을 사이에 두고 동생과 나만 눈짓을 찡긋할 뿐이었다.
김밥볶음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은 큰 행운이었다. 마냥 유복한 환경은 아니었으되, 따뜻함을 충분히 먹고 자랐다. 은근한 배려를 쏟아준 이웃이 있었고, 본인을 희생한 우리 엄마가 있었다.
그래서 김밥볶음밥은 따뜻했다. 비록 편의점 김밥은 데워먹지 못 하게 되었지만, 그게 뭐 그렇게 대수일까. 전자레인지보다 따뜻한 온기를 영영 기억하며 살 수 있게 되었는데.
차가운 편의점 김밥이 오늘도 반갑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