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검진받고 27만원?
스위스 육아 단상 3
임신 초기, 서울의 한 유학원 대표님의 소개로 영국 유학 선배와의 만남 자리에 남편과 함께 참석한 적이 있다. 우리 말고도 유학을 준비하는 싱글, 커플들이 모였다. 간단히 자기소개를 했다. 남편은 박사 과정 유학을 준비하려 하고, 나도 임신은 했으나 석사 과정 유학 준비 중이라고. 그러자 네댓 살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를 데리고 온 부부 중 아내가 화들짝 놀라며 되물었다.
"부부가 같이 공부한다고요? 엄청 힘들 텐데!"
"아직 아이를 안 키워봐서 잘 모르겠는데.. 많이 힘들까요?"
"당연히 힘들죠! 아기가 아프거나 그러면 어쩌려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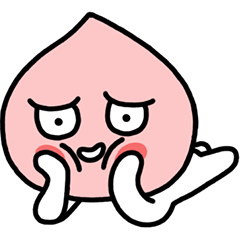
글쎄요. 거기까진 생각을 안 해봤네요...;;;
당시엔 차마 내뱉지 못하고 속으로 삼켰었다.
아이가 심한 열감기에 걸렸다. 열이 39도까지 오르고 밤에 한 시간마다 한 번씩 깨서 칭얼거린다. 남편과 교대로 불침번을 서도 잠이 부족하고, 힘들어하는 아이를 보는 마음은 더 힘들다.
일상의 모든 게 멈춰 버렸다.
스위스에 와서 병원에 가본 건 이번이 두 번째였다.
첫 방문은 공립 어린이집 등록 서류 제출(담당 소아과 의사 비상연락처 등)을 위해 정기검진을 받고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였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저렴한 의료보험과 민간 보험사 둘 다 운영되는 한국과는 다르게 스위스는 모든 거주자가 의무로 사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병원에 다녀오면 주소지로 청구서가 날아오고, 납입을 한 후에 보험사에 청구해 환급을 받는 시스템이다. 본인부담금 상한선에 따라 보험료는 다르게 책정되고, 비싼 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는 저소득층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나는 annual deductible이 300프랑인 프리미엄을 가입했다. 학생 요금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월 10만 원 정도. 내 보험사는 상한선이 100, 300, 500, 750, 1000, 1500으로 나뉘는데, 연 300프랑까지의 의료비는 내가 내고, 300 프랑이 넘어가면 보험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0세부터 18세까지는 0프랑 옵션도 있어 아기의 보험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 걸로 가입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전액 실비보험이라 해도 10%는 지불해야 했지만.
한국에서라면 소아과 예약은 아무것도 아니었겠지만, 여기서는 전화를 걸어 약속을 잡는 것부터가 부담스러웠다. 아이의 주치의를 찾을 때도 주변 소아과에 전화를 돌려 혹시 환자를 더 받을 여유가 있는지, 내 아이의 담당의사가 되어줄 수 있는지 물어봐야 한다고 했다. 매번 병원 갈 때마다 전화로 (그리고 불어로) 예약하는 건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라 집에서 좀 멀어도 (그래 봤자 버스로 네 정거장) 상대적으로 큰 메디컬센터로 정했다. 다행히 영어를 하는 소아과 선생님을 찾았다. 여긴 예약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었다.
이번에는 아이의 홍역 2차 접종을 하고 영유아 검진도 받기 위해 갔다. 병원에 도착해 간단한 서류작성을 하고 5분쯤 대기하다 선생님 방에 들어갔다.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기라도 했는지 슬그머니 도망가려는 아이를 진료실에 있는 주방놀이 세트로 유인했다. 처음 보는 장난감에 흥미를 느낀 아이는 이것저것 버튼을 누르며 보글보글 소리도 듣고 프라이팬을 입에 대고 마시는 척하며 놀았다.
"아이의 옷을 다 벗기세요."
"(헐) 전부 다요?"
"네~ 기저귀까지 다~"
주치의인 닥터 키에스의 말에 깜짝 놀랐다. 한국에서 소아과에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 기저귀까지 홀딱 벗기라고 한 적은 없었는데... 난데없이 탈의를 당한 아이는 한기가 느껴졌는지 어깨를 움츠리고 다리를 오므렸다. 의사는 청진기를 손으로 비벼 데운 다음 아이의 가슴에 대고, 등에 댔다. 귓속과 입안을 살펴보고 배 이곳저곳을 손가락으로 눌러보며 검사했다. 진찰대에 아이를 눕게 한 후 T자처럼 생긴 걸 가져와 키를 재고, 줄자로 머리둘레를 쟀다. (이에 비하면 한국 소아과는 최첨단 의료기기의 총집합이다) 체중계로 몸무게를 재고 나서는 양쪽 고환까지 세심하게 촉진했다. 왠지 아이의 몸 구석구석을 살피는 듯한 느낌이었다 (아동학대라도 할까 봐 그러는 걸까). 그리고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 체온을 재는데 아이는 낯선 상황을 무서워하며 아빠한테 안겨 선생님의 손을 밀어내기 바빴다.
우여곡절 끝에 정기검진과 예방접종을 마쳤다. 세 살이 될 때까지는 꾸준히 먹이라며 처방해준 비타민 D를 약국에서 사고 집으로 가는 길, 이번에는 얼마짜리 청구서가 날아올까 궁금해졌다. 지난번에 검진받고 예방주사 맞고서 27만 원짜리 고지서가 왔는데... 물론 본인 부담금 2만 5천 원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환급받았지만. 깜빡하고 환급 신청을 놓쳤다가는 (몹시 번거롭게도 우편 제출이다) 의료비 지출이 어마어마할 것이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번거로울 수 있는 이 과정을 스위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신기했다. 이번만큼은 확실히 한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 하고 남편에게 이야기하자 글쎄, 큰 병이 걸렸을 때는 다르지 않을까, 라는 반응이었다.
아이는 병원에 다녀온 지 이틀이 지나자 열이 오르기 시작했다. 홍역 백신 때문인지, 유치원에서 옮아온 건지, 병원에서 걸린 건지, 요 며칠 비바람이 불고 갑자기 추워진 날씨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해열제를 쓴 지 세 시간도 안되어 자꾸 열이 오르고 축 처져 있는 아이에게 다시 좌약을 넣고, 한국 약도 먹여보고, 스위스 약도 먹여보고, 보리차를 먹이고, 물수건으로 열심히 닦아줬다가, 옷을 입혔다가 벗겼다가, 안았다가 눕혔다가, 어떻게 해줘야 아이가 가장 편하게 잠들 수 있을지 고민하고 관찰했다 (실상은 허둥지둥 안절부절). 앰뷸런스를 부르면 고지서 백만 원 폭탄을 맞는다 하고, 응급실에 데려가도 오래 대기해야 한다는 소리에 섣불리 병원에 데려갈 엄두를 못 냈다. 우리가 유난 떨어서 오히려 아이를 더 힘들게 할까 봐. 그저 아이가 잘 이겨내길 바라고, 이건 성장하기 위해 꼭 겪어야 할 과정이니까 하고 되뇌었다.
다행히 일주일이 되기 전에 열이 잡혔다. 누런 코가 나오고 기침을 했지만 열이 없으니 아이는 잘 먹고 잘 놀았다. 안도의 한숨을 내쉰 것도 잠시뿐, 그 지독한 열감기는 다음 타깃을 나로 옮겼다. 아이가 아팠을 때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고열과 두통에 내 몸 하나 가누기 힘들다 보니 아이의 요구에 반응하지 못하고 자꾸 방치하게 되어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덕분에 아이는 TV를 실컷 보고 집안은 엉망진창). 이래서 엄마는 아프면 안된다고 하나 보다. 엄마가 아프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에게로 돌아오니까. (그래.. 내가 아픈 것보단 니가 아픈 게 낫다..)
앓고 난 아이는 부쩍 컸다. 활기와 식욕을 되찾고 안 하던 새로운 행동도 늘었다. 아플 땐 안쓰러워 어쩔 줄 몰랐지만 그게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걸 안다. 해외에서 병원도 제대로 못 갔는데 독한 감기를 스스로 이겨낸 아이가 대견스럽다. 아이가 해열제 없이도 잠들 수 있게 된 날, 부부가 마주보며 "휴, 이제 살았다" "고생했다" 하고 서로를 격려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럴 거다. 한국에서 안락하게 누릴 수 있음에도 밥그릇을 걷어차고 나와 불확실성이 주는 두려움을 마주한 우리도, 결국 이겨낼 거다. 한층 성숙해질 것이다.
안녕하세요, 아기키우며 공부하는 엄마 유학생 윤작가입니다.
더욱 생생한 엄마 유학기를 들려드리고 싶어 육아/학교 브이로그 찍고 편집하는 걸 연습하고 있어요.
그동안 글로만 접하셨던 엄마 유학기, 이제 영상으로도 만나보세요: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