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에 정말 눈이 올까요?
한여름의 크리스마스가 익숙한 가족의 핀란드 여행기
호주의 크리스마스는 한여름이다.
가장 더울 시기인 데다 1년 중 유일하게 거의 모든 곳들이 문을 닫는 공휴일이기 때문에 거리는 대체적으로 썰렁하다. 대형 슈퍼마켓이나 쇼핑센터도 문을 닫아서 크리스마스이브날에는 여기저기 크리스마스 만찬을 위해 장을 보는 사람들로 붐빈다. 설령 문을 연 식당이 있어도 추가 서비스 차지가 붙는 날이기에 크리스마스는 주로 가족과 집에서 보낸다.

(마틴플레이스의 크리스마스트리)


(최근 아이들의 일상)
무더위 속의 크리스마스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캐럴을 들어도, 트리를 꾸며도 크리스마스의 분위기가 나지 않아 투덜대곤 했다. 적어도 크리스마스엔 '흰 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정도는 느껴봐야 하는 것 아닌가? 반팔 반바지도 모자라 땀을 뻘뻘 흘리며 공원에서 소시지를 굽고 있다 보면, 캐럴이 울려 퍼지는 눈 오는 북반구의 겨울은 실로 꿈만 같은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는 꿈속으로 떠나기로 결심했다.
크리스마스를 가장 크리스마스답게 보낼 수 있는 곳.
태어나서 눈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아이들이 실컷 눈놀이를 할 수 있는 곳.
허스키가 끌어주는 썰매와 오로라를 경험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실존하는' 산타클로스를 만날 수 있는 곳


우리는 핀란드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기로 했다.
크리스마스를 북유럽에서 보내는 것의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비행시간이다.
시드니에서 싱가폴까지 8시간 20분, 헬싱키까지 13시간 40분, 로바니에미까지 1시간 30분
비행시간만 총 23시간 30분에 달하는 대장정이다. 어린아이 둘을 데리고 23시간에 걸친 비행 스케줄을 소화한다는 것은 해보기 전까지는 미친 짓이라 생각했으나, 작년에 떠났던 파리 여행의 좋은 기억으로 다시금 도전할 용기를 내보았다.
또 다른 걸림돌은 추위다. 호주에서도 시드니는 영하권으로 내려가는 일이 없다. 시드니 도심에서 3-4시간 떨어진 곳에 간헐적으로 눈소식이 들려오긴 하지만 지난 26년간 시드니에 살며 눈 소식은 들은 적도, 앞으로 들을 일도 없다. 겨울에는 가장 추워도 영하로 내려가지 않고, 여름에는 40도를 넘어가는 더위와 싸워야 한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음은 물론 남편과 나 조차도 눈을 마지막으로 본 것이 첫째를 낳기 전 뉴질랜드 남섬으로 스키여행을 떠났을 때이다.
어제도 시드니의 날씨는 38도를 육박했다. 한여름에 영하 20도에 육박하는 핀란드 날씨를 견딜만한 제대로 된 방한용품을 구하기도 어렵지만, 스키 용품 전문점의 어마무시한 가격을 보고 나니 한번 입고 말 옷에 돈을 투자하기가 너무 아까웠다. 다행히 한국을 자주 오가는 가족들이 있어 대충 구색은 맞추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추위에 대비하기란 너무 막연한 일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겨울 나라에 가기 위해선 어마무시한 짐꾸러미를 동반해야 한다. 여름인 나라(이지만 건조해서 참을만한)에서 출발해서 습하고 뜨거운 싱가폴을 거쳐 갑자기 북극권의 나라에 간다는 것은, 사계절 모두의 옷을 챙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리 밀어 넣고 쑤셔 넣어도 커다란 캐리어 두 개로는 역부족이다. 10년 전 인도 여행을 마지막으로 꺼내지 않았던 40L짜리 배낭까지 꺼내 꽉꽉 채워 짐을 쌌다.


(하지만 컵라면은 못 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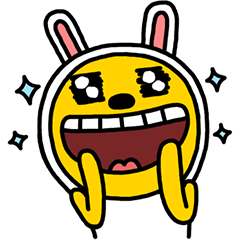
여권도 확인.
스케줄도 확인.
면허증도 확인.
이제 비행기만 제대로 뜨면 된다.
벌써부터 험난한 로바니에미로의 여정.
오로라를 꿈꾸며, 이제 곧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