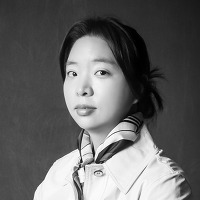친절한 그 밥집에 안 가는 이유
그냥 고객님이라 불러다오
우리 집 주변에 두 개의 김밥집이 있다. 그런데 나는 그중 한 집에만 간다.
A 김밥집은 건실한 청년들이 운영하는 곳이다. 20대 청년이 자신의 어머니가 하던 김밥집을 물려받은 사례다. 매우 파이팅 넘치는 청년이 싹싹하게 운영한다. 동네에서도 매우 유명할 정도로 씩씩하다. 지나가는 아저씨에게 "형님!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인사하고 아침에 빗질을 하는, 소설 '원미동 사람들' 같은 곳에서 나올법한 사람이다. 조금 더 쉽게 묘사해 보면 연예인 노홍철 같은. 그래서인지 유명 유튜브에도 나왔다고 한다.
그 정도로 친절하고 싹싹한데, 어머니가 오래 한 김밥집이므로 꽤 오래된 음식 이모님들도 계셔 맛도 나쁘지 않다. 내 스타일의 밥맛은 아니지만 푸짐하고 맛도 괜찮아서 저렴한 편은 아니어도 직장인들의 사랑을 받는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모두 젊고, 3명의 청년과 1명의 여성 아르바이트생이 있다. 그 집 주변에만 가면 들썩들썩할 정도의 분위기를 유지한다. 마감 시간에는 싸이의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청소를 하는. 그런 곳이다.
A 김밥집에서 길을 두 번 건너야 하는 B 김밥집 역시 나름 인기가 있다. 김밥 한 줄 + 떡볶이 반인분 + 순대 조금 세트가 8500원인데 이 세트가 은근 가성비가 좋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떡볶이와 순대 김밥을 모두 조금씩 먹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환영받는 메뉴이다.
이곳은 청년들이 들썩들썩하게 운영하는 A와는 다르게 50~60대 아주머니들 3명이 계신다. 주인아주머니는 우리 엄마뻘 되어 보이는, 60대의 아주머니이시다. 사실 A가게에 대해서는 유튜브에도 나온 만큼 줄줄이 쓰다 보면 글 전체를 차지할 수도 있는, 그런 가게이지만 B가게는 크게 특별할 것이 없는 가게이다.
그런데 나는 어느 날부터 A가게 김밥집은 슬슬 피하게 됐고, B가게에서만 김밥을 사게 됐다.
 B김밥집의 김밥.
B김밥집의 김밥.굳이 이야기하자면 계기가 있다. 누군가에게 말하기도 좀 쪼잔한 일화이긴 하다.
어느 날처럼 나는 A가게에서 김밥을 포장 주문했다. 이곳의 단점은 손님이 많아서 김밥 한 줄을 주문해도 거의 10분은 기다려야 한다. 지루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반가우면서도 헉스러운 부름이 벌어졌다.
"어머님~ !! 김밥 한 줄 포장이요."
어머님.... 음, 나였어? 아하. 넵넵 하고 김밥을 받았다. 내가 아기띠를 하고 10개월 된 아기를 둘러메고 있었지만 좀 황당한 부름새였다.
솔직히 그 청년은 20대 초중반으로 보이진 않고 20대 후반~30대 초반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나랑 몇 살 차이도 안나잖어. 나는 30대 초반이냐 중반이냐를 논란으로 부칠 수도 있는 34세이다. 생일이 지나면 35세이지만.. 여하튼 34세인 나에게 아무리 아기를 업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머님'이라는 호칭은 정말로 낯선 것이었다.
그냥 차라리 고객님이라고 불러라...
황당한 얼굴을 애써 감추고 '그래 애기 엄마니까 어머님 맞지'하면서 김밥 한 줄을 터덜터덜, 받아왔다. 집에 와서 씹는 김밥맛은 정말 하나도 맛이 없었다.
어느 날 그 집 근처를 지나는데 내 또래 애기엄마한테도 또 '어머님~ 김밥 나왔어요.'라고 말하는 걸 봤다. '아니 애기만 데리고 있으면 다 어머님이라고 하는구먼? 어머님이 맞긴 하는데 그렇게 부르면 애기 엄마들 싫어해요. 저 애기엄마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구먼...ㅜ'이라고 생각하며 길을 건너 B 김밥집으로 향했다.
그렇게 싹싹하고 친절한 사람이, 왜 20~30대로 보이는 애기엄마들에게 '어머님'이라는 호칭을 쓸까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저 호칭은 너무나 '전략적'이지 않다.
내가 우리 아기의 어머니 뻘이지, 30대 처럼 보이는 청년의 엄마뻘은 아니지 않는가. 한참 양보해 20살에 애를 낳았다 하더라도 초등~중등의 엄마뻘이다. 그렇기에 청년이 아무리 나를 '아기 엄마'로 인식했다해도 '어머님'으로 부른다면 어색한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다. 미용실에 가면 난 항상 "아기가 있어서 머리는 항상 묶어서요, 머리 묶을 때 이쁘게 앞머리 펌만 할게요"라고 말한다. 그러면 미용실의 디자이너는 놀라지 않았겠지만 화들짝 놀라는 척을 하면서 "아니? 아기가 있으시다고요?? 결혼도 안 하신 것 같은데요!!!"라고 말한다.
이것이 장사의 기본 아닌가. 김밥집 청년은 참으로 순수했지만 전략적이지 못한 것 같았다. 그렇기에 나 같은 밴댕이 속알딱지 손님을 놓친 것이다.
반면 B 김밥집은 아주머니 세 사람이 항상 열심히 김밥을 말고 있다. 아기띠를 메고 들어가면 아주머니들은 '아가야~ 어서 와~' 등 아가에게 먼저 말을 거신다. 이때 나는 신참 '새댁'이 된다. 한참 아기를 다 키우고 이제는 엄마 손길이 적게 드는 자식들을 보유하고 계실 듯한 어머님들 앞에서 나는 웃는다. 이렇게 청년 김밥집 A에 가면 나는 '어머님'이 되지만 아주머니들이 계신 B 김밥집에서는 '새댁'이 되는 것이다.
A집에 안 가고 B집에 들락거린 지 꽤 됐다. 그런 A집을 지날 때마다 '내가 너무 쫌생이인가.' 싶은 마음에 찝찝함을 금할 수 없었다.
그런데 최근 박완서 샘의 미공개 에세이를 묶은 '사랑을 무게로 안 느끼게'를 읽으면서, 완서 작가님도 나와 비슷한 일화를 겪으신 것을 읽었다.

사실 이 기분은 수많은 사람들이 느껴본 평범한 기분이긴 할 것이다. 그래서 굳이 쓸 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글을 보고 나도 한 번 남겨봐야겠다고 생각해서 썼다.
완서샘의 1983년작 '나의 아름다운 이웃'이라는 에세이 이야기다. 이 에세이는 완서샘이 27년 동안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 한옥집을 떠나 아파트로 이사가게 되면서 '새댁'에서 '할머니'로 격상(?)된 충격을 전한다. 시골의 한옥집에는 주변 이웃들이 모두 노인들이라 '아가', '새댁'이라 불려 왔지만, 아파트로 이사를 오니 모두 젊은이들이었고 젊은이들이 '할머니'라 부르니 화가 나더라는 일화다.
새댁에서 별안간 ‘할머니’로 격상(格上)된 충격은 매우 고약했다. 가슴이 울렁이고 팔다리에 힘이 빠졌다. 그리고 젊은 여자들만 사는 동네에 담박 정이 떨어졌다. ‘새댁’에서 아직 ‘아주머니’도 안 거쳤는데 ‘할머니’라니 말도 안 돼. 젊은것들이란 뭘 제대로 볼 줄도 모르고 말버릇도 엉망이거든. 이렇게 속으로 분개했지만 할머니 신세를 면할 뾰족한 수는 없었다.
- <사랑을 무게로 안 느끼게>, 박완서 -
이 대목을 읽고 혼자 빵 터졌다. 사실 A김밥집의 '어머님 사건'이 없었더라면 나는 이 대목을 읽고 '아니 할머니를 할머니라 부르지 그럼 뭐라고 불러'라고 공감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도 대놓고 애기를 업고 간 어머님이었지만 어머님이라고 불림당하자 분개했다. 젊은것들이란 뭘 제대로 볼 줄도 모르고 말버릇도 엉망이거든. 이 부분에서 현실 웃음이 빵 하고 터져버렸다. 완서샘 날 가져요.
여하튼 완서 샘도 이렇게 분개를 하시는데, 나 같은 범인은 당연히 분개해도 되겠지? 하는 허가증을 받은 것 같은 글이었다.
A 김밥집에 더 이상 가지는 않지만, 그 청년의 씩씩함과 들썩거림은 언제 봐도 기분 좋은 것이긴 하다. 그가 조금 더 장사에 연식을 쌓고 순수함을 잃으면 '어머님' 대신 '고객님'이라 부를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