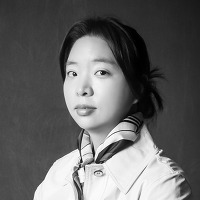예뻐서 하는 요리
예쁜 게 최고야, 늘 짜릿해
얼마 전 '행복해지기 위한~'으로 시작되는 책을 읽었다. 행복해지기 위해 책에 소개된 것들을 따라 하면 된다는 책이었다. 얼마 못가 나는 책을 덮어버렸다. 틀린 소리가 적힌 건 아니었지만 책의 목적에 그다지 동의하지 않았다. 나는 행복을 위해 사나? 내가 제일 추구하는 가치가 행복이 맞나? 내가 가장 추구하는 가치가 행복인 것 같지 않았다.
그렇다면 난 무엇을 위해 살까.
얼마 전 자기 계발 유튜브 김미경 TV에서도 김미경 씨가 이와 비슷한 고민을 털어놓은 영상을 본 적 있다. 자신이 매일 새벽에 일어나고 공부를 치열하게 하고 '독하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열심히 살아왔던 나날들을 회상하며 스스로 왜 이렇게까지 고생하며 살까 고민해봤다고 한다. 그가 내린 답은 '책임감'이었다. 그는 행복보다 책임감이 채워지는 삶을 추구했기에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다고 한다. 그 답을 내리고 그는 열심히 사는 것에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됐다고 한다.
그녀의 답이 내 답과 같진 않았다. 행복, 책임감, 정의, 윤리, 가족 등 여러 답들이 각자에게 있겠지만 나는 그 답이 '멋'이었다. 내가 엄청 멋있는 사람이 아닌데, 삶에서 멋을 가장 추구한다고 말하려니 쑥스럽지만 나에게 답은 그것이었다. 그때그때 내가 멋있어 보이는 삶을 보면서 따라왔다. 내가 추구한 멋에 항상 골인하지는 못했지만 대략 비슷한 방향으로는 갔었다.
멋이라는 설명이 아니면 들쭉날쭉 매일, 시기마다 바뀌는 내 생각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정의나 윤리, 경제에 대한 생각이 매번 바뀌어버리는 나니깐. 내 머릿속에서도 하루 수십 번 충돌하는 내 생각들을 보면서 ‘난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자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결론난 것이 난 내 눈에 예쁘고 멋져 보이는 것들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답이다.
청소년 시절엔 그게 옷 잘 입는 사람들이었고 20대엔 잘 쓴 문장들과 음악을 연주하며 황홀경에 빠진 표정을 짓는 사람들이었다. 지금은 잘 차려진 밥상이 그렇게 이뻐 보인다.

따듯해 보이는 계란, 계란 옆 소시지와 탱글한 빵. 소시지에 낸 칼집들. 오늘 빵으로 선택된 크로플의 그 질서 있는 결. 그 결 위에 좌르르 미끄러지는 시럽. 키위와 바나나가 갈려서 만든 파스텔톤 주스 색. 이것들이 조화를 이루는 브런치 한 접시. 이 그림 자체가 나에게 희열을 주고 이런 조합들을 먹어왔던 인류의 조상들에게 찬사를 보내고 싶을 정도다.
옆에 둔 꾸덕한 요거트는 또 얼마나 이쁜가. 요거트 위 어린아이가 좋아할 듯한 핫핑크 라즈베리. 뭉개진 라즈베리가 흩뿌리는 색깔과 그걸 머금은 하얀 요거트 옆 놓인 나무 수저. 결에 따라 쪼개진 코코넛 청크까지 어우러져 하나의 사진으로도 이쁜 완성태다.
음식의 이쁨에 대해서는 끝없이, 줄줄이 써 내려갈 수 있다. 치즈가 녹아내린 계란과 기름을 머금은 시금치의 색 조화란. 며칠 전 먹고 남은 치킨을 보슬보슬한 계란 옆에 뿌린 치킨 덮밥. 그 위 뿌린 마요네즈와 간장. 마요네즈에 살짝 흐르는 간장의 방울 모양.




가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도대체 무슨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지 헷갈릴 때가 많다. 결국 난 그때그때 내 눈에 이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는 가벼운 사람인 것 같다는 답을 내린다.
지난 주말엔 영화 ‘프렌치 디스패치’를 봤다. 프렌치 디스패치라는 가상의 잡지 마지막호를 하나하나 넘기는 것처럼 연출한 영화인데 형식도 내용도 모두 신선했다. 영화는 단편 몇 가지를 모은 것처럼, 잡지에 실린 몇 가지 글들을 영상으로 보여준다.
이 영화의 후반부에는 요리에 대한 글을 쓰는 기자의 이야기가 나온다. 기자는 자신이 생각하는 굉장히 위대한 요리에 얽힌 이야기를 쭉 푸는데 불쑥 사회자가 묻는다. "그런데 왜 하필 음식에 대해서 쓰십니까."
그 기자는 이렇게 답한다. "나는 외국인이다. 외국인으로 사는 나 자신에게 그 어떤 것도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다. 그러나 식당에 가면, 나를 위한 테이블은 항상 있었다"라고. 그러면서 그 성찬이 자신의 동지였다고 말한다.
정말 멋진 답이어서 미간을 찌푸렸다. 저 질문에 각자의 답은 다를 것이다. 나에게 묻는다면 그 답은 역시 "요리가 이뻐서요"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