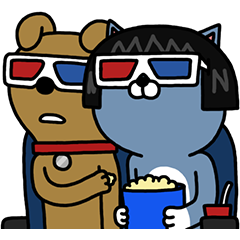9월 스톡홀름 - 같은 밥을 5일간 먹다보니
② 호텔에서 만난 한국인 부부
6일간 스톡홀름의 한 숙소에 머물렀다. 조식 메뉴가 요거트를 빼곤 매일 같았다. 나흘째 되니 담는 녀석만 담았다. 날마다 같은 자리에 앉는 (장기 투숙객으로 보이는) 현지인이 많았는데, 9월에 오나 3월에 오나 그 자리에 고대로 있을 것 같았다. "북유럽 4개국은 어딜 가나 따분하다"며 툴툴대는 빌 브라이슨이 떠올랐다. 스웨덴은 가지런히 쌓인 우유팩 같은 나라다. 쪼그마한 그 식당에서 내가 가장 좋아한 건 틀이 상아색인 창문이었다. 아침 8시 정시마다 부두에 들어오는, 물범이 그려진 크루즈 실자라인(실야라인)이 보였다. 헬싱키에서도 봤던 그 실자!(핀란드, 에스토니아, 스웨덴 해역을 운항하는 축구장 몇 개만한 배인데, 로고가 귀엽다)
치약 튜브처럼 생긴 깔레스(Kalles Kaviar)
“Swedes love it, but for the rest of us, it can be hard to swallow, unless a salty and fishy pinkish goo appeals to you.”(NYTimes, JULY 17, 2015)
밥상에 신기한 게 있다. 생긴 게 영락없는 치약이다. 깔레스(Kalles)? 파랗고 큰 튜브에는 노오란 글자가 적혀 있다. 누가봐도 메이드 인 스웨덴. 한 스웨디시 아저씨가 얇은 빵에 꾸불꾸불하게 바른다. 어린이 치약 같기도 하고, 튜브식 저염 명란 같기도 하고. 대구알로 만든 캐비어라고 적혀 있다. 냄새도 희한한 게 영 못 미덥다. 플랫브레드에 절반만 짜서 살짝 베어 먹었는데......

엥? 대.박.맛.있.어. ㅎㅎㅎㅎㅎ
옆 테이블을 보니 다들 이렇게 먹는다. 빵에 버터를 바르고 저민 계란, 오이를 얹어 깔레스로 마무리. (한국에 와서 찾아보니) 아보카도와 함께 먹어도 맛있다고 한다. 단순히 대구알 젓갈을 빵에 올렸다기엔 뭐지? 하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맛이다.
연관 검색어 중에 ‘Kalles disgust’라는 게 있다. 깔레스는 아예 이 콘셉으로 광고까지 만들었는데 다들 "웁" "더 드려요? 아뇨" 반응. 스웨디시만 냠냠냠. 그래도, 스웨덴 가면 꼭 먹어보세요!
 파랑 노랑 파랑 노랑 /사진=NYTimes
파랑 노랑 파랑 노랑 /사진=NYTimes“여행 오셨나봐요”
셋째날 아침, 호텔 식당에서 스크램블과 호밀빵, 미트볼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있을 즈음
안녕하세요 하고 합석하는 부부가 있었다. “여행 오셨나봐요" 하고 먼저 인사를 해오셨다. 그리고 사흘간, 아빠 뻘 되는 65년생 남편 분의 세 가족과 함께 식사했다. 아들이 초등학생인데, 요새는 현장학습이라는 게 있어서 보름 여행을 다녀와도 출석이 인정된다고 했다!

세 식구는 매년 스웨덴과 노르웨이에 온다고 했다. 우리의 이야기는 여느 여행객처럼, 오늘은 어디 가세요로 시작해 한국 어디에 살고 어디로 출근하는지, 나이와 교회까지 서로 알게 됐다. 아내 분의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서 10시 마감 시간이 될 때까지 커피를 여러 잔 마셨다.
라면 얘기가 또 빠질 수 없지. 밤마다 컵라면에 물을 붓는데, 포크로 면발을 집는단다. 그 얘길 듣고 한국에서 가져온 젓가락을 드렸다. 두 분은 농심 로고가 박힌 일회용을 받고서 환하게 웃으셨다. 체크아웃 당일과 그 전날 한 시간 일찍 나온 탓에 인사를 못 했다. 아를란다공항에서 같은 시각 헬싱키행 비행기를 탄다고 했던 게 생각나 기내를 쭉 둘러봤지만, 세 식구는 없었다. ㅠ 내년에도, 그 다음해에도 그 호텔에 간다고 한 세 식구. 반가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