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 이웃들
- 대전일보 한밭 춘추 기고글
일 년 전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 입주했다. 1200가구 중 대략 800명 정도가 단체 메신저 대화방(단톡방)에 들어와 있었고,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해관계가 다른 조합원과 일반 분양자가 함께 있는 단톡방 분위기는 냉랭했다.
입주가 시작되고 누군가 인테리어 때문에 철거한 자재를 나누겠다고 단톡방에 올렸다. 그러자 너도 나도 미처 정리하지 못하고 가지고 온 물건을 올리며 필요한 사람에게 주겠다고 했다. 작동이 잘 되는 소형 가전제품, 산지 얼마 안 된 소파나 식탁, 둘 곳이 애매한 책장이나 서랍, 테이블 등 아직 쓸 만하지만 새집에서 자리를 못 잡은 것들이었다.
사진에 먼저 '저요'라고 외친 사람에게 물건을 주는 게 관례였고, 나눔이 불발되면 자연스레 다음 사람에게 넘어갔다. 나눔 받은 물건을 가지고 올 때는 과일이나 과자, 음료 등 문고리에 소소한 답례를 했다. 받은 사람은 필요한 물건을 무상으로 받아서 좋았고, 나눈 사람은 필요 없는 물건을 기분 좋게 정리해서 좋았다.
여름날, 텃밭이나 주말농장을 하는 이웃들은 상추, 호박 등 직접 키운 채소들을 단톡방에 올렸다. 유기농 채소는 언제나 인기 만점이었다. 나눔을 받은 사람들은 왠지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 안 쓰는 물건을 찾아 단톡방에 올렸다. 간혹 한정판이나 값비싼 물건을 나눌 때는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해 나눔 시간을 정해서 올렸고 그것을 쟁취하는 희열도 있었다. 콜라부터 향수까지 나눔은 끝이 없었다. 나누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누가 가져갈 것인가 관망하는 사람이나 로또 당첨 번호를 기다리는 것처럼 손에 땀을 쥐고 지켜봤다.
나눔으로 안면을 튼 우리는 배송비를 절약하기 위해 먹거리를 비롯해 그릇, 샴푸, 수건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함께 구매했다. 필요한 정보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단톡방에 공유했고, 수시로 단톡방을 확인하는 게 일상이 돼버렸다.

< 퇴근 후 발견한, 이웃들이 투척하고 간 간식거리 >
필자가 코로나로 격리 중일 때는 이웃들이 먹을 것을 문 앞에 갖다 놓았다. 갈비탕, 죽, 과일, 손수 담근 동치미로 뭉클하게 했다. 회사 때문에 아이 학예회나 녹색 어머니회 등하굣길 교통봉사에 참여하지 못할 때는 이웃이 선뜻 가서 내 자리를 채워주었다. 아이가 일어났다가 다시 잠이 들어 연락이 닿지 않을 땐 단톡방에 얘기하자마자 몇 명이 앞다퉈 아이를 깨워주겠다고 나섰다. 이웃들의 마음에는 정이 넘쳐흘렀다.

< 코로나로 격리 중일 때, 이웃이 갖다 주고 간 쇠고기와 야채, 배즙 >
이 모든 것이 동네 사랑방 같은 입주민 단톡방이 있었기에, 누군가 단톡방에서 처음으로 나눔의 물꼬를 텄기에, 서로 따뜻한 말을 건네며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나눔으로 인한 선순환이 함께 살고 있는 이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은 물론 우리네 가슴속에서 메말라가던 사랑에도 몽글몽글 싹을 틔었다. 나는 오늘도 틈틈이 단톡방을 보며 '저요' 찬스를 노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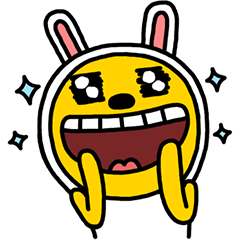
출처 : 대전일보(http://www.daejonilbo.com) 1월 6일자 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