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타고 섬에서 섬으로…
겨울 방학을 앞두고 차분히 학업과 독서에 집중하고자 책상에 앉았지만, 유혹의 손길은 언제나 집중이 흐려지는 30분이 지나 내게 다가와 속삭인다.
‘앞으로 오랜 시간 알래스카의 춥고 고립된 곳에서 지내게 될 텐데 지금이 유일한 기회야 라고 말이다.‘
그런데 막상 어디를 가려고 지도를 펼치고, 라이언에어 도착지를 살펴보아도 구미가 당기는 곳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중 다시 떠오른 생각이 또 영국이었다. 영국의 정식명칭은 United Kin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이다. 그런데 내가 유일하게 못 가본 Kindom이 바로 Wales(웨일스)였고, 그래서 웨일스에 대한 호기심이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최대한 학교 시간을 준수하며 다녀오려면 주말을 이용해야 했고, 이 말은 비행기 값이 비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웨일스는 페리를 타고 가는 것이 가능했다.
아일랜드에서 영국으로 배를 타고 간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매번 비행기만 이용하다 더 추워지기 전에 배를 타고 영국으로 넘어가는 이 경험이 유니크하게 다가온 것이다.
Dublin Port(더블린 항구)에서 웨일스 Holyhead(홀리헤드)까지는 배로 3시간 30분 거리이다. 그리고 웨일스의 수도인 Cardiff(카디프)까지는 기차로 4시간 47분이 소요되는 여정이었다. 비행기로 카디프까지는 1시간 거리이며, 금요일 기준 €300(약 42만 원)지만, 돌아오는 티켓은 고작 €45(약 5만 원)에 불과했다. 그래서 모처럼 육, 해, 공 모든 수단을 이용해 2박 3일 카디프로의 늦가을 여행을 계획했고 이제 막 출발했다.
8시 출발인 페리는 탑승 1시간 전 수속을 마치라고 안내문을 보내왔고, 메이누스에 사는 나로선 4시에 일어나 준비하고 출발해야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큰 어려움은 메이누스에서 더블린 항구로 가는 길이 가장 막막했다.
토요일 아침 더블린으로 향하는 대중교통이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항구까지 가려면 또 버스를 갈아타야 했기 때문이다. 더블린까진 무사히 도착했는데, 문제는 항구로 향하는 버스가 오지 않았다. 새벽 6시 영하의 날씨에 밖에서 겪는 막연한 기다림은 나만 초조하게 만들었던 건 아니었나 보다.

두 명의 독일어를 사용하는 외국인이 먼저 다가와 말을 건넸고, 행선지가 같은 우리는 금방 말을 섞게 되었다.
한 명의 이름은 Kilian으로 Trinity College(트리니티 컬리지)에서 형의 졸업식을 축하해 주고 다시 자기가 지내는 Cambrige(캠브리지)로 가는 중이고 다른 한 명은 그의 아버지였다. 그들이 택시를 잡아 함께 무사히 페리에 탑승하고 서로에 대한 이야기로 지루할 틈이 없는 시간을 보냈다.


아일랜드에서 지내는 동안 난 이런 소중한 인연들과의 만남에 마음속 깊이 감사한 마음이 든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만나 인사하고 서로의 공통분모와 차이점을 확인해 나가는 이야기 속에 싹을 틔우는 우정이 실로 멋지기 때문이다. 웨일스로 가는 동안 케임브리지 대학원생과 나누는 Small Talks(소소한 이야기들) 속에 배는 어느덧 영국 홀리헤드로 접안을 마쳤다.
셀 수 없이 많은 트럭과 자동차들이 페리에서 하선하기 시작했고, 배에서 버스를 탄 우리는 육지까지 편하게 이동했다.


홀리헤드는 정말 시골의 작은 어촌 도시였다. 걸어서 2시간 이내로 모든 곳을 둘러볼 수 있는 그곳에서 웨일스의 공기를 한 껏 들이마시고, 다시 기차를 타 웨일스의 수도인 Cardiff(카디프)로 향했다. 북 웨일스에서 남 웨일스까지의 여정이며, 아무 곳에나 앉으면 되는 완행열차에 탑승해 정취를 감상하니 어느덧 밤이 되고 열차를 또 갈아타게 되었다.


장장 14시간이 걸려 도착한 Cardiff(카디프)는 축제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 불타오르는 토요일 밤에 이미 시작된 크리스마스 마켓을 주위로 다운타운과 펍에는 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밤을 보내고 있었다.

사실 카디프에 큰 기대가 없었다. 웨일스에 대한 정보도 상대적으로 별로 없었고 카디프 역시도 관광지로서의 매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혀 기대가 없었던 나로선 카디프 여행이 즐거웠고 도시가 마음에 들었다.
우선 모든 여행지가 대부분 걸어서 이동이 가능했고, 한 곳에 모여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다. 성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내가 보기에도 카디프성은 압도적이었고, 개인적으론 에딘버러성보다 더 멋지고 웅장했다.


어릴 때 레고로 성을 조립하기 좋아했던 나로선 가장 레고다운 성으로 카디프 성이 다가왔다. 성 안에는 작은 마켓들이 모여있었고 옆엔 스케이트 장이 마련되어 있어 성탄 분위기가 한껏 무르 올랐다.
영국 여행의 수 없이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좋은 장점 중 하나는 바로 대부분의 박물관이 무료인 점이다.
런던에 있을 때만 해도 내셔널 갤러리를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다녀온 이유도 바로 그랬다. 웨일스의 국립박물관에선 자연사 박물관이 공존해 있어서 과학과 예술분야를 함께 관람할 수 있었다.


특히 Impressionist(인상파) 그림을 좋아하는 나로서 르느아르와 모네의 그림도 함께 전시되어 있었고, 로댕의 ‘키스’도 관람할 수 있었다.
눈을 뜬 듯 안 뜬 듯 게슴츠레하고 모네의 그림을 바라보면 마치 어릴 때 매직아이를 보는 것처럼 환상적으로 퍼져 나가는 색상과 이미지가 몽환적으로 펼쳐지는 충만함을 체험할 수 있는 기쁨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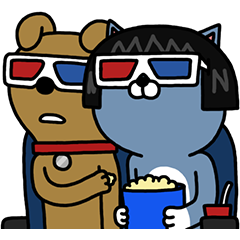
그렇게 관람을 마치고 나오니, 카디프 시청 앞에선 또 크리스마스 기념 특별 놀이동산이 준비되어 있었고, 조금 더 걸어가니 본격적인 크리스마스 마켓이 펼쳐져 있었다. 유럽의 크리스마스 마켓은 한 해를 마감하는 시기에 추운 겨울을 녹이면서 함께 코코아와 마시멜로를 먹으며 정감 어린 이야기를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스토리를 전해준다.
그러나 카디프도 영국인지라 늦은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기에 카디프 베이를 가는 것은 접어두기로 했다.


평생 서울에서만 살던 내가 올 한 해 바다 구경은 정말 넘치듯이 했고, 앞으론 또 섬에서 오랜 기간 살 예정이어서 베이는 포기 했다.
그리고 지금 카디프 공항에서 이번 여행을 마무리하는데, 너무 아담한 공항이어서 또 한 번 놀랬다. 보통 공항라운지는 뷔페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곳을 방문하는
이가 소수이다 보니, 메뉴를 보고 주문하면 즉석으로 조리해서 좌석으로 가져다주는 시스템이었다.
더블린 포튼에서 오랜 시간 걸려서 온 거리를 비행기로 50분이면 도착하니, 조금 쓸쓸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그렇게 인생은 쓸쓸함의 연속이고, 그 쓸쓸함 한가운데 나에게 이야기를 건넨 이 낯선 도시에서 잠을 청했다. 그리고 이곳을 걸으며 소소한 나만의 흔적을 남기고, 눈으로 예쁜 정경을 담아 다시 아일랜드로 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