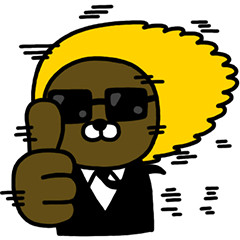마흔이란
[스물 아니고 마흔] 첫 번째 이야기
참 어정쩡한 나이다.
기대수명을 팔십이라고 하면, 딱 절반을 살았다.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들로 내가 누구인지 설명하곤 하는데, 그게 정말 나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
편의상 시절을 나누어, 유년과 10대 20대 30대, 떠오르는 에피소드들로 나를 되돌아보곤 한다. 일종의 나란 사람을 주인공으로 한 스토리텔링. 어떨 땐 마치 그럴듯한 위인처럼 자화자찬이다가, 어떨 땐 남들 다 아는 사실을 나만 모르는 천둥벌거숭이처럼 부끄러워진다. 여하튼, 나란 사람에 대해 평하는 일은 분열적이고 작위적인 스토리텔링이다.
마흔이 되어 거울 앞에 선 나는 그다지 멋지고 위대하고 근사하지 않다. 위대한 분들은 이 나이에 이룰 것을 다 이루고 요절하기도 했건만, 그건 내 이야기가 아니다.
좀 더 솔직히 요즘 나는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조차 헷갈린다. 누가 친구이며 누가 적인지는 세상의 난제다. 모르니, 모든 것이 어정 쩡이다. 호도 불호도 잘 드러내지 않는다. 심지어 그 흔한 좋아요, 싫어요도 누르지 못한다.
내가 아는 저 모습이 그 사건, 그 사람의 다라고 믿지도 않고 내가 판단하는 것들이 과연 그렇다고 할 만한 합리적 추론이라고 여기지도 않는다. 결론적으로 남도 안 믿고, 나 자신도 안 믿는다는 얘기다.
어떤 것을 선이라, 어떤 것을 악이라 단언하는 것도 멈추었다. 천인공노할 사연, 그런 사람이라 해도, 거기까지 갈 때까지 내가 모르는 사연이 있는 건 아닌지 멈추어 생각하게 된다. 그런 형편없는 이야기, 그런 형편없는 악인이 어찌 하루아침에 탄생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대단한 악인이 아니더라도 사소한 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저 악이 작용하는 세계의 원리, 그 효용이 따로 있지 않을까, 그런 과대한 생각까지 나래를 펼친다. 그래도 이해해보려는 필사의 노력 때문이다.
선한 것도 그렇다. 칭송받아 마땅한 이의 뒷모습이 그렇게 환하고 아름답기만 할까. 무엇보다, 그게 옳고 선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 마흔 무렵까지 본 대다수의 인간들은 모두 자기중심적인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헤쳐가던데 자기의 생존이나 이익과 무관하게 누군가를 위해 목소리를 높여주고 행동에 옮겨주고 그럴 에너지와 선의가 있을까 싶다. (내가 너무 못됐나?)
가까운 사이인 누군가는 말한다. 인간이란 종이 우주 상에 살아남기 위해 어떻게 진화해왔을지, 길고 긴 시간의 여행을 떠나보라고. 오늘의 시계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아주 오랜 시간을 거슬러 이 지구와 생물의 세포 속에 메모리 돼 있다는 것. 내가 알고 있다고 믿는 나 자신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어쨌든 내가 아는 것을 안다고 말하는 것이 참 머쓱한 나이가 되었다. 세상 모든 것, 내 눈에 보이는 저것이 정말로 그것이냐는 회의랄까. 그런 회색 지대에 서 있는 기분으로, 마흔은 와 있다.
요즈음의 나는 기쁘다는 말보다 서글프다는 말을 더 많이 하고, TV를 보다가도 깔깔 웃기보단 줄줄 울고 있을 때가 더 많다. 과한 감정이입을 했다가, 시종일관 모르쇠 모드로 침묵한다. 그러다 보니 마음속에 어떤 덩어리 같은 것이 종종 만져진다. 말로 풀어질 것도, 술로 풀어질 것도 아닌.
세상의 주인이 되리, 하는 꿈 꾸는 시절이 지난 것은 분명한데, 그래도 밀알이라도 되겠지 설마 하는 기대감은 아직 버리지 못했다. 그 지점이다.
마흔이란.
어떤 여성 감독이 아침마다 이렇게 외친단다.
나는 오늘 쓰레기를 쓸 거야!
굉장한 말이지 않은가.
희대의 걸작을 쓰리라는 기대감이 아니라,
오늘 일어나서 나는 또 쓰레기를 쓸 거야 라니.
굳건한 의지로 그냥 '오늘'을 쓰는 거다.
그게 나이고, 이게 내 인생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