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련을 버리는 중입니다.
며칠째 방 하나가 엉망이다.
얼마 전에 졸업한 울 아들의 졸업 앨범과 학사 학위증을 책장에 꽂고 싶었을 뿐인데, 그게 지금 며칠째 방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
아이가 대학생이 된 그 해, 우리는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
새 집엔 빌트인 가구들이 많아 웬만한 건 다 버리고 이사를 왔지만, 커다란 책상과 책장은 그대로 들고 왔다.
대학을 간 아이가 집에 자주 내려오진 못할 테지만, 우리는 아이의 공부방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제는 공부방보다는 컴퓨터 방이라고 부르는 이 방엔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과 커다란 책상이 놓여 있다. 그리고 이 방은 이제 대부분 내가 글을 쓰거나 강의를 준비하는 곳으로 사용 중이다.
그런데, 책장이 문제였다.
한쪽 벽면 전체를 책장으로 채웠음에도 부족했다.
이사 올 때 책도 정말 많이 버리고(중고 판매 & 나눔 & 재활용 쓰레기 처리) 왔건만 뭐가 문제인지...
시작은 제일 위칸 우리의 학석박사 학위증과 아이의 학사 학위증을 한데 모아 두는 데서부터였다.
가득 차 있던 곳에 아이의 학사 학위증을 하나 더 꽂는 순간, 도미노처럼 남은 책들이 다음 칸, 또 다음 칸으로 밀려나면서 점점 책장에 꽂히지 못한 책들이 불어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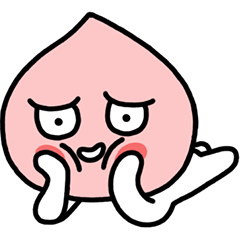
'흠...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여기만 좀 어떻게 정리를 새로 해볼까?'
그러다 생각이 났다.
이사를 하고 난 후에도 정리하지 못해 상자 안에 그대로 처박혀 있던 앨범들과 여러 가지 잡동사니들이...
'이왕 이렇게 된 거, 제대로 함 정리해 보자.'

그게 며칠째 이러고 있는 이유다.
이사한 지 4년 만에 열어본 상자 안에는 정말 소중한 추억도 있었지만, 이걸 왜 여기까지 끌고 왔나 싶은 미련들도 가득 들어 있었다.
내가 아주 꼬맹이때부터 쓰던 일기장, 친구들과 나누었던 우정 편지, 대학 동문 선배들과 주고받았던 위문편지, 울 신랑과 주고받았던 연애편지, 그리고 10년도 훨씬 넘은 고지서와 영수증들...
거기다, 울 신랑 몫의 것들도 있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낯선 이름(여자인 것 같은데...)의 사람과 주고받은 편지, 병장 만기 제대하면서 받은 것 같은 롤링페이퍼, 어린 시절 사진들...
정리를 하면 할수록 추억과 미련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기 시작했다.
시간은 자꾸 흐르는데 정리해야 할 것들의 양도 늘어났고, 버려야겠다고 결심한 쓰레기들도 늘어났다.
"왜 정리가 안되고 점점 뭐가 많아지는 것 같지?"
퇴근한 남편이 초췌해진 나와 방을 보며 웃었다.

"여기, 당신 물건들도 많은데, 좀 봐주면 좋겠는데."
"다 버려."
"뭔 줄 알고?"
"옛 물건이겠지.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찾아보지 않았고, 기억조차 없다면 그냥 버려도 되는 물건이지 않을까?"
나는 내 물건을 정리하면서도 '버릴까? 남겨둘까?'로 계속 고민을 했는데, 울 신랑은 너무 명쾌했다.
울 신랑 말을 듣고 나서 아직 정리가 덜 끝난 너저분한 방을 둘러보니, 내가 지금까지 고민했던 건 추억보다는 "미련" 앞에서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추억이라고 확신하는 것들은 이미 정리수납 상자 안에 들어가 있었고, "버릴까? 남겨둘까?"로 고민하던 것들은 죄다 버려도 그만인 미련 덩어리들이었던 것이다.
이미 "현재"의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책장에 과거의 "미련"을 어쩌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었다니...
오늘, 또다시 방을 정리하고 있다.
이번엔 확실하게 추억과 미련을 구분하여 미련을 버리는 중이다.
며칠 전보다는 속도가 붙는 느낌이다.
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긴 멀다.

이 정리의 끝, 있긴 있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