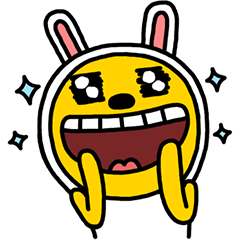by
Sep 20. 2019
조선남자를 만나 조선 여인이 되다
그(남편)를 만난 건 6월의 어느 날씨 좋은 여름이었다.
20대의 끝자락에 들어선 딸이 불안했던 엄마는 늘 누군가를 갈망하고 있었다. 행운처럼 다가와 나를 구원해 그 누군가. 그런 엄마에게 그는 마지막 행운과 같은 존재였다. 내세울 것 없는 딸을 구원해줄 마지막 구원자.
"잘하고 와라.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그의 첫인상?
난 어렸다. 나이가 어린 게 아니라 생각이 어렸다. 당시 나는 2살 이상의 남자는 모두 아저씨라 여겼다. 주변 친구들이나 선배들은 다 동갑이거나 한두 살 연상이었지 그 이상은 없었기에. 나이가 있다 싶은 선배는 다 아저씨로 불렸다. 그래서 그 이상의 나이차를 가진 그는 까마득한 아저씨였다. 그것도 아주 예의 바른 아저씨.
이제와 생각해 보면 나이 차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며, 오히려 나이 차가 있는 게 다행이란 생각까지 드는데 그때는 그걸 몰랐다. 능력이나 성격보단 나이나 외모가 우선이었으니 나의 20대는 어려도 참 많이 어렸다.
만약 그와 나의 나이 차가 없었다면 결혼 후 우리의 싸움은 끝이 없었을 것이고 나의 인내는 바닥을 드러냈을 것이다. 그러나 그나마 있는 나이 차로 나는 그에게 공손해질 수 있었고, 그에 따라 그도 나에게 예의를 갖출 수 있었다.
사실 나이 차가 있었음에도 그가 완전히 싫었던 건 아니었다. 그 이유가 이후 가슴을 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지만, 젊은 시절 순수했던 그 시절에는 그가 지닌 생각이나 태도가 멋있어 보이기까지 했으니 이 또한 운명이며 인연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는 믿음직하고 생각이 바른 사람이었다. 그의 말은 옳았으며 결단력 또한 빨랐다. 나에 대한 예의와 배려는 그 어떤 거절도 불가하게 만드는 마력이 있었다.
그는 막내였고, 그 이유로 엄마는 그를 좋아했다. 적어도 딸이 시집살이를 할 걱정 따윈 없었을 테니. 그러나 나는 그런 엄마의 생각을 무시했다.
그가 부모님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얘기하며, 그분들에 대해 존경에 마지않는 칭찬의 말을 쏟아냈을 때 나는 그의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도 되겠단 생각을 했다. 그런 말을 하는 그가 참 올바른 사람이구나 생각되었다.
하여 그가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이 어떻겠냐 했을 때 나는 주저 없이 허락을 하였고,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하는 그가 대견하다 여겼다. 아들에게 무한 존경을 받는 분들에게 시집살이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기에...
부모에 대한 효심이 가득한 아들, 자신의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아들. 그때, 그는 분명 멋있는 남자였다.
만남의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음에도 우리 사이에선 결혼 이야기가 오갔다. 그리고 채 6개월이 되기도 전에 우리는 결혼을 했다.
-조선 여인의 이야기는 앞으로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