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년기를 안 했다고?
소소한, 따뜻한
갱년기를 모르고 지나갔다.
30대에 시작한 운동을 지금까지 중단한 적이 없으니 그 덕을 톡톡히 봤다.
운동할 결심 또는 운동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왜 그러지?
갱년기를 겪은 사람들의 다양한 증상을 들을 때면 어? 난 아닌데.
그랬던 걸 반성한다. (요즘 부쩍 반성 모드)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그럴 만한 이유에 대해 헤아려보고 이해하기보다는
꾸준한 실천자로서의 자긍심이 넘쳐서 고개를 갸웃거렸던 적도 적지 않았음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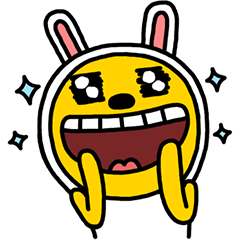
어느 날 큰애가 말했다.
"엄마는 어디 아픈데 없어?"
"다리가 좀 아픈 거 말고는 없어."
거기까지 하고 말 걸 잔소리를 덧붙였다.
"너도 건강 관리 좀 해라. 헬스 끊어놓고 안 다니지?"
"안 다니지."
"엄마는 너보다 더 젊을 때부터 운동을 했다. 그래서 그 흔한 갱년기도 모르고 지나갔잖아."
 사진: 이영환 작가
사진: 이영환 작가이쯤에서 갑자기 아들 눈동자가 흔들린다.
"엄마가? 엄마가 갱년기를 안 했다고?"
어처구니없다는 저 표정 뭐지?
"그래, 난 갱년기 그런 거 모르고 지나···"
섬광처럼 스치는 기억, 나는 그만 입을 다물었다.
아들이 사춘기일 때 만날 그랬지.
니가 보기에 내가 너무 부당한 소릴 한다거나
정신 나간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고 이상하게 굴면 그때는 달려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
엄마가 갱년기라서 그래. 너 미워서 그런 게 아니야.
그렇게 말하곤 했다. 그런 말도 어디 한두 번이라야 말이지.
날이면 날마다 애를 꾸짖고 딴지 걸고 소리 지르고 아이 말을 무시하고.
나는 무수한 날, 새파란 그 청춘을 흔들고 마음 상하게 할퀴고 그래놓고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다.
상처 준 자가 어떻게 이리 까마득하게 잊을 수 있는지.
선량한 큰애가 잊지 않았다면 그건 얼마나 큰 상처여서 그럴까.
내 갱년기를 착한 아들한테 퍼부어놓고 참 편하게도 살아왔다.
갱년기를 겪지 않았다고?
잘 자고 얼굴도 벌게지지 않고 아픈 데도 없이 지냈으니 갱년기 같은 거 겪지 않았다고 떠들어댔던 내가 너무나 부끄럽다.
어, 미안해. 내가 그랬지? 그땐 왜 그랬는지 몰라. 어휴, 그래 놓고.
큰애가 손을 내저으며 웃었다.
아냐, 엄마. 그냥 한 소리였어. 다 잊었지. 엄마가 그러니까 내가 더 미안해지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