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 에이전시 사용법
광고 대행사, 마케팅 에이전시와 일할 때 이것만큼은...!
이 : 브랜드에서도 마케팅 에이전시를 활용을 잘 못하는 것 같아.
다음 주제로 뭘 이야기할까 고민하던 중에, 이님이 불쑥 이런 말을 꺼냈다.
이 : 정말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광고 마케팅을 잘 몰라서 대행하는 거잖아.
간혹 브랜드 담당자들 중에 어설프게 알 때가 많아 그러면서 갑질이 심해질 때도 많고 어설픈 지식이 갑질을 부를 경우도 많지.
몇몇 에이전시는 그 점을 이용해서 블러핑 하기도 하고.
십 수년째 일하는데, 에이전시를 올바르게 쓰는 방법을 누가 좀 알려주면 좋겠더라.
생각해보니 그렇다. 우리는 브랜드에서, 에이전시에서 일을 하지만 두 회사가 만나 일하는 법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다.
브랜드와 에이전시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지만, 희한하게도 보이지 않는 거리가 존재한다. 단순히 '갑'과 '을'이라는 계약 관계 때문만은 아닐 것.
그래서 한 번 정리를 해봤다. 기업, 또는 브랜드에서 최소 알아주었으면 하는 것들!
에이전시와 일할 때, 이것만은...!
01. WHAT(무엇을) : 그래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구 : 그럼, 브랜드가 에이전시를 컨택하기 전에 뭘 알면 좋을까?
이 : 기본적인 것들이지 뭐. 예를 들어하고 싶은 게 뭔지.
사실 브랜드에서 뭘 하고 싶은지조차 모를 때도 많아. 내부에서 정리가 안된 채로 일단 전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한 단계 더 좁혀보면 좋을 것 같아. 예를 들면 '우리 브랜드는 메타버스를 하고 싶어요'하는 경우가 많아. 하지만 메타버스가 단순히 제페토와 같은 플랫폼만은 아니거든. 사실 우리 주변에서 쓰는 블랙박스도 메타버스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야.
단순히 '현재 유행하는 솔루션이 하고 싶어요'가 아닌 어떤 콘텐츠가 적합할지 고민하는 것도 필요해.
구 : 그걸 몰라서 대행사를 찾기도 하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니즈를 파악해주세요... 이런 것들.
이님과 나의 일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브랜드에서는 일단 연락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이런 프로젝트를 할 건데 기간과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라고 묻는다. 대부분 회사에서는 일단 '견적'을 듣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거라 생각한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전체 예산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니깐.
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내부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리스트를 정리해서 달라고 요청한다. 그럼 그 리스트를 받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과의 접점을 찾아 알려준다. 내가 할 수 없고, 전문 분야가 아닌 것은 처음부터 고지하는 것이 좋다. 무리해서 '이것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내 전문성에 독이 되니깐.
예를 들어, 네이밍+로고 디자인을 같이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에 나는 디자인은 할 수 없다고 미리 말한다. 이렇게 사전에 필요한 것과 가능한 업무 범위를 맞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기대치가 어긋나게 돼버리면 프로젝트도 산으로 간다. 마케팅에서도 소비자-제품 핏이 맞아야 하듯, 프로젝트에서도 서로 간의 사전 합의가 매우 매우 매우 중요하다.
02. HOW(어떻게) : 새로운 아이디어 좋네요! 레퍼런스는요?
이 : 그래서 레퍼런스 요청이 많아. 그러면서 또 새로운 걸 원해.
'실패 안 할 자신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런데 모든 광고나 마케팅이 그럴 수 없잖아.
손에 잡히는 결과물로 나오는 경우, 레퍼런스 요청이 정말 많다. 기업 입장에서는 예산과 프로젝트 승인을 위해 결과물이 그려지도록 미리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모든 프로젝트에 딱 들어맞는 레퍼런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레퍼런스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신선도도 떨어진다는 의미이다.
이 : 사실 현재 대한민국에서 100% 새로운 건 없다고 봐.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라는 말이 왜 있겠어. 기획자들은 대부분의 레퍼런스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기획안을 제출해.
하지만 정말 새로운 것을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것을 요청할 때가 많아.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가면 결국 프로젝트의 의사 결정권자는 그래서 '이게 진짜 가능해?'라고 하지. 물론 실현 가능 여부를 따져 가지고 가지만 결국엔 레퍼런스야.
예를 들면, 촬영장이나 오프라인 자동차 런칭에서 최초의, 단 한 번도 진행된 적 없는 곳을 찾지만 새로운 장소를 만들지 않는 이상 현재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베뉴(venue, 행사 등의 장소)는 없어. 겨우 새로운 장소를 찾아서 보여주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된다고 하고.
'브랜드 뉴(brnad new)가 없는 브랜드 뉴(brand new)'에 대해 서로 상호 간에 협의가 있어야 해
그렇다. 새로운 것을 원한다고 할 때, '새로운 것'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가 필요하다. 동종 업계에서 보지 못한 것을 원하는지, 아니면 '최초'의 이미지를 가지고 싶은 것인지.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은 없다. 다만, 새롭게 보여줄 수는 있다. '새로움'에 대한 상호 간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03. WHO(누구에게) : 우리 타깃은요 MZ입니다만..?
이 : 요즘 툭하면 타깃이 다 MZ야. 이건 몇 번을 이야기하는데, 밀레니얼과 Z는 같은 세대가 아니야.
경제력이 있는 20대 후반부터 40대까지가 밀레니얼, 사회적으로 빅 마우스가 된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까지가 Z세대잖아.
이 둘은 비슷하면서도 다르기 때문에 마케팅의 큰 콘셉트는 유지하되 콘텐츠는 서로 달라야 해.
구 : 이건 브랜딩에서도 마찬가지야. MZ를 잡겠다는 건 지금 10대 후반부터 40대까지 모두 잡겠다는 건데, 이건 그냥 대한민국을 타기팅하겠다는 거지.
기업은 타깃을 넓게 잡으면 그만큼 소비인구가 늘어나니깐 매출이 오를 거라 생각하지만, 우리 브랜드 소비만 하는 게 아니지. 뾰족하게 잡아야 팬덤을 형성해서, 그래서 1인당 브랜드 소비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지.
MZ가 하나의 마법의 단어처럼 됐지만, 프로젝트 시작 전 우리가 잡고 싶은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타깃을 모르겠다면 이 부분도 대행사에게 맡기자. 정확한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기 위해 누구를 잡아야 할지 최적의 타깃을 선정하는 것 또한 대행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04. 파트너 : 갑과 을은 계약서에서만

일을 '준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지, 대행사가 기업 밑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즉, 상대방의 직원을 부하직원 대하듯, 아니 그보다도 못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대행사는 기업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대신하는 전문가' 집단으로, 함께 하는 '파트너'이다. 이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막말하거나, 나이로 능력을 가늠하기도 하는데 제발 그러지 말자. 대행사는 기업 내부에서 못하니깐 찾은 전문가들이라는 것을 명심하자.
05. 예산 : 3억 같은 1억으로 해주세요.
이 : 가끔 예산 없이 올 때도 있어. 하고 싶은 건 많고, 해달라는 것도 많고, 근데 돈은 없다 하고.
브랜딩 프로젝트에서는 사실 '실비' 개념이 없다. 출장이나 시장조사 비용 정도...? 하지만 대부분 프로젝트 비용에 포함한다.
하지만 이님의 영역에서는 다르다. 실행까지 총괄하는 역할이라 하물며 대관료라도 나가는데, 이러한 것들은 생각지 않고 무턱대고 오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럴 때면 에이전시 입장에서는 참으로 곤란해질 수밖에...
최소한의 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오자. 그래야 뭐라도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주기로 한 예산을 깎는 행위도 절대 금물이다. 에이전시는 초기 예산에 맞춰 모든 것을 세팅하고 준비를 한다. 그런데 중간에 갑자기 예산을 깎아버리면 처음부터 다시 짜야한다. 중간에 하나를 뺄 수가 있는 구조가 아니다. 처음부터 안될 것 같다면 솔직한 예산을 이야기해주는 것이 예의다.
이 : 그런데 진짜 안 해야 할 건 견적 비딩이야. 견적 비딩은 치킨 게임이 될 수밖에 없어. 대행사를 오로지 가격으로만 보는 거지.
구 : 결국 예산이라는 거 너무 잘 알지. 근데 그 예산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를 봐야 하는데, 빠르게, 싸게 이것만 보니깐.
견적은 에이전시를 선택하는 데 있어 피할 수 없다. 너무 중요하다. 하지만 가격으로만 고르면 좋은 대행사는 다음부터 참여하지 않는다. 많은 예산을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다. '합리적인 예산'을 보라는 것이다.
'최저가'가 대행사를 고르는 기준이 되면은 에이전시는 경쟁 PT에서 자발적으로 들어가지 않게 될 것이고, 기업은 결국 최고가 아닌 '최악'을 선택하게 된다.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라도 에이전시를 선택할 때에는 견적과 그에 맞는 내용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06. 임원 설득 : 보고를 위한 보고서를 위한 보고서...?
구 : 나는 기업 실무자들이 임원 생각을 미리 좀 알아봐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 그렇지 않으면 보고만 계속 이어져. 임원들 평소 생각이 어떠한지, 그래서 어떤 방향이 꼭 있어줘야 하는지.. 이런 정보는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깐, 내부에서 알아봐 주면 좀 더 수월하게 일할 수 있지. 의사결정권자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한 번 반대했던 안을 굳이 가져가서 보여줄 필요는 없으니깐. 진짜 너무 필요하고 꼭 그 방향이어야 하는 게 아니라면 말이지.
이 : 가끔 그럴 때 있잖아. 보고를 위한 보고서. 보고서 쓰다 보면 또 내용이 바뀌어. 이거 넣어달라, 저건 빼 달라... 문서 작성하다가 정작 해야할들은 못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다. 아무리 우리가 좋다고 한들, 의사결정권자가 싫어하면 진행이 되지 않는다. 에이전시는 기업이 원하는 방향 안에서 최상의 것을 뽑아내는 사람들이다. 그러기 위해, 내부에서는 임원들의 성향이나 정보를 미리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가령, 네이밍을 하는데 평소 임원이 싫어하는 단어가 있다라면 미리 알려주는 것도 좋다. 혹은 슥- 하고 흘려보냈던 단어가 있다면 이런 정보도 줘야 한다. 이건 기업에 '맞추는' 행위가 아니다. 방향성을 사전에 합의하고, 그 안에서 최상의 아웃풋을 뽑아내기 위함이다. 한번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다음으로 넘어가기 어렵다.
보고와 문서 작업을 최소화하고, 진짜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내부 실무자들이 꼭 해주어야 하는 일이다.
067 수정 요청 : 낼 오전까지 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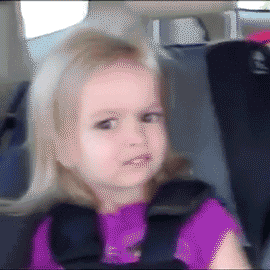
이 : 시안이 말하면 딱 나오는 줄 알아. 3D 랜더링은 반나절은 걸리는데. 랜더링 걸고 있는데 '수정되죠?'라고 하는 경우도 많고.
에이전시는 좋은 기획안으로 좋은 결과물을 내야 한다면, 내부에서는 시간을 벌어주는 게 역할이라고 생각해.
구 : 그리고 글에 대해서 너무 낮게 생각하는 것도 그래. 글 수정 뭐 뚝딱하면 되는 줄 알고 말이야. 단어 하나 선택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심을 하는데..
모든 일이 '아삽(ASAP)'인 것 너무 안다. 하지만 최소한의 시간은 확보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퀄리티가 나온다. 그리고 대행사도 사람이 운영하는 곳이다. 시도 때도 없는 수정과 무조건적인 요구는 일하는 사람들을 지치게 만든다. 너무 급하고 중요한 것은 에이전시가 먼저 안다. 프로젝트가 곧 에이전시의 얼굴이 되고 레퍼런스가 되는데 어떻게 그냥 막 하겠는가.
다만 수정에는 절대적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러니 되도록 수정은 한 번에 정리해서 요청하자.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해서 말이다.
08. RFP와 피드백 : 그래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요?
이 : 가장 좋은 건 프로젝트 전에 정확한 RFP를 주는 거야. 꼭 문서가 아니더라도 사전에 서로 합의를 잘하고, 결과물에 대해 정확하게 피드백을 주고.
구 : 원팀으로 일한다는 느낌 주는 것 너무 중요하지. 그러기 위해서는 내부에서도 진짜 바빠야 해. 일을 대행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대행사가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 내부에서도 그만큼 서포트를 해줘야 가능하지.
프로젝트에 대한 개요를 담는 문서를 'RFP'라 한다. "request for proposal"의 줄임말로, 말 그대로 '제안 요청서'이다. 해당 프로젝트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담는 것인데, 이는 프로젝트 시작 전에 기업과 대행사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기업은 RFP를 정리하면서 무엇이 필요하고, 얼마의 예산이 있는지 미리 정리를 해볼 수 있다. 대행사는 RFP를 통해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우리가 할만한 일인지 또는 예산에 맞지 않는지 등.
RFP에는 보통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RFP>
- 프로젝트명
- 브랜드 및 제품/서비스 설명
- 목적 및 목표
- 일정
- 가용 예산
- (프로모션의 경우) 온/오프라인 (장소)
- 특이사항 : 브랜드가 원하는 방향 등
Ex) 지난 프로젝트에 대한 리뷰 - 지난번 성과와 이번 프로젝트에 기대하는 점
Ex) 프로젝트 가이드 - 새로운 것과 파격적인 것의 가이드
이 : 이렇게 프로젝트 이야기가 오갔으면 명확한 피드백을 주었으면 좋겠어. 할 건지 말 건지.
구 : 그렇지. 나는 특히나 혼자 하니깐, 막 할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어느 순간 이야기가 없는 경우가 있다? 나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일정을 비워둬야 하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받아도 되나 망설이게 되지. 그래서 모든 프로젝트는 계약서 작성 후를 시작점으로 한다고 미리 이야기해. 그렇지 않으면 나만 열심히 달리는 경우가 있더라고.
이 : 그치. 프로젝트가 갑자기 취소되기도 하니깐. 그걸 이야기해주면 되는데, 말을 안 해줘. 그러니 답답한 거지.
정말 그렇다. 프로젝트 시작 여부를 알려주지 않는다. 안 하게 됐으면 알려주면 된다. 못하게 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미안한 일이 아니다. 못하게 됐다고 알려주지 않는 것이 매너가 아닌 행동이다.
그러니 기업에서는 프로젝트가 취소되었으면, 가능한 빠르게 알려주자. 그래야 대행사도 마냥 기다리지 않는다.

기업도 대행사도 각자 저마다의 사정이 있다. 하지만 이 사정을 맞춰나가는 것이 이 둘의 관계라고 생각한다. 서로 다른 일을 하고 있지 않다. 프로젝트를 하기로 한 이상 공동 운명체이다. 어떻게든 함께, 끝까지 잘 나아가야 한다. 이왕이면 잘, 똑바로, 딴 길 새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에서도 대행사를 '을'이나 일을 시켜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또 다른 아군으로, 파트너로 생각하고 최상의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서포트해주었으면 한다.
어렵지 않다. 그저 모든 것이 명확하면 된다. 대행사가 내부 이슈를 어디 가서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 일을 맡겼다면, 믿고 함께 해줄 든든한 동료로 생각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