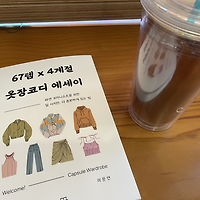첫 계약금을 토해내다.
100만원이 가져다 준 지지리빈곤함의 기억
이미지 협찬에 물 먹고 팀장들의 퇴사를 겪다보니 시간은 벌써 계약한 지 1년 반이나 흘러 있었다. 1인기업인 나에게 겨울은 유독 힘든 계절이었는데 그 첫 스타트가 바로 2012년 12월이었다. 인상 좋아보이던 남자 팀장과의 이야기가 잘 끝나고 별 일 없겠거니 책은 뒷전으로 미뤄놓고 다른 일에 매진하던 중,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다. 기존의 출판사의 새로운 팀장이라는 그녀는 진행하고 있는 책의 기획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기계처럼 물었다.
아니, 자기네 출판사 일을
왜 나한테 묻는겨?
라는 속마음은 제쳐두고 지금까지의 일을 간단명료하게 전달했다.
그녀가 메일을 보낸 목적은 하나. 다른 기획안이 있지 않는 한 현재 출판사에서 내 책의 기획안으로 출간을 할 생각이 없으니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이야기였다.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길래 계약금을 돌려줘야 하는지 궁금했고 전임이었던 남자 팀장한테 전화를 했다. 당연히(?) 전화를 안 받았다. 그 남자 팀장 역시 6개월만에 그만 둔 걸 보면 내가 전화를 해서 자초지종을 물어보는 것이 의미 없겠다는 생각을 했고 간단한 문자만을 남겼다. 지인분들한테 자문을 구했더니 이런 경우에는 저자의 100% 책임이라기보다는 출판사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계약금을 다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나란 인간은 이런 상황에 한없이 약하다. 상대방의 책임을 조목조목 따지며,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결국에는 50만원만 돌려주는 쾌거(?)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면 좋겠지만
나는 ‘따지는 건’ 완전 젬병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가는 논리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는 사람이 쏟는 에너지의 몇 십배가 든다는 것을 알고 있다. 과연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그만한 에너지를 쏟을 가치가 있는 일일까? 결론은 No였다. 기계적인(2013년 기획을 위해 정리해야 할 기획안의 저자들에게 메일을 돌리고 계약금을 돌려받느라 그랬을까) 그녀의 뉘앙스가 무척 기분이 나빴지만 ‘그래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 인가보다. 먹고 떨어져라’라는 마음으로 계약금을 반납하고, 계약 관계를 청산했다.
고로 가볍디 가벼운 나의 통장은
너덜너덜 마이너스가 됐다.
하늘에다 대고 나한테 왜 그러냐고 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책이 지지부진했던 건 사실이고 차라리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다음 계약을 준비하기에는 더 낫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기도 했다. 그렇게 나의 첫 계약금은 1년 6개월만에 나의 통장에서 떠났다. 그렇게 계약금을 반납할 수도 있구나 를 느낀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첫 계약금을 받았을 때의 기쁨, 그 만큼의 슬픔이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쓰라림과 아쉬움으로 보낸 겨울이었던 것 같다.
참, 지지리빈곤함 포함.
초보 저자의 한 줄 생각
100만원이 절실하기도 했지만 책 출간의 기회가 물거품이 된다는 사실이 나를 더 힘들게 했다. 하지만 추운 겨울이 가면 또 따순 봄이 오니니. 다시 시작하는 거지 뭐. (허세는. ㅋㅋㅋㅋㅋㅋㅋㅋ)
* 이 매거진의 글은 2013년 출간한 ‘스타일, 인문학을 입다’란 책의 3년간의 출간 과정을 담은 에세이(2015년 기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