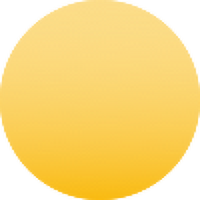싯다르타의 길
헤세 <싯다르타>
싯다르타의 삶은 뛰어난 학자가 범인이 되는 과정이고, 우월감으로 단단했던 자아가 약해지는 과정이고, 과거와 현재의 자신 및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경멸을 버리는 과정이고, 작은 돌멩이 속에 모든 것이, 부처가, 옴이 있다는 것을 아는 과정이다.
처음 이 책을 봤을 때보다 스무 살 정도 더 먹고 나니, 놀랍게도 나에게는 싯다르타와의 공통점이 있었다. 세속적 삶을 살며 구도자나 학자로서의 기질을 희석하고 싶어 하고, 어린아이 같은 삶을 동경하면서도 동시에 경멸하던 시절의 싯다르타의 모습이 나와 닮았다.
거창하고 부담스러운 표현이지만, 나도 내면의 소리란 것에 귀 기울인 적이 있다. 20대 중후반 즈음 자신의 개성이라고 믿던 것들, 취향이나 지식에 대한 집착을 최대한 털어 내고 가볍고 비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나는 고상해 보이는 것에 끌리지만 동시에 그것을 좋아하는 태도를 멸시하는 기질도 타고났다. 세상을 명료하게 이해하고 설명하는 일이 우스꽝스러운 행위들보다 가치가 있지는 않을 거라는 직관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욕망하는 걸 그냥 그대로 추구했고, 이전에는 경험해 본 적 없는 삶의 방식이라 한동안 모든 것에 대해 신이 났다. 원하면 먹고, 예쁜 건 가지고, 가고 싶으면 가고, 조금이라도 좋아진 사람에게 엑셀 밟고...... 결과적으로 1차적 욕망에 좌우되는 멍청이가 되어 버려서 자기 경멸을 느끼긴 했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나 매사에 진지했던 과거의 나에 대해 우월감을 느끼기도 했다.
그럼 지금은? 지금은 직관이고 내면의 소리고 뭐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잘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돈 벌고 돈 쓰고 사람 만나고 덕질도 하느라 바쁘기 때문이다. 딱히 사는 것이 괴롭지도 않아서 그냥 되는대로 살고 있다. 지금의 나는 어쩌면 정체되어 있거나, 제멋대로 뻗어 있는 우회로를 따라 비슷한 곳을 빙빙 돌고 있다. 만일 싯다르타가 걸었던 길과 내 길의 경로가 겹쳐져 있다면, 엄근진한 과거의 나에 대해 비웃는 태도, 광대같이 행동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경멸감, 다른 사람에 대한 우월감 등을 비워 내는 게 내가 가게 될(‘가야 할’이라고 적고 싶지 않다.) 길이 아닌가 싶다. 그렇다고 현재의 나 자신을 다그치거나 미워하고 싶진 않다. 싯다르타도 돌멩이를 사랑하는 이유를 그 돌멩이가 미래에 무언가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돌멩이의 감촉과 냄새가 예쁘고 그 돌멩이가 현재 이 순간에 이미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 않았나? 성장이란 결코 현재나 과거의 나를 비난한 결과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또 책을 읽으며 마음의 상처와 집착 등, 부정적인 감정을 받아들이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 바수데바는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일은 세상 사람들이 웃어넘길 일이며, 곧 싯다르타도 웃게 되리라 말한다. 이 구절을 읽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인 <학>이 떠올랐다.
산덩어리 같아야 할 분노가
초목도 울려야 할 설움이
저리도 조용히 흐르는구나.
보라, 옥빛, 꼭두서니,
보라, 옥빛, 꼭두서니,
누이의 수틀을 보듯
세상은 보자
누이의 어깨너머
누이의 수(繡) 틀 속의 꽃밭을 보듯
세상은 보자
이 시에서는 분노나 설움 등을 각각 보라색, 옥색, 꼭두서니색 실로 뽑아서 수틀로 짜고 멀리서 보면, 예쁘게 수가 놓인 한 필의 천이 보인다고 상상한다. 지금 이 순간 나를 진창에 빠트리는 마음의 상처조차 멀리서 보면 경탄할 것으로 보인다는 말을 믿고, 가장 마음이 힘들 때마다 들여다본 시였다.
싯다르타는 깨달은 사람이지만, 깨달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통념과는 다르게 행동한다. 아들을 향한 사랑과 집착에 온통 몸을 내던지기도 한다. 그런 싯다르타를 보며 모든 사람에게 부처가 내재해 있고, 영원한 단일성의 시간이 그 근거가 된다는 말이 조금은 이해가 갔다.
사랑이라는 인간적인 마음에 휩쓸리는 것은 깨달은 사람이 할 행동이 아닌 걸까? 고빈다와의 마지막 대화에서 싯다르타는 인간적 집착이나 어리석음조차 깨달음과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그건, 싯다르타가 아들에 관해 상처를 받은 결과 진정한 완성에 다가섰기 때문은 아니다. 그런 어린아이 같이 어리석은 행위가 깨달은 자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바수데바의 조언에 따라 강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싯다르타는 모든 행복과 고통, 욕망과 그 욕망의 좌절과 같은 것들을 거리를 두고 바라보게 된다. 그리고 각각의 소리 하나하나에 경탄하면서 동시에 그것들이 서로 구분되지 않은 단일한 강물 소리를 듣게 된다.
이 부분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경지이다. 그렇지만, 삶을 지옥처럼 느끼게 하는 고통도 한 발짝 물러서면 행복과 다르지 않다는 싯다르타의 발견은, 저 경지에 대한 믿음만으로도 세상을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준다. 그리고 나는 그렇다고 굳게 믿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