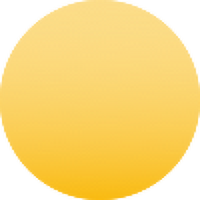<한국에서 살아남기> 1번: 애교를 잘 부릴 것!
a.k.a. 을의 목소리
최근 내 페이스북 피드에서 30대 후반 남성이 올린 글을 보았다. 중심주장은 한국과 미국의 문화가 굉장히 성차별적인데 한국인들은 그것을 감지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특히 “미국/영국 사회는 공적영역에서의 formality를 갖추는게 중요한데 여성이나 흑인은 그것이 약하다는 평을 받기 쉽다. 그에 반해, 한국은 formality영역 자체가 빈약하여 여성이라고 해서 특별히 눈에 뜨일게 없으니 (스트레스 받는 미국, 영국 여성들에 비해) 한국 여성은 속편하다.”는 것이었다. 대체로 그들이 공적영역에서의 대중적 말하기(Public speaking)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Vocal fry 와 Uptalk이고 이것은 특히 여성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으로 말해진다고 한다. ECONOMIST.com의 「Women’s voices are judged more harshly than men’s」 라는 글을 첨부하며 쓴 글이었다. 그런데 정말 한국 여성들은 목소리의 톤이나 질감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속편하게' 말하기를 할 수 있는가?
 친..친구야..
친..친구야.. 절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라다 시즈카(2018)는 “한국 대학생들의 말하기를 통해서 보는 젠더 아이덴티티와 젠더 이데올로기: ‘애교’에 대한 메타담론을 중심으로” 라는 글에서 단초를 찾을 수 있다. 그는 “원래 ‘남자/여자는~’ 식의 남학생들의 담론과 달리, 여학생들의 애교담론은 경험담이 풍부하다. 본질화나 객관화와 같이 문제를 추상화하지 않고 경험으로부터 귀납하는 말하기가 여학생들의 특징이었다. 수많은 성찰을 반복하고 수행하는 그들의 애교는 남학생들의 애교보다 훨씬 연행적인 성질을 띠고 있다.” 라고 말한다. 나의 페이스북 친구가 말한것도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 여성의 공적인 말하기에서의 목소리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은 그는 ‘원래 ~다'라는 식의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만 것이다. 공적영역에서의 Formality에 대한 확고한 영역이 없기 때문에 여성들이 검증과 제약을 받지 않는게 아니라 애초에 공적영역 참여의 기회 자체가 박탈되고 제한된다고 생각한다. 미국이나 영국의 여성은 공적인 말하기를 한 이후에 ‘여성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발화의 특징'이 formality가 부족하다는 평을 듣는 반면, 애교 부리는 혹은 애교를 잘 해야 하는 한국여성은 공적 발화를 하기 힘들다. Formality에 대한 확고한 영역이 없는 만큼 직장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애교를 요구 당하기도 쉽다. 그래서 ‘감히' 여성이 남성처럼 저음을 내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왜냐하면 미국과 영국에서의 Vocal Fry(목소리를 눌러 억지로 저음을 내는 것)이 여성들이 남성들처럼 저음을 내기 위해 사용된다고 이해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대조적으로 여성이 공적영역에서 제외된 한국사회에서는 남성들 간의 경쟁과 위계가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권위있는 남성의 Vocal fry가 한국 사회에서 두드러지게 된다. 미국인인 Harkness(2011)는 이것을 교차담론성(Interdiscursivity)의 결과라고 보고 “Korean Fricative Voice Gestures”라고 명명하였다.
 애교의 청자 : 오빠
애교의 청자 : 오빠애교가 상대적으로 비공식적인 장소에서 발생한다고 보는것이 일반적인 견해라면, 애교가 ‘공적인 것’으로 전면적으로 부각되는 산업이 있다. 바로, 아이돌 산업이다. 남녀를 불구하고 한국의 아이돌들은 애교를 해야만 하고, 팬들은 실제로 이들의 애교를 사랑하는 듯 하다. 그리고 팬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이들은 어디서나 누구에게서나 애교를 요구받는다. 이에 따른 부작용이 있다. 최근 크게 성장하고 있는 한류와 함께 ‘한국의 문화'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팬덤문화가 재생산되는 인터넷 공간에서 이러한 경향성이 크다. 처음에는 반감이 들었다. 애교가 정말 한국문화인가? 애교는 유투브를 타고 널리널리 전수될만큼 바람직한 것인가? 우리는 왜 애교를 하게 되었는가? 누군가가 한국에는 ‘을의 언어', ‘약자의 목소리'가 있다고 한 것을 들은적이 있다. 지하철에서 옆에 있던 사람이 전화받는 것을 들었는데 누가봐도 을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을의 목소리라는게.. 나도 알것만 같았다. 어쩌면 애교는 한국의 을들, 어린 사람, 여성, 부하직원 들의 ‘덕목’이 되어가고 있는 것만 같다. 모두들 기억하시라. <한국에서 살아남기> 1번: 애교를 잘 부릴 것 !
 애교..?
애교..? 애교의 퀸 홍진영
애교의 퀸 홍진영* 하라다 시즈카, 2018, “한국 대학생들의 말하기를 통해서 보는 젠더 아이덴티티와 젠더 이데올로기: ‘애교’에 대한 메타담론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24 (2): 431-470.
* Harkness, N. (2011). Culture and interdiscursivity in Korean fricative voice gestures. Journal of Linguistic Anthropology, 21(1), 99-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