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에 대한 겸재 정선의 경외
겸재 정선 (謙齋 鄭敾 1676-1759)
김창흡의 시와 정선의 그림이 있으면 높은 곳에 수고로이 오르지 않고도 중향성(衆香城)과 만폭동(萬瀑洞)이 눈 앞에 삼연(森然)하다. 문을 닫고 안석에 기대앉아 하나하나 읊조리노라면 이 몸은 늘 금강산에 있고, 누워서 명산을 유람하니 옛 사람이 부럽지 않다. - 원경하(元景夏, 1698~1761)
요즘 우리나라에선 MADE IN CHINA라고 하면 저가에 질이 낮은 상품이라고 인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엔 '대륙의 실수'가 종종 나오기에 중국산이라고 해서 모든 제품이 질이 낮다고 생각하면 큰 잘못이지만, 언제부터인지 중국산이라고 하면 앞에서 말한 이미지가 강하게 다가온다는 걸 부정할 수 없지요.)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약 2~300여 년 전만 했어도 중국산 제품이란 당대 최고급 퀄리티에 아무나 쓸 수 없는 고가의 명품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화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동아시아 3국에 있어서 최첨단의 유행을 이끌어가는 나라는 바로 중국! 명나라였으며, 우리나라와 일본은 중국의 문화와 문물을 수입하여 모방하고 영향 받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서예가는 중국의 명필들의 글씨를 모방하고, 수많은 화가들은 중국의 그림을 따라 그렸지요.

(그 당시 셀럽이라면 중국 한 번은 갔다 와 줘야 했던 시기였습니다. )
당시의 그림 수련법으로는 임(臨), 모(模), 방(倣)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모(模)는 대가(大家)가 그린 원작품을 화선지 밑에 깔고 그대로 베껴 그리는 것이고,
임(臨)은 원작을 옆에 두고 보고 그리는 방법이며,
방(倣)은 임(臨)과 모(模)를 통해 대가의 화풍을 익힌 후에 그 화풍으로 자신이 스스로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그림을 보면 제발(동양화에 있어 화가나 화가의 지인이 그림과 함께 써 놓은 글)에 임OOO작, 모OOO작, 방OOO작이라고 자신이 어느 화가의 그림을 따라 그렸는 지를 밝히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당시 유행한 중국 작가로는 예찬, 황공망 등이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고유의 화풍을 만들어 우리의 산천을 그려내어, 화가로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던 화가가 있습니다. 바로 겸재 정선입니다.
그가 일구어낸 화풍을 우리는 진경산수화라고 부르며, 그가 살았던 시기를 진경시대라고 일컬으며,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독자적인 문화가 활짝 꽃핀 진경시대를 경의를 담아 ‘한반도의 르네상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겸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연구가 많이 된 화가이며, 그 중심에는 간송미술관의 연구실장 최완수 선생님이 계십니다. 최완수 선생님은 정선 연구의 대가로 폭넓고 깊은 연구를 통해 겸재를 조선시대의 화성(畵聖)으로 추앙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정선의 작품을 몇 개 살펴볼까요?

겸재의 진경산수화 중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는 <인왕제색도>가 있습니다.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의 이 작품은 비 온 후 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있는 인왕산의 모습을 담은 것으로, 실제 작품을 보고 있으면 짙은 묵의 발색이 작품 내의 안개를 머금어 마치 화폭에서 그 검은 물을 뚝뚝 흘릴 것 같습니다.
겸재는 서울 근교에서 살면서 서울 근교의 지역들을 왕왕 그리곤 하였는데, 그중 인왕산을 그린 그림이 많은 이유는 그의 주거지가 인왕산 근처였기 때문입니다.
정선이 서울을 그린 그림으로는 이 외에도 <세검정>, <압구정>, <동작진>, <송파진> 등 매우 다양합니다.
실제로 집 근처의 경치를 보면서 그림을 그린 것이지요!

또 다른 유명한 작품으로는 <박연폭>이 있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수직구도의 <박연폭>은 박연폭포를 배경으로 그린 산수화로 힘차게 흘러내리는 폭포줄기와 그 주변의 바위 표현이 인상적인데요. <인왕제색도>와 <박연폭>에서 바위의 표현은 화강암 위주의 우리나라 산의 바위를 잘 표현한 것으로 마치 도끼로 마른 장작을 깎아지른 듯한 부벽준(斧壁埈)의 표현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강전도>는 금강산 전경을 한 화폭에 담아낸 걸작입니다.
물론 일만이천 개의 봉우리 모두를 한 화폭에 담을 순 없지만, 그 기세만큼은 아주 잘 표현되어있습니다.
금강산의 형태를 음양 태극의 구도로 담아내고 있는 이 그림은 봉우리 하나하나를 세밀한 붓으로 그려 내 금강산의 웅장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겸재는 자신의 후원자인 안동 김씨 가문의 도움과 영조의 후원으로 금강산을 여러 차례 여행하면서 수많은 작품을 남겼는데, 이 작품은 그 작품들 중 최종 완전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사실 '진경산수화'라고 하면 실제로 존재하는 경치를 똑같이 그려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위의 그림들을 살펴보면 <박연폭>이든 <인왕제색도>이든 겸재가 그린 그림은 진짜 경치를 그린 진경산수화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경치와는 형태의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으십니다.
(사실, 당연하지요. 붓과 먹으로 그린 것인데... 사진도 아니고...)
그렇다면 겸재는 어째서 실제의 경치를 똑같이 그리지 않았을까요?

(이 아쟈씨가 장난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것이 바로 겸재만의 진경산수화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본디 산수화란 산과 물을 그림으로써 산의 숭고함과 물의 청명함 등 대자연의 기상을 화폭에 담아내는 그림입니다. 겸재는 이러한 기상을 우리의 자연에서 찾아내고자 하였고 이로 인해 자연 본래의 형태에서 그 기상과 느낌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그린 것이지요.
이러한 겸재의 예와 다른 면을 보이는 산수화가 있는데, 동시기의 천재 화원 김홍도의 진경산수화가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정조의 총애를 받은 화원화가 김홍도는 쉽게 궁을 떠날 수 없는 정조를 위해 스스로 여행을 하며 보아온 절경을 실제 모습과 최대한 비슷한 형태로 진경산수화를 그렸습니다.
이렇게 겸재로부터 시작된 진경산수화는 김홍도를 거쳐서 더욱 발전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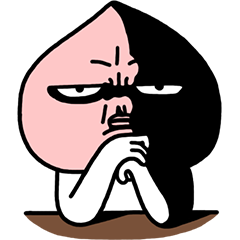
(즉 진경산수화는 겸재만 그렸다는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경문화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는 근대적 사상을 조선 땅에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