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꼭 한번은 책에 빠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책을 위한 책에 의한 책의
by
May 5. 2020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이 밤늦은 시간에. 브런치를 생각하며 예전 갤러리를 살펴보았다. 지금의 사진첩은 일을 하며 찍은 사진들, 아이들 사진, 풍경 화면이 대부분이지만 (그중엔 아파트 주차장 통로에 떡하니 통로 주차한 차들을 씩씩대며 열 받아 찍은 사진도 눈에 띈다) 불과 1년 전 사진에는 그동안 쏟아부을 듯이 읽은 책에 대한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이 책 저 책 참 많이도 읽었던 것 같다. 무지막지하게 빌려왔다. 그 당시 둘째가 갓난아기였을 때라 도서관에서 임산부부터 출생 후 몇 개월까지 집으로 배달해주는 생애 첫 도서관도 이용했다. 갓난아기를 데리고 도서관에 갈 수 없었는데 마침 좋은 취지의 프로그램이 있어 정말 알차게 이용했다. 누가 생각해냈는지 차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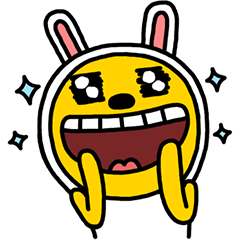
차가운 봄바람을 맞으면서도 책 바구니를 낑낑대며 집 근처 도보로 10여분 거리의 구래 작은 도서관도 다니기 시작했다. 이 곳에서 본의 아니게 나는 독서태교를 했다. 책이 좋았고 자기 계발이나 육아, 자녀교육, 독서에 관한 책들을 순서 없이 읽어나가기 시작했다. 펼쳐서 재미있으면 끝까지 읽고 순간순간 끊겨 읽기 어려운 책들은 표시해두고 조금씩 읽기도 했다.
책은 무엇보다 즐거움이어야 한다. 어라? 재미있네! 란 마음으로 나는 구래 작은 도서관에서 책의 재미를 알게 된 케이스이다. 어릴 적부터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이런 분들은 정말 존경한다. 나의 독서력은 초급 수준이다) 나처럼 어른이 되어서 아이를 키우면서 천천히 책의 재미를 알아가는 경우도 있다.
책이 재미도 있지만 나의 삶에 변화도 주어야 한다고 느끼던 찰나 독서노트도 한 줄 한 줄 적기 시작했다.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입덧이 무척 심했었다. 다른 건 들어가지도 않고 오직 아이스라테(시럽 두 번은 꼭)만 들어가던 시기에 나는 다니던 방문 회사 파트타임도 관두었다. 그러면서 자연히 하루 2~3시간은 작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독서노트를 쓰기 시작한 것이다.
독서노트에 (필사처럼) 일일이 적다 보니 손도 아프고 남는 게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 그 중압감이 싫었다. 읽었으니 여기에도 무언가 남겨야 한다는 책임감? 의무감? 책에서 기억하고 싶은 부분을 모퉁이를 살짝 접었다. 처음부터 재미있으면 끝까지 보고 한 번 더 기억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모서리 귀퉁이를 살짝 접어놓았다.
그리고선 한꺼번에 모퉁이 접힌부분만 다시 펼치면서 눈도장 찍어두었던 부분을 사진으로 찍었다. 이 사진 촬영 과정이 재밌다. 반납일자가 다돼가면 괜히 마음이 바빠진다. 중요 부분만 보고 귀퉁이 부분을 다시 펼쳐 찰칵찰칵
반납하기 전 벤치에 앉아 책을 꺼내서 찰칵찰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