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스토브리그> 왜 잘 됐지?
<스토브리그>, 빅 아이디어가 소재에서 터졌을 때
얼마 전, 배우 남궁민 씨의 인터뷰에서

본 작품의 시즌2가 나오지 않는다는 확인사살을 들었다.
아쉬운 마음이 든 건 본인만이 아니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두 번째 글의 서두를 시작한다.
소재만으로도 가슴 설레게 했던 드라마 <스토브리그>
비록 후반부로 갈수록 아쉬운 점이 조금씩 생겨 났지만
신선한 소재에서 오는 흥미로움과 대중성까지 잡은 그 힘이 굉장했음은 분명하다.
산업화되어 가고 있는 드라마 분야, 쏟아지는 콘텐츠에 IP 싸움이 한창인 그 업계에서
일찍이 장르의 다양화에 일가견했다고 생각하는 작품 중 하나이다.
---------------------------------------------------------------------------------------------------------------------------
 출처 : SBS
출처 : SBS* 드라마 ‘스토브리그’를 다시 떠올리며
2019년 겨울부터 2020년 초까지 방영된 <스토브리그>는 소재 자체는 마이너해보였다.
스포츠는 실제로 어느 시기 이후부턴 드라마 뿐만 아니라 영화에서도 점점 보이지 않게 되었고
그 와중에 선수가 아닌 프런트가 주인공인 드라마는 분명 생소했다.
그러나 5.5%에서 시작해 최고 시청률 19.1%까지 기록했고,
tvN의 <사랑의 불시착>과 동시간대였음에도 화제성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그 이유는 생소한 외피를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엔 시청자가 기시감을 느낄 수 있는 여러 성질이 들어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해 본다.
그것들이 무엇인지 한 번 되짚어 보자.
---------------------------------------------------------------------------------------------------------------------------


* 야구라는 껍질을 덮어 쓴 오피스 드라마
<스토브리그>는 야구 회사의 직원들 이야기.
당연한 얘기지만 <스토브리그는 ><직장의 신>, <미생>, <광고천재 이태백> 등
기존에 여럿 존재했던 오피스물과 그 궤를 같이 한다고 본다.

즉, 야구를 몰라도 상관 없다.
알면 더 재밌지만 윗사람의 통제와 시련을 헤쳐 나가는 주인공은
여타 작품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구조다.
돈을 받고 신인을 뽑아주는 스카우터
월권을 통해 자신의 입맛대로 구성원을 채우려는 고참
잔뼈 굵은 베테랑들의 파벌 싸움
백승수가 이러한 병폐들을 해결해 가는 과정은
시청자들이 자신들이 봐왔던 조직의 어두운 부분을 떠올리게 한다.
마니아틱할 수 있는 소재와 대중을 잇는 것이다.
---------------------------------------------------------------------------------------------------------------------------
* 일반 시청자와의 거리 좁히기
1화의 PPT씬은 <스토브리그>의 승부수이자 하이라이트다.
야구를 몰라도 된다는 것이 전혀 이해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야구 룰, 포지션 등 야구 문외한은 모를 법한 단어가 여럿 나오긴 한다.
하지만, <스토브리그>는 1화에서 PPT씬을 통해 외친다.
설령 야구를 잘 몰라도 다음 화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출처 : SBS Catch
출처 : SBS Catch야구 관련 경력은 하나도 없는 단장이 팀의 프랜차이즈 스타이자 에이스 선수를 내보내겠다고 한다.
스포츠를 좋아한다면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 것을 알겠지만
몰라도,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된다.
'제일 크고 단단하게 박혀 있는 돌을 굴러 온 돌이 빼내려 해서, 반대가 장난 아니구나.'
'그리고 주인공이 이걸 어떻게 해낼까?'
시청자는 이것에 집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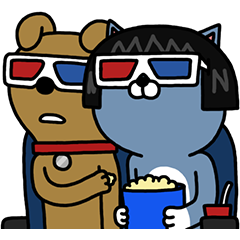
야구를 모른다고 무시 받던 백승수는 조목조목 근거를 들어 가며 트레이드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이때, PPT에 첫 번째부터 마지막 이유까지 편집되지 않고 모두 나오는데
설명도 그렇고 아주 직관적이다.
승부처에 약하다
여름에 약하다
구장이 공사하는데 스타일상 애매해진다.
그리고 인성이 좋지 않다.
물론, 야구를 모르면 얼핏 이해가 잘 가지 않지만
이 정도면 아주 친절하게 그리고 인상 깊게 박힌 돌을 왜 빼야 하는지
시청자에게 전달했다고 본다.
 출처 : 네이트 스포츠
출처 : 네이트 스포츠마지막 결정타는 해결책 제시
그 인성 안 좋은 선수 때문에 더 뛰어난 돌이 굴러 갔었는데,
근데 그 돌이 다시 돌아온댄다.
색안경 끼고 무시하던 이들, 어떻게 상황을 해결할지 가슴 졸이던 시청자들
모두의 머릿속에 강렬하게 백승수의 역량과 이름을 새기는 데 성공한다.
물론 극 중에서 언급되는 통계는 다소 단순화된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임동규를 새가슴이라 칭하는 근거로 결승타 개수를 언급하지만
사실 클러치 능력을 판단하는 지표로선 절대적이지 않다.
그도 그럴 게, 팀이 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격하는 타점이나
1~2점차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간격을 벌리는 타점을 보고
반드시 영양가가 낮다고 볼 수 있을까?
이는 드라마에서 시청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선택한 수치이다.
이것이 과하면 오히려 야구 팬이 뒤돌아 버릴 수 있으나,
<스토브리그>는 핍진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설정을 부여했다고 본다.
 출처 : 미디어스
출처 : 미디어스* 개인적인 아쉬움
선호도와 별개로 후반부는 다소 과하게 느껴졌다.
4화 내에 흥행이 결판 나는 드라마라면
초반부의 다이나믹함과 밀도가 당연히 중요하다.
그래서 한 사건당 1~2화의 분량으로 적당한 규모의 사건, 해결이 이뤄진다.
그러나 후반부로 갈수록 구단 매각, 약물 스캔들, 불법 도박 등 스케일이 큰 사건들이 연달아 등장한다.
굵직한 사건들은 당연히 긴장감을 끌어올리는 데 효과적이지만
이 과정에서 소외되는 인물들도 생기고 이에 대처하는 연출과 묘사도 부족했다고 본다.
물론, 이는 시청자 이탈을 막기 위한 작가의 방법이었으리라.
마이너한 소재에 전개도 느리고 사건도 몇 없으면 사람들이 볼까?
이러한 불안함이 사건의 과다 투여를 불러오지 않았나 싶다.

* 정리하며
<스토브리그>는 야구라는 외피, 오피스 드라마의 골격과 현실적인 서사를 품은 작품이었다.
그리고 시청자와의 거리감, 클리셰의 유혹을 모두 넘어서며 그들만의 길을 갔다고 생각한다
야구를 몰라도, 로맨스가 없어도 이야기를 따라가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