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구찜에 대한 무서운 상상
캐나다 태생 내 짝꿍
by
May 2. 2024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아구찜에 진심이던 시절이 있었다. 당시 다녔던 회사가 사무실을 이전하게 된 건물 1층에는 군산아구찜이 있었다. 그때까지 내가 먹어본 아구찜은 아삭거리는 콩나물의 식감은 좋았지만 매콤함에 있어서나 감칠맛에 있어서 나를 100% 만족시키지는 않았었다.
늘 일이 바빴던 나와 직원들은 시켜 먹는 배달음식의 한계, 그리고 나가서 맛있는 걸 사 먹을 수 없는 시간적 한계가 있어 종종 군산아구찜에서 식사를 해결했다.
군산아구찜은 다른 곳보다 칼칼함이 더 느껴지고 맛이 다채로웠다. 쫀득한 식감이 느껴지는 아구 사이에 오도독오도독 씹히는 미더덕이 더해져 풍미가 달랐던 그 집 아구찜을 참 좋아했다.
캐나다에 오고 나서 몇 년 만에 아구찜 하는 식당을 알게 되었을 때 엄청 신이 났었다. 모임을 할 때 한 번씩 전화로 주문하고 픽업을 해서 먹었는데 그 집의 가장 큰 단점은 소/중/대가 없다는 거다. 먹고 싶은 때는 많은데 하나에 50불씩 하는 아구찜을 매번 사다 먹기는 너무 부담이었다.
그러다 새로 문을 연 식당에 아구찜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크기도 다양해 보다 저렴하게 아구찜을 먹을 수 있게 됐다.
나는 종종 짝꿍에게 아구찜이 먹고 싶다고 했다. 한국 음식을 좋아한다고는 하지만 여기에서 태어나고 자라 바비큐, 비빔밥, 갈비탕 등 먹어본 것만 먹지 찜과 같은 음식은 선뜻 먹어볼 용기가 안 생기나 보다.
매번 다른 걸 골라왔던 짝꿍이 어느 날은 아구찜을 먹으러 가자길래 신이 나서 갔다. 막상 식당에 도착하니 부대찌개를 먹자고 한다. 그걸 먹기 위해 기껏 운전하고 갔는데.. 배신감이 들었다.
그리고 한 달 후쯤 나는 친구와 함께 오매불망하던 아구찜을 먹으러 갔다. 그동안 못 먹었던 한을 풀기 위해 더 맵게 주문을 하고 볶음밥까지 싹싹 해치웠다. 행복하게 집에 돌아온 그날 짝꿍은 미안했는지 맛있게 잘 먹고 왔냐고 묻는다.
"당연하지~"
한참을 조용히 있던 짝꿍은
"그 식당에서 아구를 직접 해줘?"
"응"
"잡아서?"
"여긴 아구가 없으니까 아마도 냉동이겠지?"
.
.
.
.
.
"아구찜이.... 엘리게이러 찜이야, 롸잇?"

 출처 Unsplash
출처 Unsplash갑자기 소환된 alligator..
악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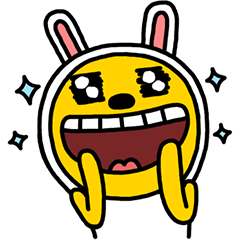
상황 파악이 되자 말 그대로 웃음이 폭발했다.
배꼽이 빠질 것 같았다.
웃음을 멈출 수가 없어서 그냥 계속 웃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