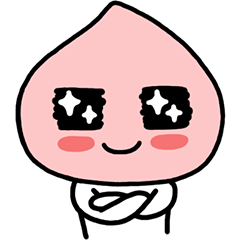[재산보전(1)] 돈갚을 사람이 무자력이 되버렸어요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못 받은 경우 있으신가요? 혹은 못 받을 것 같아서 걱정되는 경우 있으신가요? 투자계약으로 금전을 제공하고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있으신가요?

돈을 빌려주는 계약 = 금전대여계약
돈을 빌려준 사람 = 채권자
돈을 빌려 간 사람 = 채무자
채권자가 금전대여계약을 하면서 채무자의 집이나 차와 같은 재산에 담보를 설정해두었다면 채무자가 못 갚더라도 그 때가서 담보를 실행하면 금전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런 담보를 설정하지 않았다면요?
채무자에게 집도 있고 차도 있더라도 채권만으로 금전을 회수 받을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채권은 사람에 대한 청구권일 뿐,
재산에 대한 권리가 아니거든요.
채권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지고 왔다가는 형법상 절도죄로 처벌받을 뿐입니다.
드라마에 가끔 나오지요. 채무자가 야반도주를 했다면서 그 집에 가서 살림살이라고 들고 가는 모습.
처벌하려 들면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강제집행입니다.
채무자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으로부터 나의 채권이 존재함을 인정받고, 그 판결을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로 국가가 채권자 대신 집행을 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돈을 못 받고 있는 사이에 채무자가 위장이혼으로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이나 동산을 모두 재산분할 명목으로 아내에게 명의이전해버렸다면요? 혹은 채무자가 아무것도 모르는 제3자에게 재산을 모두 팔아 버렸다면요?
이런 경우 실제로도 많습니다. 드라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결과 채무자가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는 무일푼이 되었겠지요? 법원으로부터 채권을 인정받는 판결을 받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채권자취소권입니다.
용어가 생소하신가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손해 끼칠 것을 알면서 자기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해서 그 재산을 원래의 채무자 재산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손해 끼칠 것을 알면서 자기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 =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채권자취소권을 "사해행위취소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해행위 詐害行爲
속이다, 가장하다 사詐 + 해하다 해害
사해詐害 = 속여서 해를 가하다
규정도 눈으로 확인해야지요.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 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407조(채권자 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 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물론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더라도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을 매수한 사람, 그 매수한 사람으로부터 다시 매수한 사람은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사해행위인 것이 제3자 입장에서는 적법한 거래 행위였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채권자취소권을 법리적으로 복잡하고 여러 이해관계인들의 이해를 조정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도 제한해두고 있고, 채무자와 거래한 제3자의 거래 당시 인식도 고려합니다. 이해관계인들의 내심의 의사에 대한 입증책임도 다 나누어 두었고요.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글에서 설명해볼게요.
그나저나 민법의 힘은 참 대단하지요?
계약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동시에 모든 당사자의 계약의 자유를 존중하기 위해 이해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정해 균형점을 찾아나가는 법이 민법이거든요.
민법을 알면 알수록 민법을 관통하는 이치에 감탄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