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치대를 졸업하고 한동안 학회 세미나, dental conference를 엄청 다녔었다. 학교에서 배운 기초적인 지식을 넘어서 좀 더 현실적이고 새로운 지식에 눈을 뜨는 계기가 되었다. 지역을 불문하고 새롭고 유용한 지식이라 생각하면서 부지런히 다녔었다. 한 십여 년 그렇게 하고 열의가 시들해졌다.
세미나에서는 auditorium에 올라오는 강사들은 나름 자신 있고 내세울만한 케이스들을 들고 나와 열심히 설명을 한다. 처음엔 나도 부지런히 따라가서 비슷한 결과를 낼 수 있게 최선을 다하자..라는 착한 다짐도 하며 열심히 필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강사를 따로 만나 질문도 하며 열공했다. 나름 최첨단을 따라가고 이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도 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매일 밀려드는 환자들은 특별한 치료를 요구한다기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치료가 필요했고, 그런 필요를 충분히 제공하기도 벅차기 시작했다. 나도 나름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그런 케이스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아무나 나의 희생양으로 삼을 수도 없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눈에 들어오는 것은 병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지에 대한 'management' conference 였다. 시간을 투자해서 참석한 그런 세미나에서는 좀 더 상업적인 마인드를 요구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하기 바빴다. 인간적으로 좀 더 냉정해져야만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나하고는 괴리감이 너무 많아 보였다. 그러디 보니 새로운 지식에 대한 열정이 점점 식어져 갔다.
첨단 기술을 접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시술을 많이 하고,
새로운 장비들이 줄줄이 소개되고,
비즈니스 플랜을 전문가 들여서 세우고
그렇게 만든 플랜으로 경영마인드를 유지하고
그렇게 그렇게..
이렇게 정리되는 가운데 이런 것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건지 헷갈리기 시작했다. 각 부분의 전문가들이 줄줄이 나와 자기 분야를 멋있게 설명하는 가운데, 청중석에서 듣고 있는 나는 주눅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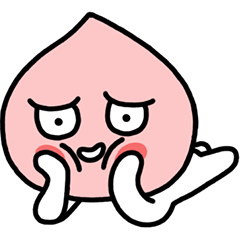
하지만..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다. 저렇게 business oriented model을 강조하는 저 강사가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가까운 치과를 갔는데 간단히 치료될 일을 몇천 불 들어가는 치료를 요구받으면 그 기분이 어떨까? 저렇게 implant expert라고 자신 넘치는 강사가 당신의 아버지의 틀리가 부서져 고쳐달라고 집으로 찾아오면 과연 뭘 해줄 수 있을까? 유명한 세미나를 가면 갈수록, 구석구석에서 기본에 충실한 의사들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한다.

요즘은 세미나가 여기저기 하도 많아져서 그 많은 강사들의 질적 qualification이나 현실적 접근이 얼마나 용의 한 지 의구심이 들 때가 많다. 의사들의 휴가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세미나는 또 얼마나 많은지. 세미나를 통해 전문가들에게 도전을 받고 나의 학구적 열정을 유지하는 것은 언제나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거기서 정말 필요한 정보들을 가려내고 매일의 진료현장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실력과 인품으로 바꾸는 것은 영원한 숙제인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