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디지털 이주민의 '디지털 세상' 정착기
생존을 위한 배움에서 함께 즐기는 디지털 주민 되기.

삐삐라는 신문물에 감탄하고, 디지털 환경을 만든 세대
저는 40대입니다. 익히 알려졌듯 X세대죠. 젊음과 신세대의 상징이었습니다. 저의 20대부터는 디지털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군대 제대를 하자마자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삐삐 개통하러 갔던게 96년도입니다. 그 이후로 '삐삐 - 씨티폰 - PCS폰 - 피처폰..'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 아이폰 3GS를 손에 쥐고 아내의 수많은 구박을 받아가며 3일간 밤낮으로 폰만 들여다본 경험이 있네요. (그렇게 구박했던 아내는 얼마후 아이폰을 쥐고서 일주일 밤낮을 보더군요 ㅋㅋ)
20대 후반에는 LG전자 해외마케팅에 입사하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실력이 아주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 때 당시 초고속으로 성장했던 사업이 있었는데, 바로 ODD, Optical Disk Drive, 달리 말하면 'CD, DVD넣는거 & 굽는거' 였습니다. 4배속 나오면 얼마 안있어 8배속, 얼마 안있어 16배속... 쉴새없이 신제품이 나오고, 전세계로 그 신제품을 팔고 다니느라 바빴던 경험이 있네요. CD - DVD - 블루레이를 거치며 숨가쁘게 달렸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이제는 그런게 달려있는 PC는 찾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디지털로 인한 상실감 비슷한 그런거..
어쨌거나 X세대는 나름대로 디지털 문명을 만들기도 했었고, 새로운 문물을 두루 겪었다는 자부심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거나 지금의 트렌드와 환경을 개척하고 만든건 나야" 하는 식의 생각 말이죠. 그런데 어느샌가 나이가들어 문득 (아니 진즉에) 보이기 시작한 흰머리 만큼이나 은근하면서도 확실한 변화는 있어온 것 같습니다.
그 변화가 썩 유쾌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단지 전보다 늙었다는 것 말고도요.)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을 접하고 자란 '디지털 원주민' 대비해서는 내가 언젠가 올드해져 있다는 입장 또는 관점의 변화. 그 입장과 관점의 변화라는 것은 디지털 도구 활용법을 배우는 것보다도 훨씬 어려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직에서 일하는 친구들은 이제 부장과 임원쯤 자리에 와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젊은 세대 '만큼' 디지털을 잘 다루지만, 대다수는 젊은 세대에 배워야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0대의 나이가 되니 확실히 친구들과 편하게 만나기 어려워짐을 느낍니다. (개인적 성향도 있습니다만) 1년에 한 두번 겨우 만나는데요. 친구들과 얘기하다보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야! 요즘 애들 진짜 왜 그러냐"라고 하소연 하는 쪽, 그리고 "근데 그런건 배워야겠더라" 하는 쪽. 과도한 이분법일 수는 있겠지만, 지금껏 쌓아온 지식과 경험에 대한 자부심이 큰 친구와, 변화하는 시대니까 스스로도 계속 바꿔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점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대부분의 '꼰대'는 본인이 꼰대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듯, 본인이 '디지털 이주민'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위치에 올라있는 친구들이 '디지털적으로' 인식과 태도를 바꿔가겠다는 결심을 하지 않으면 본인도 조직도 어려워집니다. 민감한 얘기지만 40대 이상은 재취업이 어렵다는 것도 이 부분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트렌드에 대한 '감'이 살짝 떨어지는 사람들을 굳이 높은 연봉에 모실 필요가 적어지는 것이죠.
X세대의 입장에서보면 나름대로 디지털의 원조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디지털 원주민의 라이프 스타일을 관찰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어느샌가 '구닥다리' 취급을 받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시대의 흐름을 볼 때 기성세대가 기존 방식을 고집할수록 효율이 점차 떨어질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일본과 한국을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디지털 활용면에서는 한참 뒤처져 있습니다.) 디지털로 인해 뭔가 상실감이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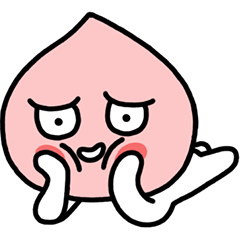
디지털 이주민이 원주민과 함께하는 법, 1순위는 태도
보통 3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점차 드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트렌드에 뒤쳐졌나?" 가끔 누군가에게 듣는 이야기, "OOO 아시죠? OOO 써보셨어요?" 이런 말을 들을때 약간 오버하면 가슴이 철렁할 때가 있습니다. 다들 쓰는데 나만 모르고 있었던게 있나? 하는 생각이 있는거죠. 그런데 사실 알고보면 내게는 그다지 필요치 않은 것들도 많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수많은 도구들을 다 알고 능숙하게 쓴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뿐 아니라, 이것저것 많이 쓰는것이 의외로 효과가 그리 높지 못하다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얼마나 많은 도구를 알고 있느냐, 쓰고 있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태도입니다. 저는 다음의 세가지 정도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첫째, 알고 있다는 착각을 알아채야 합니다. 바로 엊그제 최두옥 대표의 '리모트워크' 워크샵이 있었습니다. 강의 주제 중에 '구글 캘린더'가 있었는데요. 사전 협의때부터 설명을 들어보니 나는 '구글 캘린더'를 쓰고 있다고 착각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일정을 구글 캘린더에 정리했을 뿐, 그 외에 추가되는 수많은 (그러면서 내게 필요한) 기능을 거의 쓰고 있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둘째, 호기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호기심이 노력한다고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어떤 이유든간에 갖고 있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많은 솔루션들이 새로 만들어지고, 기존에 쓰던것도 기능이 업데이트 되기 때문입니다. 호기심을 유지하다 보면 다른 도구를 쓰거나 업데이트 기능을 접하더라도 훨씬 빠르고 쉽게 익숙해 지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에버노트를 오래 쓰다가 원노트를 써봤는데 나쁘지가 않더군요. 그리고 Workflowy, Notion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각 도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점차 알게 되면서 유연하게 취사선택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셋째, 일단 만져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30대 직장인일 때 선배님의 PC설정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꽤 맘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 후로 그 선배님이 종종 하신 말은 "야! 지금 딱 됐어! 지금이 좋아, 뭐 바꾸지마!" 였습니다. 한번 설정이 바뀌면 적응하기 힘들거나 귀찮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ZOOM에서 '설정'을 들어가보면 정말 많은 선택지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특정 프로그램의 사용 초기에는 최대한 이래저래 만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프로그램이 폭탄처럼 터지거나 복구가 불가능하게 망가지는 것도 아니니 바꿔가며 실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속적으로 베타상태에 머물기
디지털 도구의 대표적 특성은 '지속적 베타방식'입니다. (툭하면 업데이트 해도 되냐고 나에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므로 그것을 사용하는 유저도 '지속적 베타방식'을 유지해야 합니다. SW는 계속 버전업을 하는데, 유저인 나는 특정 버전에만 머물러 업데이트 없이 살아가면.. 나는 그냥 그대로 있었을 뿐인데 '구닥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긴장감이나 비장함을 가질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호기심을 갖고 만져보고, 그러다가 모르겠으면 주변의 디지털 원주민에게도 물어보고, 그들이 만든 너튜브 영상을 보아도 됩니다. 태도만 점차 바꿔간다면 디지털 이주민도 원주민과 즐겁게, 함께 놀며, 일하며, 즐길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