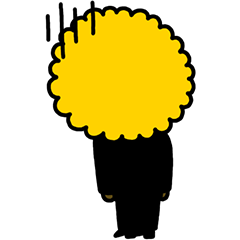귀 막은 토끼가 나였어.
영화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가...
영화 관련 TV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가 뜬금없이 날 만났다. 내 모습을 봤다.
게스트가 서너명 나왔는데 모두 자기 분야에서 쟁쟁한 사람들이었다. 다들 아는 것도 많고 언변도 좋아서 그들이 가진 통찰력을 듣는 게 정말 즐거웠다.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영화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문득 게스트 A가 B의 의견에 반론을 제기했다.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저는 이 영화를 이런 관점에서 이러저러하다고 생각해요.”
“제. 얘.기.는.요.”
B가 갑자기 한 자 한 자 또박또박 끊어 발음하며 조금 전 자기 의견을 다시 한번 피력했다. 한 자리 건너에 앉아있는 A의 눈을 아주 똑바로 쳐다보면서... A가 굉장히 무안해했음은 물론이다. TV 밖에 앉아있는 내 눈에 다 보일 정도로. 사실 정답이 있는 얘기가 아니었고 둘 다 맞는 말이었다. 아니러니하게도 이날의 주제는 ‘오만함이 인간을 어디까지 추락시키는가’였다.
정색하며 딱딱 끊어 얘기하는 B에게서 나를 봤다. 누군가의 다른 의견이 마치 내게 쏘는 미사일처럼 느껴지는 피해의식과 옹졸함을 가진 내 모습 말이다.
B의 경우는 성공한 사람만이 느낀다는 자부심의 발로 같은 거였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결국 보여지는 결과는 같았다. 나에게 반론을 제기하는 ‘다른’ 의견은 듣기 싫고 그래서 그냥 내 의견만 밀고 나가는 거다.
내가 받은 교육에서는 누구도 내 의견, 남의 의견을 묻지 않았다. 답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기도 한데, 시험지가 요구하는 정답은 대부분 하나였다. 그러니 토론을 할 때도, 무언가 다른 걸 할 때도 자연스럽게 '답은 하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다. 답을 확인할 교과서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니 결국 내 논리로 완벽하게 짜 맞춘 내 답만이 정답이 된다. ‘단답형 교육’이 이렇게나 무섭다.
처음에는 B가 젊은 친구인 줄 알았다. 대단히 영민한 사람이었는데 나이가 들면 으레 기대하게 되는 유연함과 포용력 같은 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니었다. 나와 같은 세대였다.
어쨌든, 어린 시절 받았던 교육을 탓하기엔 난 너무 나이 먹었다.
그보다는 내 수양이 부족한 탓이리라.
“전 좀 생각이 다른데요” 하는 얘기를 들으면 덜컥 하고 닫히는 토끼 모양 귀를 억지로 열어젖히고, 배움의 기회가 왔음에 쌍수 들고 환영해야 한다.
어차피 내 취향에 최적화된 인터넷 알고리즘에서 내가 뭔가를 배우기는 힘들 것 같고.
“나는 너와 의견이 달라요”라고 소리치는 사람만이 내 스승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쌍수 들고 환영하는 지경에까지 (빨리) 오를 수 있을까?
날 단련시켜 보겠다고 “나랑 얘기 좀 해”라며 아무나 붙잡고 말을 걸 수도 없고.
날 세뇌시켜 보겠다고 “나랑 의견이 다른 사람, 환영!” 소리나는 스피커를 밤에 줄창 틀어 놓고 잘 수도 없고.
참...... 숙제다, 숙제.
평생 숙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