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학관/박정민의 수다다방] 김려령의 '완득이'
Work & Culture
얼마 전에 신랑하고
커피원두를 사러 카페에 갔었습니다.
요새 신랑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집에서 드립커피를 만들어 마시고 있거든요.
(참고로, 저는 커피가 “써서”
못 먹는 사람입니다. ^^
한 선배님은 저한테
“블랙커피 마시게 생긴 녀석이
코코아를 마신다”고 하신 적도 있고,
어떤 고객분은 동료에게
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박정민 박사님은
커피를 못 배우셨대요”라는
표현을 하셔서
같이 웃은 적이 있습니다. ^__^)
우리 앞에 오신 손님도
마침 커피원두를 주문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뭔가 대화가 삐걱삐걱거리더라구요.
가게 사장님은 뭔가 어려운 도구 종류,
도구 이름, 브랜드를 언급하시면서
이 중에서 어떤 것을
어떻게 쓰느냐고 질문을 계속 하셨고,
(물론 저는 100% 커.알.못이기 때문에
그 중의 어느 단어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ㅠㅠ)
손님은 당황하시면서
커알못인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만 하셨습니다.
“전기 주전자로 물을 끓여서 붓는데요”
“거름종이로 커피를 거르는데요”
분명히 카페 사장님께서는
손님의 커피 취향과 커피를 만드는 방법에
꼭 맞는 원두를 제공하고 싶으셔서
세부 정보를 확인하신 것일 거고,
손님은 자신이 커피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를 한 것인데도,
결국 양쪽의 마음은
가운데서 만나지 못한 느낌이었습니다.
옆에서 보기만 했는데도
정말 안타깝더라구요. ㅠㅠㅠㅠ.
저는 기업 관리자분들과 코칭을 하면서
전문가의 언어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그날 보았던 카페에서의 장면에서도
‘정말 좋은 전문가는 어떻게 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분야에서 오래 일을 하다보면,
그 업계 사람들끼리 통하는 용어를
몸에 익히게 되지요.
정말 조사 빼고는
축약어와 전문용어로 가득한
문장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전문가들끼리 업무대화를 할 때야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전문용어를 잘 쓰게 되면
오히려 일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되겠지요.
하지만,
상대방이
일반인이라면 어떨까요.
특히 고객이라면요.
제가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아
쓰지 않으려 노력하는 표현 중에
“쉽게 말하자면요”
“어렵죠. 예를 들어 설명해드릴께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세요"
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왠지 대화 상대방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며
한수 가르쳐주겠다는 느낌이 들어서,
직접 듣거나 옆에서 듣는 입장에서는
영 불편감이 생기더라구요.
고객은 분야전문가인 나만큼
전문용어를 알고 있지는 않은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시하거나
깔봐야 할 사람은 아니잖습니까.
나보다 역량이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 분야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나와는 다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고
나의 전문성을 통해
도움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고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전문가라면
고객에게
자신의 분야에서만 통용되는
전문용어를 남발하면서
어설픈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하수(下手)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어를, 어떤 문장을
어떻게 사용하면
상대방의 이해도와 수용도를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하며
만남 전에 미리 준비하고,
대화를 할 때에는
상대방의 반응을 민감하게 관찰하면서,
그에 따라 유연하게 자신의 표현을
선택하고 바꾸고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카페에서 신랑과
전문가의 언어표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저는 쓴 커피가 아니라
달콤한 바닐라 밀크쉐이크를
먹었습니다.
그것도 밤 아홉시 반에!
하하하!!!)
최근에 읽었던
김려령 작가님의 소설
‘완득이’의 한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방구석 1열’이라는
영화 프로그램을
매우 좋아하는데요.
유아인 배우님이 출연해서
영화 ‘완득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보다가,
문득 제가 ‘완득이’를 영화만 보고
원작은 읽지 않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바로 주문해서
작가님의 기가 막힌 언어표현들에
“부러워, 부러워”를 연발하며
재미나게 읽었지요.)
 완득이 / 출처 : 알라딘
완득이 / 출처 : 알라딘김려령 작가님의 ‘완득이’는
제1회 창비청소년문학상 수상작이더군요.
유아인 배우님과 김윤석 배우님이 출연한
영화로도 만들어졌구요(이한 감독님).
(서점에서 분류를 ‘청소년소설’로 해놓으시니
저 같은 철없는 어른들이 잘 못 찾아봅니다 ㅠㅠ.
‘청소년, 어른 모두모두 보는 소설’로
분류해주시면 더 좋을텐데 하는
자그마한 바람도
살포시 가져보았습니다.)
자, 다시 소설 ‘완득이’에 나온
‘전문가의 언어’ 이야기로
돌아가볼까요. ^^
--------------------------
킥복싱을 정식으로 배우기로 한 완득이에게
관장님은 킥복싱 경기 동영상을 보여주십니다.
“잘 봐. 공격도 제 몸을 지키면서 들어가야 해”
(미들 킥을 날린 선수 정강이가
상대 선수 정강이에 부딪히면서
그대로 뚝 부러지는 장면)
“정강이 대 정강이가 되는 거야.
근데, 차는 쪽 정강이뼈가 부러질 확률이 높다.
철봉대에 킥을 날린 거와 흡사하지.”
“무리하게 한 방 노리고
들어가다 보면 저런 일이 벌어진다.
링 위에서는 정신을 놓지 마라.
주위에 어떤 것에도 동요되지 말고,
상대의 움직임과 거리만 생각해.
그리고 찬스가 왔을 때, 퍽.”
그런데, 관장님은
주먹으로 학교 짱이 되겠다고 온
중학교 1학년 세혁이에게는
이렇게 말을 해주십니다.
(세혁) “관장님. 저 어제 맞장 뜨다가,
스텝 꼬여서 XXX 맞았어요.
이거 배우면 정말 싸움 잘하는 거 맞아요?”
(관장님) “녀석아,
싸우는 데 스텝이 어딨어. 그냥 패.”
(세혁) “예?” (어이없는 표정)
(관장님) “죽도록 패. 안되면 뭐라도 던지든가.
싸움에 치사한 게 어딨냐.”
우리 멋진 관장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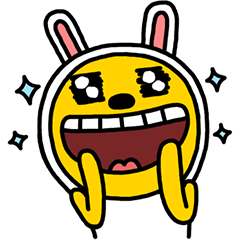
진정한 전문가는
현재의 상황과,
다루고 있는 과제의 특성,
그리고 대화 상대방의
역량 및 준비도에 맞게
언어의 내용과 표현을
골라쓴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었던
좋은 구경이었습니다. ^^
오늘,
내가,
내 분야의 전문가로서
사용했던 언어표현은
어느 부분을
조금 더
다듬고
문질러 닦을
필요가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