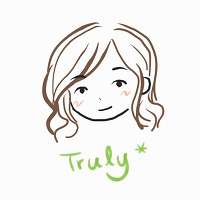거짓말
어차피 나는 나
'나'는 '나'이다. 이것에 다른 노력은 필요없다. 다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내가 되고, 내가 밥을 먹으면, '밥을 먹는 사람'이 내가 된다. 그런 고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싶다는 나의 바람은 영영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쯤은 잘 안다. '그런 바람을 가진 사람'이 되어 있으니 이미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는 실패한 것이다.
나는 여전히 나이다. '나'라는 존재는 내가 생각을 일으키고 행동을 선택하는 지금 이 순간에 있다. 또한 세상 모든 것은 내가 숨쉬는 지금 이 순간을 함께 살아간다. 그것이 '나'라는 존재가 가진 '삶'이고 '세상'이다. 결코 가볍지 않은 삶의 무게를 진 사람들에게 살아 있음이 마냥 벅찬 감사함으로 와닿을 리는 없다. 그러거나 말거나, 모두가 생명 앞에서 공평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나의 세상과, 너의 세상이 다르다는 것이 우리가 갈등을 겪는 이유일 것이다. 서로의 세상을 온전히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다르다는 것이 신선한 기쁨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결코 같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에 쓰디 쓴 좌절을 맛보고 만다. 보이는 만큼, 혹은 보고 싶은 만큼 봤을 뿐이면서 하나의 세상을 온전히 이해했다고 착각한다. 그러다 세상과 세상을 이어주던 연결고리가 사라지고 나면 '내가 알던 네가 아니다'라는 소리만 메아리가 되어 허공을 떠돈다.
과연 우리가 서로를 알았던 적이 있을까. 서로를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 아니, 이것부터 물어야겠다. 나는 나를 알았던 적이 있을까. 나를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 나의 세상에 문을 두드리는 또 다른 세상들을 향해서 언제나 반갑게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렇게 하기에는 내 세상이 너무 좁았는데도, 내가 나를 모르니까 거짓말만 할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면, 환영한다고 해놓고 막상 발을 들여 놓으면 밀어내기 바빴다거나. 모든 것이 거짓말이 아닌 거짓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