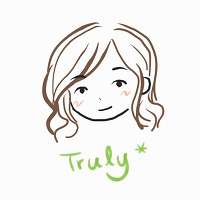분노
감정의 습관
초등학교 시절이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자주 쓰는 말을 친구로부터 들으니 화가 치밀어 오르는 나를 인지했던 순간. 단지 같은 말을 했을 뿐인데, 그 말 한 마디 때문에 친구의 얼굴이 미워하는 사람의 얼굴로 겹쳐 보였다. 이후로도 그런 순간들은 많았는데 그때마다 '그'가 눈앞에 없을 때마저 그에 대한 기억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는 것이 너무 분했다.
나는 딜레마에 빠졌다. 화는 나지만, 화를 내는 것이 상황에 맞지 않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다. 기억과 연결된 나의 감정을 배제하고 다시 생각해보면 친구의 말은 전혀 '화낼 만한 것'이 아니었다. 세상에 화낼 만한 일과 화낼 만한 일이 아닌 것이 절대적으로 나뉘어진 것도 아니지만, 걸핏하면 화가 나는 내가 너무 싫었다. 스스로도 납득이 안 되는 감정들에 좀처럼 솔직할 수가 없었다.
더 어린 시절부터 차곡차곡 기억된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셈이다. 어른이 되어 기억이 점점 희미해졌다고 해도 그것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감정의 습관은 무의식에 남아서 '이유없이 미운' 사람들만 늘어났다. 터지려 하는 분노와 통제하고자 하는 이성 사이에서 무엇이 진짜 내 마음인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웠다. 통제하려 하면 할수록 감정은 더 미친 듯 날뛰었다.
이것이 맞을까, 저것이 맞을까 아무리 저울질 해도 '나'라는 개체 안에서는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나'로부터 한 걸음 떨어져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수련 명상 방법이 반가웠던 것 같다. 명상 방법대로 살아온 삶에 기억된 생각을 버리고 나니까, 그것들이 더 이상 현재의 나를 괴롭히지 못하게 되었다. 정말로 기억은 기억일 뿐이었다. 통제하기 힘들었던 화의 빈도나 강도가 모두 줄었다.
분노의 원인을 알지는 못했었는데, 삶을 여러 바퀴 돌아보고 버리면서 잊고 있던 기억들과도 마주할 수 있었다. 미워하는 대상으로부터 자존심이 무참히 짓밟혀서 분노를 느꼈던 일. 나는 그 당시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그럼게 삼킨 나의 수치심은 더욱 큰 칼날이 되어 오래도록 내 마음을 후벼팠다. 이제 와 잘못을 물을 수도 없는 어리고 철없던 시기에 무심코 던진 그의 말 한 마디가 내 삶을 뒤흔들었던 것이다.
마음을 버리면 감정의 습관도 바뀐다. 용서하려고 애를 써도 상대를 생각하면 분노가 가시지 않았었는데 명상 덕분에 나는 '용서해야지'라는 생각도 없이 편안하게 그를 대하고 있다. '나'의 입장으로 담은 기억 때문이라서 그 누구도 알아줄 수 없었던 분노와 억울함이 사라진 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인다. 내 안에서 이는 감정이 너무 클 때는 감정 표현도 어려운 일이었는데, 지금은 화를 내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