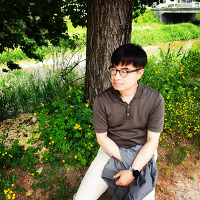사실은, 너무 많은 겨를
어째서 삶은 점점 더 분주해지기만 하는 걸까.
언제나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막상 여유와 겨를이 눈앞에 툭 떨어지면 두 손에 떡을 든 듯 어쩔 줄 모른다. 내가 그랬다. 오래전, 직장을 그만둘 무렵 나의 업무상 마지막 미션은 부산에서 끝났다. 일정을 마치고 부산에서 계획 없이 하루 머물기로 하고 오전 일찍 남포동에 갔다. 백화점은 아직 오픈 전이었고 평일의 거리는 휑했다. 영화의 거리를 두 번쯤 왕복했고 한산한 시장 골목들을 기웃거리다 커피 한 잔, 씨앗호떡을 절반쯤 먹고는 버렸다. 자갈치 시장 생선 좌판을 보며 어슬렁거리다 문득 걸음이 멈춰졌다.
이상했다. 신기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아직 정오가 되기 전이었고 뭘 해야 좋을지 몰랐다. 열차 시각은 여덟 시간도 더 남았는데 할 일이 없었다. 그때 걸려온 전화 한 통. “이따 저녁이나 할까?” 갑자기 생긴 약속이 그렇게 반가울 수 없었다. 택시를 타고 부산역으로 와 차표를 바꾸고 돼지국밥을 훌훌 들이켠 다음 서울행 열차에 올랐다. 자리를 찾아 앉으니 비로소 안심이 됐다. 더 많은 시간은 필요 없고 더 좋은 시간이 그리운 거구나, 한참을 생각했다.
떠오르는 다른 장면이 있다. 풀지 못할 생의 수수께끼 같은 그림. 언젠가 사진을 찍기 위해 강원도 영월의 동강 상류에 간 일이 있는데 어느 마을에서 이상한 풍경을 보았다. 할머니 셋이 점방 앞 평상에 가만히 앉아 있는 장면. 늦여름 비가 제법 내렸고 건너편 산허리에 안개비 자욱했는데 할머니들은 일제히 한 방향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매미 소리를 배경으로 마치 시간이 정지된 것 같은 기이한 측면도는 사진에 담기 그럴싸한 장면이라 가만히 셔터를 눌렀다.
낙숫물이라도 세는지. 골똘히 뭔가 생각하는지. 아니면 눈을 반쯤 감고 주무시는지 평상의 할머니들, 얼마 남지도 않은 생의 금쪽같은 시간을 저렇게 허비하시는구나. 아까워라. 짠한 마음이 들었는데 나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할머니들, 가만 앉아 있는 일 말고 뭘 하셔야 좋았을까? 콩을 까거나 양말을 깁고 아니면 화투라도 치는 게 유익했을까? 나중에 알았다. 할머니들은 다만 지금 멍하니 있는 게 가장 좋기 때문이라는걸. 시간을 흘려 보내는 게 아니라 순간을 가만히 붙잡고 있던 거라는걸. 잠시간 시계가 정지된 순간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일상은 점점 분주하고 생각할 것도 많고 복잡해지기만 한다. 숨 쉴 겨를도 없이 번거로운 일은 어째서 자꾸 많아지기만 할까. 그런 생각이 들 때 가끔씩 그 장면이 떠오른다. 평상에 그림처럼 가만히 앉아 있던 할머니들. 내게는 무의미한 시간 낭비처럼 보이던 그 장면 속에서 사실은 그 순간 가장 농밀한 시간을 함께 사용하고 있던 그 할머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