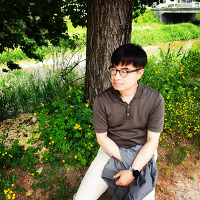내가 글을 쓰는 이유
쓰지 않고 못 배기는데 우리가 쓰기를 멈출 리가 있겠는가.
쓰는 행복 또는 괴로움
명절 전날, 저녁상 물린 앉은자리에서 아버지는 불린 밤을 스무 개쯤 치신 뒤 바닥에 엎드려 지방을 쓰셨다. ‘현고조고학생부군신위’에서 ‘망실유인전주최씨신위’까지. 귀퉁이 자른 한지에 모나미 붓펜으로 내려쓴 제수용 글자들은 모두 단정하고 가늘며 힘이 넘쳤다. 유년공부를 서당에서 시작하신 아버지는 한글이나 한문이나 달필인데 매번 당신 글씨를 못마땅해 하셨다. 나중엔 흐려진 시력을 탓했지만 언제나 펜을 놓으며 “에잇. 영판 베맀다” 하면서도 다시 쓰는 일 없이 지방틀에 올리시는 걸 보면 괜히 하는 말 같기도 했다.
덕분에 어릴 때부터 나는 글씨로, 글짓기로 꾸지람을 귀에 달고 자랐다. 신언서판이란 난해한 경구를 고작 열살 남짓에 깨우친 정도랄까. 그렇게 키우시고도 아버지는 장남이 국문과를 가겠다고 말씀 드리니 “그거 해서 밥이나 먹고 살겠나” 혀를 차셨다. 결국 괜한 걱정이었다. 신도 언도 서도 여전히 안 되지만 그래도 나는 이렇게 글을 쓰는 사람이 되었다.
글씨가 곧 글이던 시절은 고릿적 이야기지만 글은 언제까지나 쓰는 행위일 게 틀림 없다. 펜으로 쓰든 자판을 치든 글이란 오로지 쓰는 것이다. 손 글씨 대신 자판을 침으로써 우리는 악필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났다. 과연 그렇더라도 쓰는 번거로움이 주는 고귀한 희열은 사라지지 않는다. 좋은 펜에 대한 집착이 여전한 이유다.
쓰는 일을 업으로 살면서 나는 많은 쓰는 사람을 만났다. 쓴다는 것의 괴롭고도 행복한 과정에 대해 말하고 들었다. 들으니 나와 다르지 않아 퍽 다행스러웠다. 쓰는 일, 기록이란 인류에게 본능이다. 동굴에서 그랬고 감옥에서 그랬다. 쓰지 않고 못 배기는데 우리가 글을 싫어할 리 없다.
사랑을 잃고 쓰는 문장들
기형도가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라고 했을 때 나는 정말 그가 쓴다는 것의 본질을 제대로 말했다고 생각했다. 좌절과 비통이 탁월함을 생산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험에 의하면 대체로 좋은 문장은 애틋함을 필요로 한다. 기쁘고 들뜬 가운데 글을 제대로 써본 적이 없다. 글 쓸 때 필요한 감정을 누군가는 약간의 슬픔이라고 규정하던데 과연 그러하다.
언젠가 김훈의 글에서 ‘겨우, 쓴다’라는 문장을 발견하고 완전히 공감했다. 글은 늘 겨우 써진다. 빠듯하게 끝까지 몰고 가서 진을 빼듯 마침표를 찍는다. 언제나 끝보다는 시작이 어렵다. 세 시간 중 먼저 두 시간 반은 으레 머뭇거린다. 갈피를 잡는 기나긴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쫓기고 쫄려서야 분량이 채워진다. ‘겨우’는 내게 그런 의미다. 한가로운 시간, 걱정 없는 시간엔 글이 나오지 않는다. 당연하다. 뭐 하러 글 같은 걸 쓰겠는가. 그 좋은 시간에.
잡지사에 일할 때, 런던에서 디자인을 공부했다는 패션팀 인턴이 노트북을 펴놓고 울상짓고 있는 모습을 봤다. “한 시간 넘게 모니터를 쳐다보고 있는데 막막해서 숨이 막힐 것 같아요. 뭐라고 써야 하죠?” “뭐든, 일단 아무 단어라도 써보지 그러니?” “첫 글자를 못 치겠는걸요. 하얀 워드 화면이 너무 무서워요.” 그녀는 거의 울 것 같았다.
어떤 문장으로 시작할 것인가는 영원히 어려운 숙제다. 반드시 첫 문장으로 관심의 팔꿈치를 비틀어야 함을 알기에 그렇다. 바로 이 문장이 그러하리라, 담대하게 시작하면 좋겠지만 많은 글 쓰는 새가슴들은 항시 명문을 열망하면서도 믿음이 알량하다.
내 믿음은 이거다. 좋은 문장은 인생을 풍요롭게 한다는 것. 원래 사람은 글을 좋아한다. 그것도 긴 글을 사랑한다. 모바일 디지털의 시대라 하더라도 그러하다. 누군가 인증샷을 남길 때 어떤 이는 문장을 음미한다. 좋은 문장은 황금의 시간을 손에 쥔 이, 진짜 여유가 무엇인지 알아낸 사람을 위한 선물이다. 비록 사랑을 잃지 않았어도 모두 간절하게 쓴 글. 오늘도 당신은 탐독하시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