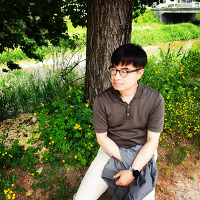오후 세 시의 계단 오르기
누군가는 세 시가 없는 오후를 보내겠지만
티브이를 본다, 심야에. 끊지 못한 오래된 버릇. 채널은 항시 고정인데 스포츠, 주로 축구 중계방송이다. 매일 심야에 혼자 거실에서 축구를 본다. 축구 보고 티브이 끄고 기도하고 잠을 잔다. 생각하니 이 버릇은 생업에 종사하다 생긴 것 같다. 잡지 마감은 주로 심야에 끝나는데, 집에 와 씻고 젖은 몸을 선풍기 바람에 말리며 수박 한 쪽 물고 리모컨을 켤 때. 지구 반대쪽 월드컵 경기가 생중계되고 있을 때. 누가 이기든 모두 잠든 밤, 생각을 모조리 방기한 자의 단독 플레이.
본방이건 재방이건 나오는 대로 본다. 요즘도 틀어주는 한일월드컵 4강 경기며 프리미어리그 같은 유럽 리그. 아니면 하다못해 국내 초등부 대회 경기까지. 운 좋게 한국 선수가 뛰는 유럽 리그 생중계가 나오면 고맙고, 소리는 죽인 채 화면만 켜놓는 수준으로. 응원하는 팀 하나 없어도 열렬히 축구를 본다. 축구를 모르고 팬을 자처한다. 진짜 팬이 들으면 핏대 세울 말이지만 축구는 극히 단순하다. 그래서 몰입한다. 지고 있는 팀을 응원하며 패스가 빨랐네, 발이 느리네, 드리블이 무리였네 혼자 무릎도 치고 탄식도 한다. 그저 명분이 필요해 하는 말이지만 이때 뇌가 좀 쉬는 것 같다. 생각을 안 해도 되니까. 자다 깬 아내는 매번 잔소리지만 대답은 언제나 건성이다. 알았네 알았어, 잠깐만 놀고.
스포츠를 좋아한다. 날렵함과 대척에 있는 체형 덕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지만 공으로 하는 종목은 뭐든 사랑한다. 사실 그 중엔 제법 하는 것도 있다. 탁구나 볼링, 당구 같은 것. 어렸을 땐 야구광이었고 지금도 동네 축구에선 가끔 골도 넣는다. 골프를 안 하는 대신 작년부터 배드민턴을 치는데 나이 들어도 할 수 있는 종목 같아 제대로 배워두고 싶다. 지극히 당연한 찬양이지만 모든 스포츠는 빠져들 만한 고결한 매력이 있다. 안전한 규칙에 매인 공포 없는 전쟁, 무엇보다 스포츠란 근본적으로 노는 행위라서 그렇다. 품위를 고려한 놀이의 재구성이다.
글을 쓰는 즈음 정현 선수가 노박 조코비치를 이기고 호주오픈 테니스 대회 4강에 올랐다는 소식이다. 무려 4강이다. 경기 장면을 못 보았으나 나라가 뉴스로 떠들썩하다. 테니스 동호회 신규가입이 급증하고 용품 판매도 수직상승 중이라 한다. 좋은 일인데 기왕의 동호인들은 짜증과 기대가 뒤섞인다. 좁은 코트에 초보자가 대거 몰릴 것이고, 충동으로 비싼 라켓을 산 사람들이 1년도 못돼 매물로 중고장터에 우르르 내놓을 것이기 때문이란다. 그렇다 해도 테니스를 다시 시작하지는 않을 것 같다. 기본을 배우는 데만 무려 삼 년이라니까. 스타들의 화려한 플레이 관람으로 만족하는 걸로.
오후 세 시에 계단을 오르기로 했다. 뜬금 없지만 의미 있는 결심이다. 사무실 빌딩 꼭대기 층까지 숨차게 두 번 오르면 15분쯤 걸린다. 허벅지 강화와 심폐기능에 효과가 좋다. 허벅지 탄탄하고 호흡도 문제 없지만 오후 세 시의 계단 오르기가 굳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 경황 없이 살지 않기 위함이랄까. 누군가 근엄한 얼굴로 조언했는데,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다고 말한다면 그건 형편 없이 산다는 자백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현명하다면 오후 세 시에 뭘 했는지 기억해야 한다.
또 다른 이유로는 생각을 멈추고 뇌를 놀리기 위함이다. 가혹한 신체 훈련만큼 사고를 단순화시키는 방법도 없다. 군대가 건재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루키는 새벽 세 시에 글을 쓰고 칸트는 오후 세 시 반에 산책을 나섰는데 그들도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한동안 바빠도 오후 세 시에는 태연히 계단을 오른다. 누구는 간식을 먹고 누구는 오수를 청하고 누구는 세 시가 없는 오후를 지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