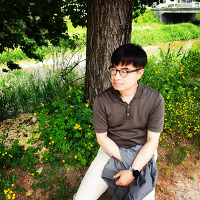벌레의 추억
누에들이 뽕잎 갉는 소리는 마치 마당에 퍼붓는 소나기 소리 같았다
희고 얇은 봉투에 담긴 그것은 까만 꽃씨처럼 보였다.
며칠이 지나자 꽃씨에서는 싹 대신 까만 벌레가 나왔다. 누에들이었다.
벌레들은 채 썬 뽕잎을 갉아먹으며 점점 하얘졌다.
점점 굵어지며 매끈하고 하얗고 징그러워졌다.
어쩌다 이놈들이 뽕잎 위를 뒹굴다 서로 뭉쳐 바닥에 툭 떨어지면 꿈틀거리는 벌레 뭉치를 손으로 집어 올려줘야 했는데, 그 물컹하고 소름 끼치던, 부드럽고 까끌거리던 키틴질 느낌이 지금도 선연하다.
싫어도 나는, 누에 치는 할매와 함께 잠박을 설치한 아랫방 잠실 한쪽에서 잠을 자야 했다.
어느새 새끼손가락만큼 굵어진 누에들이 일제히 뽕잎을 갉는 소리는 정말 대단해서 가만 들으면 마치 쏴아 하고 마당에 소나기가 내리는 것 같았다.
그럴 때 할매는 자다가도 일어나 뽕잎을 이리저리 흩어주며 흡족한 미소를 짓곤 했다.
누에들의 목자, 젊었던 할매는 섬세한 조율사였다.
누에들은 한 잠 두 잠 석 잠 넉 잠. 몇 번이나 잠을 자는데 매번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가만히 죽은 듯 시간을 보내고 나면 움쑥움쑥 자라 있는 거였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일제히 뽕잎 먹기를 그치고 입에서 조금씩 하얀 실을 내뱉는데, 그러면 이제 누에가 고치를 만들 시간이 된 것이다.
잠실 문을 닫고 며칠 지나면, 잠박에 조롱조롱 수없이 열린 새하얀 열매들.
뭐라 표현하면 좋을까, 그 희고 탐스러운 누에고치들.
동지팥죽에 박인 새알심 같던 순백의 고치를 거둬 바깥의 실들을 매끈하게 벗겨내면 할매 손에 갈무리되어 등록금으로, 병원비로 환금되었다.
우리의 소중했던 벌레의 추억이다.
*사진: 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