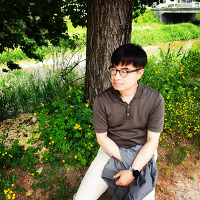흰 개
우리 곁에 잠시 머물다 떠난, 희고 따뜻한 짐승 이야기
이름은 다롱이로 할 거야.
어린 딸이 기뻐하며 말했다.
"아니, 어쩌자고 진돗개를 집에 가져왔어요?"
아내가 질색하며 말했다.
어느 날 집에 흰 개가 들어왔다. 앞뒤 재지 못한 내 욕심 탓이었다.
하얀 털뭉치 같은 어린 진돗개는 다 자란 포메라니안보다 컸다.
털 많은 동물을 싫어하는 아내는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지만 이내 포기한 듯 마트에 가서 배변 패드와 사료를 사오고 샴푸도 준비했다.
체온을 지닌 존재는 원래 그런 것인지 단 며칠 만에 희고 복실복실한 개는 우리의 오랜 식구가 되어버렸다.
누군가의 말처럼 이름을 지어주는 순간 과도한 의미가 부여되기 때문이었는지 모른다.
어쩌다 받아들인 우리의 첫 짐승은 똥을 갈기고 오줌을 지리고, 미끄러운 마루에 자빠지며 어린 딸과 달리고 식탁 밑에 구겨져 졸기도 하며 그렇게 아파트에서 일주일을 살았다.
밤에 낑낑대면 딸도 덩달아 밤새 잠을 설쳤다.
아이들은 아침에 등교를 하면서도 종일 낑낑댈 개가 걱정돼 얼굴이 근심으로 때꾼했다.
학원도 가지 않겠다고 버텼다.
일주일이 지나자 아내가 선언했다. "더 이상은 안 되겠어."
그렇게 개는 박스에 담겨 마당이 있는 아내의 친정으로 멀리 이동 조처됐다.
마당 한쪽 감나무 아래 개를 묶고 눈물로 얼룩진 긴 이별 끝에 돌아와 현관 문을 열자 집에서 휑한 공허가 몰려나왔다.
잠시 머물다 떠난 희고 따뜻한 짐승 이야기를, 아이들은 그 후로 일절 꺼내지 않았다.
대신 마당 있는 집이 아이들의 소원이 되었다.
길에서 문득 흰 개를 보면 여지 없이 생각난다.
흔적은 길고 아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