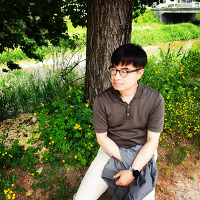기레기의 탄생
기자가 기레기라 불리는 데는 이유가 있다.
2003년 봄. 모 브랜드(어느 브랜드인지 얘기 안 하겠다) 초청으로 유럽(어느 나라인지 얘기 안 하겠다)에 출장을 갔다. 일행은 잡지 기자인 나와 일간지(종합지 경제지 말 안 하겠다) 기자, 그리고 브랜드 매니저까지 총 3명. 조촐한 규모의 출장이었다. 독일 공항(도시 이름 얘기 안 하겠다)에 내리자마자 시작된 그 경제지 기자의 요청이 황당했다. 인솔자에게 골프 부킹을 해 달라는 거다. 때는 2월. 뮌헨 거리에는 눈이 한가득 쌓여 있었다. 인솔자가 당황하며 난색을 표하자 기자는 잘 찾아보면 어딘가 있을 거라며 재차 매니저를 압박했다. 골프와 상관 없는 출장이고 바쁜 일정에 골프 칠 여유 따위는 없는데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한 이유가 궁금했다. 브랜드 초청 해외 출장 경험이 없던 젊은 기자는 출장 전, 경험 있는 선배에게 출장 스킬(?)을 배웠다는 것이다. 요구하면 다 된다고. 사실 그는 관련 담당도 아니었다. 당시 신문사에서는 브랜드 출장 제안이 오면 담당과 상관 없이 편집국 내에서 돌아가며 출장을 보내는 게 관행이라고 했다. 동행 중에는 그런 포상(또는 위로휴가) 개념으로 브랜드 초청 출장을 온 기자도 수차례 봤다. 이런 이유로 운전을 못하는 기자가 신차 시승 출장을 오기도 했고(M신문), 어떤 출장에서는 자기가 왜 여기 왔는지 모르겠다며 불평을 하다가 중간에 되돌아가기도 했다(C신문 ). 행사 참석을 위해 출장을 와서는 다른 취재에 열을 올리는 건 양반이고 심지어 노조 업무를 하던 기자가 아무 관련 없는 출장에 동행하기도 했다(J신문). 이제 막 골프에 입문해 라운딩할 기대로 안달이 났던 기자의 바람과 달리 결국 골프는 치지 못했지만 며칠 사이 조금 친해졌다고 자랑삼아 떠드는 얘기가 가관이었다. 기자실에서 일어나는 내기 바둑이나 촌지 수수. 홍보실 직원 다루는(?)는 법 등등. 아무렇지 않게, 으스대며 이야기하던, 더럽고 썩은 기자실 이야기가 20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모양이다. 검찰 출입기자단 예를 봐도 그렇거니와 그 공고한 카르텔은 변함이 없다. 기업 보도자료를 읽다 보면 항상 궁금하던 게 있다. 보도자료는 어째서 자료를 내는 기업 관점이 아닌 언론사 입장, 즉 마치 기자가 쓴 것처럼 제3자 관점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기자는 기업의 발표를 미디어 시각으로 전환할 능력이 안 되는 것인가? 아니면 재구성할 시간이 없으니 그대로 베껴 쓰라고 친절하게도 관점조차 기자 입장에서 써주는 것인가? 매체마다 똑같은 복붙 기사가 나오는 건 홍보실, 또는 대행사에서 작성해 배포한 글을 그대로 내보내기 때문이다. 기자는 자기 이름을 걸고 보도자료를 기사로 내보낸다. 스트레이트 기사라는 미명으로. 심지어 받은 자료 사진에 워터마크까지 찍어서.. ㅋ 부끄러움을 모른다. 요즘, 네이버 다음 같은 포털에 올라오는 기사를 읽다 보면 욕지기가 나온다. 기레기가 기레기라 불리는 데는 이유가 있다.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명랑해지려면, 검찰도 경찰도 종교도 법원도 국회도 교단도 아닌 기레기 청소가 훨씬 중요하고 시급하다. #유어낫언론 ; 2020년 12월 19일 토요일, 쓴 글
https://news.v.daum.net/v/20201219085640585
얼마 전, 지인의 톡이 왔다. 그는 최근 급성장한 제조업체의 임원이었다. 언론사 두 곳에서 전화가 왔다고 했다. (나쁜) 기사를 준비 중인데 어떻게 하겠냐고 물었다는 것이다. 대응할 전문 인력도 갖추지 않았고, 경험도 없던 터라 업체는 영리하게 대응하지 못했고 결국 나쁜 기사가 나갔다. 나갔을 뿐 아니라 포털에 걸렸다. 내용은 교묘한 프레임 씌우기였다. 허위 과장 광고. 효과에 대한 의구심. 전문가 인터뷰 인용. 기사에 비판 댓글이 이어지자 업체는 해당 언론사와 접촉했고 언론사는 기다렸다는 듯 연간 수억원의 광고비를 요구했다.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언론사는 업체에 재차 연락을 취했다. 광고비를 주지 않으면 후속 기사를 내겠다고. 고심 끝에 무리한 요구라 판단한 업체는 금전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언론사는 광고 문구의 허점을 파고들며 2차 기사를 내보냈다. 포털에 걸리자 여파는 작지 않았다. 판매율 하락과 이미지 타격. 그러자 스포츠 신문 등 유사한 언론들의 문의(를 빙자한 기사 예고)가 줄을 잇는 모양이다.. 아마도 이 업체는 앞으로 언론사에 지금보다 더 많은 광고비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이 업체뿐일까? 대놓고 돈을 요구하는 데가 이 언론사뿐일까? 나도 과거 기자라 불리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는 부끄러운 줄을 몰랐는데, 이제는 이런 일을 듣고 볼 때마다 부끄럽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욱, 송출되는 모든 기사가 직간접적으로 '매출'과 관련돼 있다. 언론도 기업이니 매출을 올려야겠지. 그러나... 돈 안 주면 폭로하겠다, 물어 뜯겠다 협박하는 비열한 짓이 먹히는 건 여전히 똑같다. 아니. 인터넷 여론몰이가 용이한 지금은 이런 양아치 수법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한동안 대행사 일을 할 때, 모 일간지 산하 주간지 편집장의 이야기를 들었다. 술도 안 먹었는데 쓸데없는 말을 취중농담처럼 했다. 우린 벌써 일년 매출 다 했어요. 홍보실 전화 쫙 돌려서 올해도 작년처럼 할 거죠? 하면 끝나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 없지만, 메이저고 마이너고 간에 오늘날 언론사라 이름 붙인 집단이 먹고 사는 수법이 어떤지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 멱살 잡고 뒤져서 나오면 10원에 한 대씩. 뭐 그런 거. 오늘은 뉴스를 보니, 공무원이 기레기 갑질을 견디다 못해 데모를 한 모양이다. 공무원은 직업 특성상 튀지를 못하는데, 이렇게 작심하고 들고 일어선 건 저간 사정이 어땠는지 알 만하단 얘기다. 기레기가 기레기라 불리는 데는 이유가 있다.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명랑해지려면, 검찰도 경찰도 종교도 법원도 국회도 교단도 아닌 기레기 청소가 훨씬 중요하고 시급하다. #기레기박멸 ; 2021년 5월 12일, 수요일에 쓴 글.
https://www.youtube.com/watch?v=sIO1OWxMwns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525
Photo by Glenn Carstens-Peters on Unsplash
* 붙임 : 에버노트에 써두고 한동안 오픈을 망설인 글이다. 나는 일간지 출신이 아니지만, 그 바닥에 친구들이 있고 그들은 내가 아는 한 기레기가 아니다. 이들까지 도매금으로 욕하는 게 미안하지만 그럼에도 브런치에 올리는 건 기레기가 기레기짓 하는 정도가 점점 선을 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외로 많은 이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기도 하다. 사실을 호도하고 왜곡하며 '알권리'를 무기로 협박을 일삼아 '단순 푼돈이나 뜯는 양아치짓'을 넘어 (누군가를 망가뜨리는) 범죄에 이르게 된 기레기의 기레기짓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암세포에 다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