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소아과와 진짜 의사
소아과 의사 채수호를 기억하며.
고등학생이 된 큰아이와 중학생이 된 둘째 아이가 8~9살부터 다니던 소아과가 하나 있습니다.
건물이 화려하거나 직원들이 기업처럼 움직이는 곳이 아닌, 말 그대로 동네 소아과입니다.
작은 진료실과 2명 정도 되는 간호사, 그리고 의사선생님 한명이 전부였죠.
그런데 이상하게 갈 때마다 무진장 기다리더군요. (오래전 기억입니다)
'애들 아파서 죽겠는데 대체 의사는 안에서 뭐하나?'라는 짜증이 생기기 시작할 즈음, 진료실에 들어가서 보니 왜 이리 대기시간이 긴지 그제야 알겠더군요.
이 의사 선생님은 아이들을 대할 때 보면 제 기준 마치 유치원 교사 같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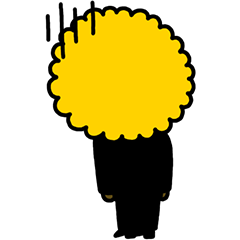
조금 '과한' 친절이었는데 겁먹은 아이들에게는 그런 '과한' 친절이 특효약이었던 듯.
'몇학년이냐?'부터 시작해서 '우리 집 딸이 너랑 동갑이다'라는 말을 주구장창 하더니, '왜 이리 예방접종을 늦게 시키냐?'고 갑자기 부모를 혼내기까지.
'이 사람 심심했나? 나이도 그리 많은 것 같지 않은데 왜 이리 말이 많지?'라는 생각을 그때는 했었죠.
암튼 이상했던 것은 그날 이후로 그리도 지루하던 대기 진료 시간에 대해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추가로 흥미롭게 지켜봤던 것이 한가지 더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꼭 진료시마다 '병원에 자주 오지 말아라'라는 이야기를 했었다는 것.
처음에는 고도의 상업적 멘트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와이프가 그 병원을 너무 선호하길래 '의사의 실력과 친절은 구분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었어요.
이렇게 써놓고 보니 참 의심을 많이도 했네요. (에휴 나란 인간도 참)
그런데 진심은 통하기 마련이라고 병원을 찾는 사람들은 그 이후에도 점점 늘어가더군요.
잘된다는 소식을 듣고는 '사람들 생각은 참 무섭다. 그리고 참 똑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
그리고 병원 이전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전한 곳도 그냥 바로 옆의 작은 아파트 상가더군요.
'거참. 이상한 사람이네. 이제 큰 병원 건물도 지어도 될텐데'라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한 2주전인가?
아이 엄마랑 둘째가 예방 주사 맞으러 갔다가 역시나 혼나고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이리 늦게 왔냐고' 말이죠.
'그 사람 참 한결같이 혼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겼습니다.
...
그런데 오늘, 얼굴이 하얗게 질린 둘째 아이로부터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아과 선생님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네요.
너무 놀라 우는 와이프와는 다르게 사실 그냥 저는 무덤덤했습니다.
솔직히 얼굴 본지도 너무 오래되기도 해서 이제는 기억도 잘 안납니다.
그런데 괜히 마음이 불편하더군요.
그래서 아침 산책길에 병원에 가봤습니다.

고사리 손으로 쓴 편지들이 보이는데 마음이 착잡해집니다.
'진짜 의사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하루입니다
P.S. 그러고보면 좋은 사람이 떠난 자리는 더욱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같은 동년배로서 채수호 원장님이 편히 쉬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