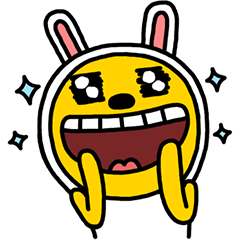86. 살 만한 공간
- 마음이 떠난 곳에, 사람은 있어도 없다.
사람이 실수할 수는 있지만
실수를 안 했다고요
어디나 민간 사업체가 운영하는 콜센터,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면 연결되기 전에 먼저
녹음된 멘트를 듣게 된다.
“지금 녹음되고 있으며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서
(녹음하는 거)“라는 내용이 핵심이다.
녹음을 들으면서 누구나 ‘녹음되고 있구나.’ 그 사실을
인지하고 숨을 고르고 기다리면
드디어 상담원과 연결되는 흐름이다.
공무원들은 어떤가.
말들이 많이 있었지만 아직 우리 책상 위 전화기엔
녹음 버튼이 없고 시스템도 도입되지 않고 있다.
걸려오는 외부 전화는 그냥 받아야 하고
옆자리에서 울리면 당겨 받아 주기까지 한다.
신원을 밝히지 않는 사람들,
차근차근 이야기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대뜸 상급 기관에 전화하겠다,
무엇인가를 접수하겠다
계획부터 밝히는 사람들...
우리가 “녹음되고 있습니다.”를 ‘선포’하지도 못하는 차에
이번에는 민원인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연신 ‘버튼’(아마도 녹음 중?)을 누르는 소리가
들리다가 그가 끝내 말로 직접 한다.
“지금 녹음하고 있으니까 똑바로 말하라.”고 말이다.
설명을 할 시간도 주지 않고
말빠른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른 채
전화를 받자마자 ‘죽일 듯이’ 달라드는
선고하듯 한 말본새에다가
또 그가 정체를 밝히지 않는 순간에
공무원이며 인간인 나는
누구인지 모를 그 누군가를 상대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머릿속만 하얘진다.
그가 말하는 ‘인터넷에 올린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또 ‘일을 키우고 싶으냐?’는데
무슨 일을 내가 키운다는 것인지
물을 사이가 없어서
한 마디라도 하려는 순간,
“뚜우__뚜우-_” 소리가 난다.
상대방이 전화를 끊어 버렸다.
내려 놓은 전화기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보니 다음 주가 월급날이네.
(너 따위 말단과는) 상대를 하기 싫다는 마음이 그에게서 느껴졌다.
나는 생계가 어려운 취약 계층 부모와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나은 시스템 안에서
약점이 커버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
그래서 최근 더 벌어진 사회 경제적 격차와
‘초초양극화’에 관심을 둔다.
양극화의 큰 단면은
상위에서 하위가 그들 내부로, 그들 커뮤니티로 진입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보는 데서 만들어진다.
‘상대하기 싫고 너하고는 말하지 않겠다.’는 심리가
강한 것 같다.
공무원들 개개인은 살림살이가 다 다르다.
하지만 저경력이나 중견이나
월급만으로 생활해야 한다면
물가 상승률조차 따라잡을 수 없다.
그러니까 만년 적자다.
거의 퇴직을 바라보는 나이에 이르러도
대기업 동년배 연봉을 절대 따라가지 못한다.
연금 수급이 개시가 되겠지만 그것은 ‘오지 않은 미래’이므로 오늘을 살기 정녕 팍팍한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경우에 따라 센 민원인들을 만난다.
며칠 전에 받았듯이 ‘혼나 볼래?’ 식의 강렬한 멘트를
‘이게 협박인 거지?’ 생각되도
혼자, 끝날 때까지 다, 들어야 한다.
센 민원인들은 더러 많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우리를 깔보고 있다. ‘너 하나 쯤이야.’
모래가 입안에 씹히는 것 같았다.
조용히 퇴근했다.
오다 생각하니 다음 주가 월급날이었다.
신입 때 선배들이 말하곤 했다.
“욕 들은 값”이라고, 월급이 말이다.
같이 근무하다가 돌연히
민원을 넣은 그들
사실 공무원들이 다 제각각이다.
같은 직급, 같은 직렬의 공무원이라고 해서
(역량이) 다 같지가 않다는 걸 많이 느끼고 살아 왔다.
각종 ‘울렁증’이 생기곤 하던 날
송과장이 내게 와서 욕설을 담아 “능력이 없다.”고
다들 앉아 있는 사무실에서 퍼부어댔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민원’이 들어왔으니 감독 기관의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공문이 뜬 것이 이 주 쯤 뒤였다.
‘민원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설왕설래가 많았지만
심문을 당하는 내 입장에서는
동료가 동료를 고발하고
자기가 이해를 못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뭐가 급선무인 줄도 모르고 있으면서
동료(나)를 혼내 준다고 벌이는 일련의 일이
참 망조가 드는 일 같았다.
일을 기막히게 잘 하지 말라고.
잘 돌아가지 말라고,
그 꼴 보기 싫다고 막은 것이니까.
그렇게 송과장이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민원’ 카드는 매우 주효했고
나는 숙청당했다.
외부인이건 내부자건
머리를 맞대고 마주앉지 않고,
질문과 대답이 끊어진 채
뒤에서 찌르고 달아나는 식의 ‘민원’이 횡행하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충 하자.“, ”여기는 살 만한 곳이 못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나도 그랬었고 달라진 게 있다면,
아직 성치 않은 몸이 민감하게 반응을 다시 내면서
지난 주의 민원 전화를
예의 주시하는 상황이다.
전화를 건단들 대부분 민원은 해결점을 못 찾는다.
전화만 걸어서 민원을 내는 분들은
대부분 절차만 밟아서
‘위원회’나 ‘감사관’에게 신고해서 골탕을 먹이겠다는
복수 심리인 경우가 많다. 내 경험상.
세상이 그런가 보다 한다.
지난 주에 만난 후배가 말했다.
“저는 제가 ‘못됐다.’고 소문 나는 게 차라리
제가 생활하기 편하다는 걸 배웠어요.“라고.
나는 극 공감해 주고 헤어졌다.
나도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죽을 수는 없잖아요
(에피소드 One)
“죽어 버리면 좋겠어?”
“내가 사라져 주길 바래?”
이런 말을 헤어지려 할 때
어제까지의 연인에게서 듣는다면
‘곧 헤어지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사람의 마음은 민감하게 움직인다.
헤어지자는 사람이 헤어짐을 선택하는 데는
시간도 에너지도 많이 들어갔다.
사람은 누구나 본전 회수의 욕구가 크다.
투자에서 원금 보전 욕구만큼 (큰) 수익을 해치는 게 없지만 인간이라면 다 같이 잃지 않고 싶어들 한다.
잃지 않고 지킬 목숨을
함부로 내놓는 사람과는 계속 만나지 말자.
험담을 하고 위협을 해서
나를 굴복시키려고 엉기는 사람을 떨쳐 내자.
내가 내 일에서 떳떳하고 당당했으면 되었다.
민원인이 예의를 싹둑 자르고 전화에 총질,
직장 동료가 내 이름을 들고 가서 신고질,
산전수전은 이제 옛 말 같고 어쨌든
AI, 복제인간이 현실이 된 시대인데 참 뒤떨어졌다.
과거 ‘성대리’였던 나는
사람이 어떤 공간에서 산다는 것이
그 사람의 의지 유무와 관계없이
사람을 참 황폐하게 한다고 생각한다.
(에피소드 Two)
'누구랑 사느냐, 거기서 매일 대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거듭 고민하던 어느 날,
‘쪽지’를 발견했다.
그 시절, 송과장이 몸무게만으로도 무거운데 육중한 펀치로 ‘민원’을 갈긴 그 때 즈음
송 과장의 사원 한 명이 ‘성대리’한테 보낸 것이었는데
“OO님, 아까 결재받으러 갔을 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주위가 신경 쓰여서 올라와서 보내요.
힘내세요 OO님.“이었다.
나는 기억력이 유한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잘 잊어버려서 메모장을 달고 산다.
그런 분들도 있었는데
나는 세월을 보내면서 내 살기에 벅차서
좋은 사람들을 잊고
빌런들만 강하게 뇌리에 남겼다.
앞으로는 그 반대가 되어 보아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