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다 무서운 흑백논리
경직된 사고의 폐해

아프리카의 어떤 종족의 언어에는 색깔을 나타내는 말이 흰색과 흰색 아닌 것의 두 가지밖에 없다고 한다.
문화에 따라서 색을 묘사하는 단어의 종류와 수가 다르다.
과연 가장 올바른 분류라는 것을 정할 수 있을까?
필요에 따라서 많아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한다.
차이를 차이 그대로 보지 않고 자신의 관점을 고집하는 순간 엄청난 비극이 일어난다.

"저는 특별히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살아 있을 가치가 없죠."
"잘하는 것이 없으면 존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그렇지 않나요? 있으나마나 한 존재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과연 그럴까요?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1등을 해야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라면 2등부터 꼴찌까지는 없어도 된다는 말이 되지요? 그런데 그들이 없이 1등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도 1등 하는 게 좋지요."
"1등이 있으려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잘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성립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잘해야 존재할 이유가 있다는 말은 엉터리이지요."
우리 교육의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로 '획일화'를 꼽는다.
사로 다른 개성을 가진 존재들은 일정한 틀로 똑같이 찍어내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요즘은 수업시간에 아예 엎드려서 자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
학교 수업이라는 것이 획일화되어 있다 보니 사회의 변화로 다양해진 욕구를 담아낼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니 관심이 없는 학생들은 수업을 외면해버리고 만다.
'공부 잘하고 사교성 좋고 예의 바른 학생'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것일까?
학부모와 학생 사이의 갈등을 보면 기성세대의 경직성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인다.
"너 그런 아이를 왜 사귀니?"
"걔 착해."
흔히 볼 수 있는 대화이다.
이 대화에서 부모는 아이가 못된 친구한테 물이 들까 봐 염려하고 있다.
행실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아이와 어울리는 자녀한테 좋은 친구를 사귀라고 조언을 하고 싶은 마음에 이야기를 꺼냈는데 자녀는 그 아이가 착하다고 한다.
어른들이 그 아이를 잘못 알고 하는 소리라는 것이다.
누가 옳을까?
서로 갈등하고 다투는 상황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흑백논리라는 함정이 들어 있다.
세상에는 다양한 색깔이 있는데도 극단적인 판단으로 구분을 짓는다.
편견이나 고정관념 없이 있는 그대로 보면 이해가 되고 인정될 수 있는 것들인데, 흑백논리에 빠지면 대립과 갈등이 일어난다.
틀을 지워놓고 그 틀로 몰아가려는 일방적인 강요는 폭력이다.
이 폭력에 굴복하면 무기력하고 의존적인 사람이 되고 만다.
굴복하지 않고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대립과 갈등이 생긴다.
생각과 관점이 다르면 싸워야 할까?
흑백논리에서는 싸울 수밖에 없다.
싸우지 않더라도 겉으로 순응하는 척하든가, 아니면 적당히 타협해야 한다.
그러나 흑백논리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 볼 줄 알면 사정이 달라진다.
차이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서로의 내면이 풍요로워진다.
내가 알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 알게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새로운 것을 알려주는 반가운 존재들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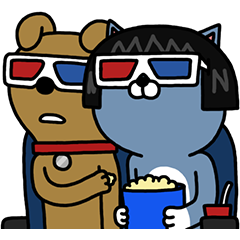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관계를 경계하고 대립하고 갈등하게 만드는 것이 흑백논리이다.
풍요롭고 다양한 경험이 될 수 있는 좋은 관점들을 혼란과 고민에 빠지게 만드는 것도 흑백논리이다.
극단적이고 경직된 사고에 빠지는 순간 세상은 빛을 잃고 암울해진다.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의 모양으로 자리 잡고 있는 흑백논리를 조심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