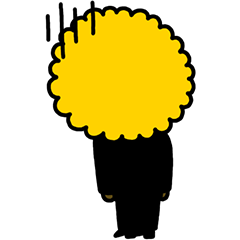그때부터
프롤로그
우리는 '슬픔'이라는 분류의 감정을 느끼더라도 매번 같지는 않다.
이별에 대한 슬픔, 죽음에 대한 슬픔, 실패에 대한 슬픔 등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서도 무수히 많은 감정들이 뒤섞여 있기도 하고 개개인이 느끼는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로 단정 지어서 말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도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보듬어 주기 위한 노력에는 '공감'이 포함되어 있어서 다행인 듯싶다.
공감에서 더 나아가 보면 '이해'도 존재한다. 직접적으로 겪었든 아니면 드라마나 영화 또는 주변 사람들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들어보면서 서로의 감정을 얘기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는 정도의 차이까지 깊이 있게 이해하기란 쉽지가 않다.
아무리 전후 사정을 장황하게 늘어놓고 설명해도 이야기를 듣고 받아들이는 개인의 경험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각각의 사람들 사이에 투명 장막이 놓여 있어 겉으로 드러난 것들은 볼 수 있지만 가까이 다가서서 들여다보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그래서 가끔은 자신의 감정을 타인에게 설명하기 위해 양념을 하도 쳐서 본질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많은 것들을 집어삼켜버려서 가시만 남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툭툭 찌르고 있을 수도 있다.
누군가는 버려야 할 감정이 있다고 하면서 특정 행동을 통해 없애버리도록 부추긴다.
그러나 온전히 내던지지 못하고 미련스럽게 감정이 계속 남아있으면 과연 그 솔루션이 어떠한 의미를 남기게 될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흔히들 얘기하는 '감정 쓰레기통'이 필요하다면 이야기를 공유하는 사람은 어떠한 자세로 이야기를 해야 하며, 어떻게 버리고 비워낼 수 있을까? 하나의 사연으로부터 시작된 수많은 분류의 감정들, 특히나 슬픔을 감추지 않고 다 적어낸다면 어떨까? 진짜 있는 그대로를 솔직하게 다 쏟아냈을 때도 공감을 얻어내기 힘들까?
내가 현재 느끼고 있는 슬픔의 시작은 대부분 그때부터 시작된다.
이상하리만큼 커져버린 나의 슬픔은 자꾸 삼처럼 뿌리를 여러 개 만들어 뻗어 나간다.
나는
약 14년 동안
'엄마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있었더라면'을
가정하면서 살고 있다.
엄마는 짧고 굵게 1년 7개월 동안 병치레를 하다 46세에 생을 마감했다. 46년이나 살았으니까 엄청나게 짧은 생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나의 기준에서 엄마는 너무 짧은 인생을 살다 갔다. 동시에 나는 16살 때부터, 언니는 18살 때부터 보통의 엄마를 잃었고 아빠는 아내를 잃었다.
누군가는 얘기한다.
우리 가족에게 엄마의 병을 알게 되고 난 순간부터 1년 7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긴 시간 동안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었다고... 하지만 그건 급작스럽게 돌아가신 분들과 비교하면서 했던 말에 불과했고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말에 불과했다.
솔직한 심정은 죽음 앞에 장사 없다고 모든 순간들이 개 같았고 슬프기 짝이 없었다. 모두의 의지와 상관없이 엄마는 죽음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었고 우리 가족은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끝'이라는 말에 벌벌 떨면서 살아야만 했다.
우리는 멀어져만 가는 엄마를 붙잡을 수 없었다.
죽음은 우리의 가족에게 칼을 들이밀며 후벼 팠지만 확실하게 죽이지는 않아서 매일같이 살인미수 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다. 결국 아빠마저도 중증환자로서 정기적인 병원신세를 지게 됐고 언니와 나는 두 사람의 '끝'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순간을 견뎌야 했다.
그때에 기도는 늘 원망으로 가득했다. 남은 생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부모복(내가 생각하는 부모복은 몸 건강히 오래 살다 돌아가시는 것)도 없는 사람으로 만들 작정이냐고 괴로움에 몸부림을 쳤다.
모두가 말하는 정석대로 삶을 살아야 한다면, 이러한 고통과 슬픔을 이제는 내려놓고 앞만 보고 자신의 길을 걷는 것이 맞다. 하지만 청소년기 때부터 보통의 또래들과는 다르게 자꾸 포기해야 할 것들이 생기면서 강하게 내리꽂은 '희생'이라는 단어는 아직까지도 나를 괴롭히고 있다. 때로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나만 생각하고 살아야겠다 싶으면서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고, 이기적인 생각으로 사치를 부리면 안 되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옭아맸다. 그래서 친구 이외에는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이 생겼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없지만 깊이 있는 만남에 대해서는 항상 내가 먼저 선을 그었다. 그 사람은 이것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이해해줄지를 모르기 때문에 난 그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했다.
내가 느끼는 불안감과 슬픔의 원초적 이유에는 예민함도 있다. 태어날 때부터 잔병치레를 많이 해온 터라 어릴 적부터 신경이 예민한 편이다. 거기에 엄마의 병과 죽음, 지금까지 이어지는 아빠의 지병과 세월에 의한 노환, 지금은 결혼하고 애가 있는 언니마저도 난치병으로 힘들어하는 걸 지켜보면서 슬픔과 우울함을 느낄 때가 많다. 그래서 부지런히 이 슬픔과 고통을 덜어내고 스스로 행복을 찾아 나서야만 했다. 근데 이마저도 '왜 나는 이렇게 노력해야만 하지?'라는 거지 같은 물음표에 막혀서 마음의 문을 열었다 닫았다만 반복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엄마의 죽음이 나를 표현하고 가정하는 데에 있다. '나는 나'이고 싶지만 나의 모든 경험과 행동이 엄마의 죽음과 연관 짓는 불쾌한 기분이 들 때가 있어서 누군가에게 실컷 얘기해본 적이 없다. 어차피 내 뜻대로 안 되는 인생 왜 맨날 나만 고민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겠고 알고 싶지도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고구마 답답이 같은 행동들을 하고 있을 때면 결국 끝에는 정신적으로 많이 의지 했던 엄마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있었더라면 내가 그려왔던 삶을 살고 있었을지에 대해서 자주 생각하게 만든다. 하지만 당사자가 없어서 여전히 미궁 속에 갇혀 있다.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이 엄청난 효과를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지만 적어도 정리 안된 그동안의 감정들 중에서 버릴 수 있는 것은 조금은 덜어낼 수 있을 거 같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잊히는 기억들은 많지만 현재 엄마가 없어서 느끼는 감정들은 고스란히 마음속에 남아있다.
어디까지나 개인의 문제이고, 단지 '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일 수도 있지만 글을 통해서 감정의 끝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