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칭찬은 날 춤추게 한다.
2021년이 하루 남아있던 어제.
사내 메신저로 한통(혹은 두통)의 쪽지가 왔다.

사내 여성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에서 대상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이다.
기뻤다. 바로 답장을 해야 하는데 괜히 가슴이 두근거려 당장 눈앞에 업무를 다 처리한 후
퇴근시간이 다 되어서야 짧게 답장을 보냈다. 그리고 입금된 수상금. 실감이 났다.
이 돈을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문득 공저로 냈던 "공감, 따뜻한 동행"의 인세를 받아
가족사진을 찍었던 것이 떠올랐다. 그래서 신년에 수상금으로 가족사진을 찍어보려 한다.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다 보니 도단위 신문에 칼럼을 쓰기 시작하면서 받았던
소중한 쪽지 두 개가 생각이 났다.


글은 쓰지만 낯을 많이 가리는 나는 쪽지들을 받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처음엔 어? 그다음엔 아...(기쁨) 하지만 곧 "하...." (걱정)이다.
우선 모르는 이름이 메신저에 뜨면 잘못한데 없는데도 무언가 놓쳤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다음엔 당연히 기뻤다. 한번 읽고 두 번 읽어도 좋은 말만 가득한데
어찌 안 기쁠까. 하하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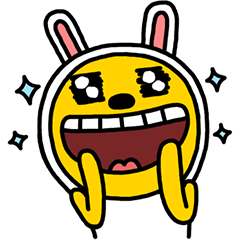
그런데 답장을 해야 한다... 는 숙제가 곧 주어진다.
남편에게 상의했더니 "감사합니다"라고 보내란다. 이게 말이야 방귀야.
핸드폰 번호까지 남기신 분들인데 감사합니다 다섯 글자가 웬 말이냐고.
그래서 이 때도 괜스레 엄청 열심히 일하고 퇴근시간 즈음에
답장을 보냈다. 사교성이 좋고 더 예의 바른 사람이었다면 전화를 드려서
인연을 이어갔겠지만 난 안타깝게도 그런 유형의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더불어 내년에도 칼럼을 이어쓰기로 했다.
담달 기자님이 내년에도 잘 부탁한다는 문자를 보내셨는데
마음이 복잡했다. 겨우 2주에 한번 A4용지 한 장의 글을 쓰는 건데
칼럼을 쓰기 시작하면서 나에게 A4용지가 가장 채우기 어려운 분량이 되어버렸다.
아무래도 보이는 글이고 잊힐만하면 어디선가 피드백이 날아오기 때문에
브런치에 쓰듯이 자유롭게 쓴다기보다는 단어 하나, 문장의 길이, 내용의 일관성에
신경 쓰다 보니 내가 봐도 많이 정제되어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다 보니 A4 한 장, 10포인트로
45줄 내외가 너무너무 채우기 어렵다.
그래도 한 해 더 써보려고 한다.
매번 기사에 뜬 걸 보면 부끄러워 자기 전에 이불 킥이지만 제 발로 들어온 기회를 차 버릴 순 없지.
마지막으로 나는 2016년부터 브런치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는데 올해가 가장
애정을 갖고 열정적으로 이곳에 글을 쓴 것 같다. 아마 좋은 작가님들과 소통을 하기 시작하면서
내 나름대로의 의욕이 넘쳐났던 것 같다.
내년애도 이 마음이 지속되길 바라며 다 언급할 수 없어 안타깝지만
늘 댓글 달아주시는 작가님들, 좋아요 눌러주시는 작가님들, 개인적으로 연락해본 작가님들.
그리고 꾸준히 구독해주신 작가님들(특히 2016년부터 구독해주고 계신 김 작가님) 모두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사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