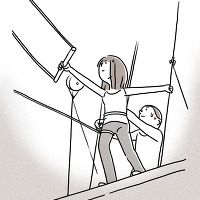토요명화
영화평론가 정영일을 기억하며...
‘빠라밤~.빠라바 라라 빠라밤’ 토요일 늦은 저녁 TV에서 아랑페즈 협주곡 2악장이 유려히 흘러나오면, ‘어흥’ 하고 나타나는 사자 인트로의 MGM사 영화부터 헐리웃의 각 영화사 고전들이 매주 한편 안방으로 펼쳐졌다.
금요일, 검은 뿔테를 쓴 영화평론가 정영일 씨의 영화 예고를 시작으로 다음 날 토요명화의 기대치는 더 높아지곤 했는데 간결한 자세에서 나오는 그의 평론은 '명화극장' 카테고리 안의 큰 부분 자체로서 강렬한 포스를 뿜어내고 있었다.
영화관 가기도 쉽지 않은 대다수 서민에게 토요명화가 주는 여흥의 폭은 적지 않아, 어린 나이의 나도 어김없이 보물과도 같은 영상들에 눈을 반짝이며 tv로 빠져 들곤 했다.
어느 날 그는" 요즘처럼 좋은 영화가 쏟아져 나오는 때에 이 주옥같은 영화들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라도 오래 살고 싶다"는 말을 꺼냈다.
그의 말을 들으니 뭔가 영화의 맛을 알 것도 같았던 마음에 ‘그래, 얼마나 영화를 좋아하면
저런 말을 할까’하고 그 면모를 더욱 이해하게 되어 고개를 끄덕였던 기억이 새롭다.
하지만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런 소망을 뒤로하고 타계하고 말았고
갑작스럽게 전해진 평론가의 부고는 내게 안타까움과 허망한 마음을 안기기에 충분한 소식으로 남았다.

그렇게 영화를 좋아했던 그는 저승 어느 편에선가 내려와 '중경삼림'도 보고, '포레스트 검프'도 보았을 것이며, '올드보이'와 '밀양'을 보고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기특해했을지도 모른다.

그에게 영화 '스틸 라이프' 얘기를 하면 “그래, 그 영화 나도 괜찮게 봤어” 하며 맞장구를 쳐줄까? 주인공 존 메이의 곁에 그의 영혼의 친구들이 함께 했듯, 그의 안식처에선 아마 정영일의 토요 영화평론이 매주 펼쳐지고
여전히 그는 둥그렇게 모인 망자들 앞에서 입담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을지...
어른이 되어 다시 본 그때 영화들의 감흥은 이제 각각 사뭇 달라지고 카우보이들의 총싸움을 보며 통쾌한 마음이 들지도 않지만 그 시절 영화를 마주하던 추억만큼은 퇴색하지 않고 아름답게 토요일의 온기로 기억되곤 한다.
영화는 이 세상과 저세상을 넘나들 수 있는 뭔가가 있다고 말해도 괜찮은 범주에 있는 것이 아닐까? 모름지기 그것은 그런 판타지에 기본을 두고 있으니 말이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다른 세상의 이면을 애써 모른 체하며 살아가다가, 문득 영화를 통해 그 실체를 직면할 때가 있다. 그래서인지 존 메이와 정영일이 공존하며 이야기를 나누어도 이상할 것 없는 영화세상 어느 저편을 상상하며 오늘도 나만의 토요영화 한 편을 골라본다.
글·그림 반디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