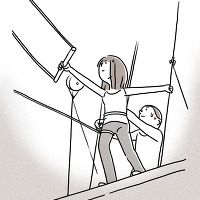소설 _ 12. 사랑을 신용하지 않습니다.
소설 _ Flight to Denmark 12. 모든 게 낯선
그날 집에 돌아와 코트도 벗지 않고 가방을 던져 놓으며 쓰러졌다.
그러다 형광등 불빛에 눈이 부셔 몸을 뒤집으며 생각했다.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를 보아 왔는데, 노래를 마치고 웃는 모습이 오늘 처음 보는 낯선 사람 같지 않았나. 혼자 당황스러워 얼굴도 마주 하지 못하겠는 짧은 찰나의 순간에 얼굴 윤곽, 입 매무새의 언저리까지 인상하나 하나가 새로 생기를 부여받은 듯 온전히 눈에 담아진 것은 왜일까? 여태껏 그를 보아 왔던 어느 순간 보다 그의 얼굴 구석구석이 또렷해진 이유 말이다. 나는 그동안 그 사람 얼굴을 몰랐던 건 아닐까?
일어나 화장을 지우고 거울 앞에 섰더니, 이번엔 내 얼굴이 너무 낯설었다. 오른손을 넓게 펴고 볼을 감싸 잡아 귀 쪽을 향해 쓸어 넘기듯 하니 얼굴이 더욱 괴이한 모양새가 되어 갔다.
이런 것이겠지. 오늘의 모든 낯섦도. 난 애써 그렇게 정리하고 싶었다.
침대에 누워 잠이 들려해 보는데 한때의 기억들이 덮쳐왔다.
방을 바꾼 탓일까 해, 다시 집중해서 자려고 해 봤지만, 어지러운 상념들이 눈앞을 휘저었다.
대학에 들어가 내게 처음 연애의 경험처럼 쓰이고 만 첫 남자 친구의 얼굴, 용기 내어 서툰 마음을 고백하던 아르바이트 동기의 얼굴, 회사에 다닐 때 꾸준히 내가 좋다 하던 선배의 얼굴. 그리고 그 남자들 모두의 복수를 하듯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의 얼굴까지.
돌아보면 마치 반짝이는 순간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 그것이 다 오만이고 서로가 쌓은 업보의 순간이었다.
많지 않은 인연 속에 내가 상처를 주고받았다 생각한 사람들을 떠올려 봐도 기껏해야 윤색된 그 감정의 기간은 모두 몇 개월 안 밖의 열병 같은 것들이었다. 모두가 지고 만 패잔병의 짧고 아픈 열 치레 같은 것들 말이다.
그래서 후로 나는 인생에 제대로 된 사랑이란 것을 한 적이 있긴 한 걸까 자문하면서, 사랑이란 감정이 있다 한들 그것이 그저 생애 주기의 환각 같은 현상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다.
또 늘 회의적이고 비겁하기까지 했던 나는 결혼이란 생각을 하면 정색을 하는 식이 되고 말아서, 나는 어쩌면 내 부모의 결혼이 그렇게 끝나 버린 탓이 아닐까 혼자 되짚어 보기도 했다.
어쨌든 그래서 나는 경험적으로 보아 사랑이라는 감정을 믿기보다 그것이 다분히 도파민과 옥시토신의 화학작용일 뿐이란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불안정하고 오래가지 않는 그 마음을 신용하지 않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고, 몇 개월 타 들어가다 마는 괜한 정신적 소모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일에서 멀어질 때처럼 그저 질려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내 마음의 방어기제가 풀리지 않도록 단속하는 것. 이것을 내 마음의 기조로 하고 나는 오늘 일을 잊기로 했다.
글 그림 반디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