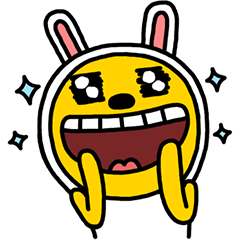by
Jun 24. 2021
명품
명품이 별건가
명품(名品)
- 뛰어나거나 이름난 물건. 또는 그런 작품.
20대 초반. 한창 멋 부릴 나이임에도 외모에 그리 신경을 쓰고 다니진 않았다. 젊다는 이유 하나로 만 원짜리 티셔츠를 입어도 얼굴엔 빛이 났고 누구를 만나 대화하고 의견을 제시할 때 거리낌이 없었다. 졸업 후. 동창 모임에 갔는데 가장 눈에 띄게 변화한 건 그녀들의 옷, 신발, 가방. H가 첫 월급으로 마음먹고 샀다는 CH Dior 파우치 블랙. 보란 듯 탁자 위에 올려놓는 그녀를 보며 한 마디씩 한다.
“ 어머, 언제 샀어? 나 그저께 갔다가 타이밍 놓쳤어. ”
“ 지름신 강림하셨네! 할부? 몇 개월? ”
“ 얼마나 갖고 싶었으면 첫 월급 타자마자 샀니? ”
그녀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괜스레 웃음이 나왔다. 개인의 취향이 달라선지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관심은 있지만, 가성비 대비 구매할 물건은 아니라고 판단 한 모양이다.
그땐 그랬다.
기념일이나 생일이 가까워지면 통과 의례처럼 묻는 말.
“ 뭐 갖고 싶은 거 없어? 봐 둔 거라도? ”
“ 글쎄, F 매장에서 봐 둔 게 있긴 한데요. 아뇨, 됐어요. ”
생각할 것 없이 NO로 대답한다. 모셔만 두는 백은 단지 장식품일 뿐. 오히려 여행에서 사 온 가방이 편해 자주 들게 된다.
집 근처 S 아웃렛 명품관 입구에는 아침부터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로 즐비하다. 매장 안 진열대엔 신상을 구축으로 세련된 디자인과 색다른 소재로 한 땀 한 땀 빚은 장인의 작품에 두 눈이 호강한다. 명품은 명품. 구경하다 보면 구매 욕구가 충분히 생기고도 남는다. 좋은 건 좋은 거고 이쁜 건 이쁘니까.
갖고 싶은 물건을 사기 위해 잡다한 낭비를 줄여 비축하고 원하는 물건을 산다는 건 합리적 소비라 생각한다. 물건을 자주 바꾸는 건 그 물건이 싫증 났다는 것이고 처음부터 흡족한 물건이 아니어서 싫증 나는 것이라고 친구는 말한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 맞는 말 같아 고개를 끄덕거린다. 내 물건의 가치는 주인의 만족도와 비례한다.

made by sister
내게는 11살 터울 여동생이 있다. 자식 욕심 많은 아버지는 첫째는 아들, 둘째는 딸, 아들 하나론 부족하다며 둘째 아들, 셋째 아들까지 바라는 바를 이루셨다. 막내 여동생은 딸 하나로 부족하다는 아버지 부탁으로 어머니가 마흔에 낳은 딸로 오랫동안 외동딸로 지낸 나에게 낯선 존재였다. 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으로 낳은 막내딸. 어머니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그녀는 어머니와 찰떡궁합 효녀 딸이다. 막내는 어머니를 닮아 손재주가 남달랐다. 중학교 때 과제로 병풍에 학을 수놓은 적이 있는데 실제로 날아가는 학이 연상될 만큼 빼어난 솜씨였다. 얼마 전부터 취미로 문화 센터에서 가죽 공예를 배우고 있다고 했다. 나는 어머니를 닮은 막내가 손끝이 야무지고 꼼꼼한 성격이라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오랜만에 만난 동생과 식사를 한 후 그녀가 카키색 백을 내게 건넸다.
“ 어머, 정말 네가 만든 거야? 울 막내 대단하다! 다년간 숙련된 솜씨 같은걸! ”
“ 명품이다. 명품. 가보로 모셔둬야 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