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는 법을 잃어버린 사람
강원국, '나는 말하듯이 쓴다'
전자책 2%
< 질문하면 위험한 사회 >
사람들이 꺼리는 말이 있다. 그 말을 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잘못했다가는
너는 그것도 모르냐, 그것까지 내가 말해줘야 하나, 바빠 죽겠는데 네가 알아서 못 하냐, 지금 내 말에 토 다는 거냐?
라는 핀잔을 듣기에 십상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가. 바로 '질문'이다.

중략
나만 질문하는 걸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질문하는 것이 본업인 기자들도 때로는 그렇다. 2010년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가 끝나고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개최국인 한국 기자들에게만 질문 기회를 줬는데, 끝내 아무도 하지 않았다. 영어가 서툴러 그러는 줄 알고 한국말로 해도 된다고 했지만, 끝까지 버텼다.
중략
몇 년 전 이스라엘에 갔는데 질문하지 않는 학생은 선생님이 상담한단다. 왜 그러는지 물었더니 그런 학생은 아예 모르거나 학습 의욕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에게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고 내게 되물었다. 전 세계 인구 중 0.2%도 안 되는 유태인이 노벨상을 25% 가까이 차지한 이유가 질문하고 토론하는 '하브루타'수업과 당돌하고 뻔뻔하게 묻는 '후츠파'정신에 있다고 한다.
누군가 나에게 학교에 가고, 회사에 가고, 그렇게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잃어버린 게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건 바로 '질문'이다.
집에 놀러 온 조카는 궁금한 모든 것을 쉬지 않고 물어본다. 그리고 '안돼'라고 말하는 이모의 말에도 '왜 안되는지를 묻고 또 묻고' 그렇게 밥 먹는 것처럼 묻는 것이 일상이다. 모르는 게 궁금하고, 그리고 생각이 이모와 같지 않아서 묻는다. 그렇게 당연한 질문에 어른들은 "조용히 있어. 다음에 말해줄게"로 질문을 피해 간다.
회사에 입사를 했다. 신입 때 궁금한 것이 많았다. 질문을 하고 내가 제일 먼저 들은 말은 "그것도 몰라?"그리고 다음은 "똑똑하지가 않아. 요새 애들은 버릇이 없어"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신입 사원이 뭘 알겠느냐고 되묻고 싶다. 그때 당연시 여겼던 관행은 질문은 참아야 하는 것, 선배나 윗분들 지시에 "네~"로 대답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렇게 질문 몇 번과 어리숙함으로 '눈치 없고, 버릇없는 신입'으로 시작했다. 그리고 입을 다물었다. 아주 오래오래~
나에게 3년 전 '입이 열리는 기회'가 없었다면 지금도 쭉 그러했을 것이다. 그 기회는 '끝장토론'으로 유명한 어떤 과목의 수업이었다. 유명하다기보다는 악명이 높았다. 굳이 듣지 않아도 되는데 궁금했다. 토론 수업에 대한 호기심으로, 학점보다는 '경험'에 의의를 두는 사람으로서, '꿀 먹은 벙어리'였던 나는 구경하자는 마음으로 토론 수업을 신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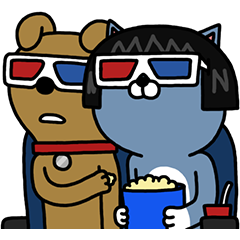
특정 주제가 주어지면 1개의 주제당 2개 조가 발표하면서 경쟁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리고 듣는 청중은 비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조에게 무섭게 질문 세례를 퍼부었다. 교수님은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게임의 진행자가 되어서 게임 규칙만 정해주었다. 그리고 발표와 방어(?)를 잘한 팀원과 질문을 많이 한 사람에게 인센티브로 점수가 주어지는 게임이 시작됐다. 구경꾼인 나는 그렇게 '질문 선수'로 집중 공격을 가했고, 발표자일 때는 집중 방어를 하는 그런 싸움이 시작됐다.
그때 나에게 입이 뚫리는, 판소리의 '득음' 같은 기적이 일어났다. 처음에 사람들이 질문하는 걸 구경만 했다. 날카로운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 놀라고, 당황하는 발표자가 안쓰럽게 보였다. 하지만 이런 시간이 일종의 게임처럼 문화로 자리 잡고 나니, 나도 '질문'을 조심스럽게 시작했다. 질문도 하고 싶다고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최대한 빨리 손을 들어서, 질문 기회를 잡는 것도 게임이었다.(게임 문화 과열로 질문자가 폭주했다)
이 게임은 승자가 명확했다. 발표하는 사람도 날카로운 질문에 긴장하기도 하고, 흥분하기도 했다. 발표의 약점이라도 보이면 단체로 집중 공격하는 '말과 말이 오고 가는 사이에 어떤 쾌감, 짜릿함'이 감돌았다.

회사에서 질문을 하지 않는 이유는 많았다. 우선 조용히 입을 다무는 문화에 10년 이상 젖어버린 타성. 튀고 싶지 않다는 강렬한 소망, 이해를 못하거나 관심이 없거나 너무 잘 알거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질문하라는 말은 형식이고, 결론은 발표자 마음대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될 때 등등의 이유가 많았다.
회사와 학교는 다르기에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다. 한쪽은 승진과 같은 이해관계가 있고, 한쪽은 학업이라는 순수성이 있는 집단이다. 그래도 한 학기 '끝장토론'의 경험은 나에게 흔적을 남겼다. 회사에서 오랜 기간 쌓아온 질문 횟수 '0'에 빛나는 기록을 깼다.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1~2회라도 질문을 했다.
재밌는 건 말이 없던 사람이 질문을 시작하면, 그다음 사람들도 부담을 덜 갖고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보통 회사 내에서 질문을 하는 사람은 정한 건 아니지만 늘 특정 사람이었다. 그리고 질문 의도도 너무나 티가 나는 그런 무엇이 있었다. 나비의 날갯짓처럼 사소한 변화는 그렇게 시작했다.
몇 년이 지나도 질문은 어렵다. 질문하기 전에 꼭 해야 하는지를 마음속에 한 번 더 물어야 했다. 비난을 위한 질문이 아닌 대안이 보일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질문을 했다.
'비판을 위한 비판, 질문을 위한 질문' 이 아니라 서로 잘해보자는 그런 생각이 있을 때에 질문도 환영받았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었다.
가끔은 그렇게 얼굴 붉히며 토론 섭을 듣던 그때가 너무 그립다.
사람들과 웃고 떠들던 기억이 아득해진, 이제는 마음이 더 추운 저녁이다ㅠㅠ
그림 https://www.pinterest.co.kr/pin/494270127825912835/visual-sear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