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마사이족
그들만의 식생활, 건강, 풍습, 그리고 그들과의 공감
내가 묵던 덤불 캠프에서 멀지 않은 곳에 보마(boma) 또는 엔캉(enkang)이라고 하는 가시나무 울타리를 친 마사이의 공동 거주지가 하나 있었다. 여행 전에 찾아본 몇몇 자료를 통해 접하게 된 마사이 특유의 생활 방식이 너무나도 궁금하던 나는 가이드에게 이 보마를 방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여기저기 수소문해 보더니 다음 날 방문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번 글은 그렇게 방문했던 마사이족에 대한 사진과 얘기. 공개를 허락해 주신 사진의 주인공들에게 감사드린다.
 가시나무로 둘러 친 울타리인 보마. 밤에는 이 안에다 가축을 가두어 맹수의 습격을 막는다.
가시나무로 둘러 친 울타리인 보마. 밤에는 이 안에다 가축을 가두어 맹수의 습격을 막는다.마사이족의 이모저모
마사이족은 여러모로 참 특별하다. 유럽인들이 처음 마사이를 접했을 때 너무나 놀라워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을 정도. 영유아 사망률을 제외하면 다른 부족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명을 자랑하고 치약도 안 쓰는데도 치아 상태가 너무나 고르고 깨끗했던 것. 지금까지도 어떻게 마사이가 고칼로리의 육류 지방과 육류 단백질만 섭취하면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지는 연구의 대상이다.
큰 키
내가 본 마사이 들은 다들 키가 훤칠했다. 그러나 마사이의 신장을 체계적으로 측정한 통계는 찾을 수 없었다. 인터넷에 마사이의 평균 신장이 6ft, 즉 182cm라는 내용이 떠돌아 다니고 있지만 정확한 근거는 없다. 어쨌든 마사이의 키가 크다는 것 만큼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다.
아래 사진은 내가 방문한 부락의 큰 어르신. 이 분도 한 180cm 정도 되시는 것 같았다.
 우리가 방문한 부락의 큰 어르신. 100마리가 넘는 이 보마 안의 가축이 다 이 어르신 것이다.
우리가 방문한 부락의 큰 어르신. 100마리가 넘는 이 보마 안의 가축이 다 이 어르신 것이다.식습관과 건강
마사이의 주식은 우유와 소의 피. 우유를 호리병에 담고 소의 목을 지나는 정맥(경정맥; jugular vein)을 찔러 고통 없이 피를 받아 섞은 후 병째로 놔 두어 발효시킨 것이 이들이 먹는 전통적인 주식이다. 발효시키지 않고 우유만 먹기도 한다.
내가 음식에 대해 이것저것 물으니 이 부락 큰 마님께서 직접 젖을 짜 주셨다. 먹고 싶다고 한 것은 아닌데 짠 우유를 주셔서 순간 깜짝 놀랐다. 원래 여행 다니면서 가리지 않고 현지 음식을 잘 먹는 편이나 이 오지에서 배탈이라도 나면 안 될 것 같아 아주 정중히 사양.
 나를 위해 젖을 짜시는 이 부락 큰 마님.
나를 위해 젖을 짜시는 이 부락 큰 마님.그럼 야채는 안 먹나?
이렇게 물으니 손을 내저으며 질색을 한다. 야채는 소나 양이나 먹는 것이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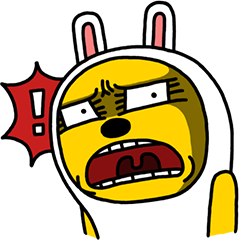
야채를 전혀 안 먹고 우유와 소피, 고기만 먹고도 건강할 수 있다니. 그 비결은 뭘까?
1964년 의대로 유명한 미국 Vanderbilt 대학의 젊은 조교수 였던 Mann은 마사이 부족의 성인 4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를 발표해 학계에 센세이션을 불러 일으켰다. 내용인즉 많은 양의 동물성 지방을 섭취하는 마사이에게서 폐색성동맥경화를 전혀 발견할 수 없었던 것 (Mann et al., 1964). 동물성 지방의 섭취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폐색성동맥경화를 유발한다는 기존의 연구를 뒤집은 것이다.
Mann 교수는 마사이 특유의 낙천적인 성격과 높은 운동량이 그 원인 일 것이라고 추정했는데 후속 연구를 보면 그리 간단한 문제만은 아니었다 (Mann & Spoerry 1974; Mann et al. 1972).
 내가 방문한 마사이 부락의 소들. 마사이가 키우는 소들은 제부(Zebu)라는 품종인데 가뭄을 잘 견딘다고 한다.
내가 방문한 마사이 부락의 소들. 마사이가 키우는 소들은 제부(Zebu)라는 품종인데 가뭄을 잘 견딘다고 한다.운동
그럼 운동때문인가? 마사이가 다른 부족에 비해 월등히 높은 운동량을 소화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Christensen et al., 2012). 그러나 마사이의 높은 운동량이 심혈관 질환을 줄이는 직접적인 요인이라는 연구 결과는 없었다.
마사이의 경우 식생활, 유전적 영향, 운동량, 낙천적 성격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을까 싶다. 물론 일반적으로 운동이 심혈관계 질환 치료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로 잘 밝혀져 있다 (Heran et al., 2011).
 울타리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는 마사이 부락의 강아지들
울타리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는 마사이 부락의 강아지들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마사이 워킹 슈즈라고 해서 바닥이 둥근 신발이 유행했던 걸로 알고 있다. 마사이족은 마사이 워킹 슈즈를 신을까?
마사이족은 신발을 아예 신지 안는다. 아래 사진을 보자. 손님을 맞기 위해 나오는 이 부락 마님들. 모두 맨발이다.

그러나 장거리를 걸어야 할 때는 마사이도 신발을 신긴 한단다. 전통적으로는 소가죽으로 만든 샌들을 신었고 요즘엔 폐타이어로 만든 고무 샌들이다. 바닥이 둥근 신발 같은 건 마사이 부락에서 찾아 볼 수 없다.
공동체
마사이는 기본적으로 일부 다처제인데 종종 한 여자가 남성 또래 공동체와 결혼하는 일처 다부제도 보인다고 한다. 가부장적인 문화라 부락의 남자 어른이 부락의 모든 주요 사안을 결정한다고. 남자가 결혼을 위해서는 지참금을 내고 다른 부락 처녀를 데려오는데 지참금은 다름 아닌 소.
 이 부락의 아녀자들. 왼쪽에서 두 번째 분이 이 부락 큰어르신의 첫 째 부인이시자 부락의 큰 마님 이시다.
이 부락의 아녀자들. 왼쪽에서 두 번째 분이 이 부락 큰어르신의 첫 째 부인이시자 부락의 큰 마님 이시다.마사이는 다른 부락에서 또래 남자 손님이 찾아 오면 남편이 손님에게 자신의 침실을 내주는 관습이 있다는데 손님과 잠자리를 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아내가 결정한다고 한다. 만약 그렇게 아내가 손님의 아이를 임신해 출산을 하게 되면 그 아이는 남편의 아이가 되어 남편은 손님에게 은근 고마워한다고. 마사이 사회에선 자식이 많은 집이 존경을 받기 때문이란다.
마사이는 15년 마다 십대와 이십대 청년들을 모아 할례를 시키고 몇 달 동안 만야타(manyatta) 라고 부르는 보마 밖 임시 움막에 살게 한다.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만야타에 사는 동안 청년들은 맹수들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 된다. 이 과정을 거친 청년들만이 일-뮤란(Il-murran)이라는 전사계급으로 승진하게 된다. 기존의 전사계급은 청년 장로계급으로 승진.
멋진 전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보면 과거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 성인이 될 남성의 수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도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일부다처제 사회를 평화롭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인이 되기 전 남자의 사망률이 또래 여자의 사망률 보다 월등히 높아야 한다. 과거 청년들이 전쟁, 수렵, 채집활동 등을 맡아 할 때는 성비 불균형이 자연스럽게 유지되었는데 유목을 하게되면서 청년 남성 사망률이 급격히 줄었다. 지금은 대부분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할례를 받기 전 청년들에게 사자를 잡아오게 하는 풍습도 있었단다. 모두 인위적으로 성비불균형을 조장해 일부다처제라는 체제를 유지하려는 수단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다.
주거
가시나무 울타리 안에 흙과 쇠똥, 나무로 지은 움막이 열 채 정도 되는 것 같았다.

울타리는 허술한 것 같지만 사자와 같은 맹수들이 울타리를 넘어 들어오지 못한다고 한다.

밤이면 이곳도 꽤 추워진다. 그러면 움막 안에서 불을 피우는데 특이한 것은 굴뚝이 없다는 점. 내가 방문했을 때도 비가 와서 제법 쌀쌀했기 때문에 움막 안에서 불을 피웠다. 나는 매캐한 연기가 꽉 찬 움막 안에서 숨이 막혔는데 마사이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았다.

마사이 친구
나와 주로 얘기했던 마사이 친구는 20대 초반의 훈남이다. 이 친구가 영어를 할 수 있었던 덕분에 의사소통이 가능했다.
 내가 주로 얘기했던 친구. 훈남에 성격 쿨하고 치아가 연예인 미백하고 교정한 것처럼 희고 고르다.
내가 주로 얘기했던 친구. 훈남에 성격 쿨하고 치아가 연예인 미백하고 교정한 것처럼 희고 고르다.싱글 싱글 웃으며 씩둑꺽둑 얘기도 잘 한다. 만나자마자 자기가 자는 움막 안도 보여주고, 자긴 아직 가진 소가 많이 없어서 장가를 못 들고 있다는 얘기, 지금 중학교 수학을 배우는데 너무 어렵단 얘기, 학교까지 두 시간 정도 걸어 간다는 얘기 등 등 참 많은 얘기를 해 준다. 그러면서 우리는 금세 친해졌다.
나보고 비행기 탔던 얘기를 해 달란다. 자기도 언젠가는 꼭 타 보고 싶다고. 그렇게 우리는 한 세 시간을 떠들었던 것 같다.

이 친구와 얘기하면서 공감(共感)이란 단어가 새삼스러워졌다. 이역만리, 오지 중에 오지에서 만난 이 친구는 나와는 너무나도 다른 문화와 가치관 속에서 살아 왔건만 대화를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서로 쉽게 공감할 수 있었으니 어찌된 일인가?
그런가 하면 같은 문화, 같은 직장에서 십 년 넘게 같이 일해온 동료나 상사, 또는 한 지붕 밑에서 몇십 년을 같이 산 가족이라도 이따금씩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쉽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
나는 그것이 '기대'나 '바람'의 차이가 아닐까 한다. 나는 이 친구를 만날 때 아무 기대나 바람이 없었다. 우리 문화를 모르는 이 친구에게 존댓말이나 먼저 앉을 것을 권하는 것을 바랄 수는 없다. 그러나 같은 문화 속에서 만나는 사람은 세대, 직위, 관계의 틀에서 서로 어떻게 행동하고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지에 대한 프로토콜이 정해지고 거기서 벋어 나면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은 아닌지, 나를 제대로 대우해 주지 않는 것은 아닌지 초조해하게 된다. 바로 예절이라는 규칙이 만드는 행동과 감정의 경직성이다.
이것은 마치 일본 사람들과 저녁자리를 할 때 일본어를 아예 못한다고 하면 그들의 세세한 관습을 따르지 않아도 전혀 개의치 않고 거리낌 없이 얘기하지만 괜히 어줍지 않은 일본어를 떠듬거리다가 그들의 관습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지적을 받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본인 경험). 그 나라 말을 하게되면 알게 모르게 그 나라의 예절과 관습에 따라 행동 할 것이라는 기대를 심어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떨 땐 가까운 사람들과 대화하며 공감하기가 오히려 더 어렵다고 느끼는 것이 아닌가 싶다. 예의라는 틀안에서 상황에 따라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말을 들어야 할지가 모두 '기대'한 대로만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대화는 마치 영혼 없이 서로 대본을 읽어내려가는 연극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대화에선 '공감'이 설 자리가 없다. 대화는 서로에 대한 어떤 기대도 없이 마음과 마음으로 하는 의사소통이 되어야한다. 이게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다.
가끔 가까운 사람과 대화가 안된다고 느낄 땐 이 친구를 생각하며 기대와 바람을 모두 내려 놓는 노력을 해 봐야겠다.
인용문헌
Christensen, D. L., Faurholt‐Jepsen, D., Boit, M. K., Mwaniki, D. L., Kilonzo, B., Tetens, I., ... & Brage, S. (2012). Cardiorespiratory fitness and physical activity in Luo, Kamba, and Maasai of rural Kenya. American Journal of Human Biology, 24(6), 723-729.
Coast, E. (2001). Maasai demography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London, University College London).
Heran, B. S., Chen, J. M., Ebrahim, S., Moxham, T., Oldridge, N., Rees, K., ... & Taylor, R. S. (2011). Exercise-based cardiac rehabilitation for coronary heart disease. Cochrane Database Syst Rev, 7(7).
Mann, G. V., Shaffer, R. D., Anderson, R. S., Sandstead, H. H., Prendergast, H., Mann, J. C., ... & Dicks, K. (1964). Cardiovascular disease in the Masai.Journal of atherosclerosis research, 4(4), 289-312.
Mann, G. V., & Spoerry, A. (1974). Studies of a surfactant and cholesteremia in the Maasai. The American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 27(5), 464-469.
Mann, G. V., Spoerry, A., Gary, M., & Jarashow, D. (1972). Atherosclerosis in the Masai.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95(1), 26-37.
Ntz.info. (2015). 1997-02-14. "Rinderpest" Retrieved 2015-10-11.
참고: 마라의 마사이족 인구
마사이 마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역사적으로 마사이족의 삶의 터전이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마사이는 19세기 말까지 케냐 북부에서부터 탄자니아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서 반유목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04 체체 파리와 마사이 이야기에서 얘기한 우역(牛疫: rindefest)이 휩쓸고 지나가면서 90%의 가축이 폐사하자 극심한 기아에 빠진다. 설상가상으로 천연두까지 유행해 당시 마사이의 약 3분의 2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Ntz.info, 2015).
우역이 잠잠해 지자 이번엔 1913년 영국 식민지배자들이 마사이를 마라 평원이 위치한 나록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켰다. 그러나 체체파리가 옮기는 트리파노소마증(trypanosomiasis) 때문에 마라 평원은 사실상 거주가 불가능했다. 때문에 1940년대 중반 까지 나록 지구의 마사이 인구는 2만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Coast 2001).
1960년 들어 트리파노소마증이 수그러들자 마사이는 다시 마라 평원을 되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1974년 이번엔 케냐 공화국이 마라 평원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마사이의 거주와 유목을 제한한다. 다시 마라 평원 밖으로 내 쫓긴 마사이. 그래서 마사이는 원칙적으로 마사이 마라 보호구역 내에서 거주할 수 없다.
그러나 트리파노소마증이 구제되고 유아 사망률이 감소하면서 1960년대 이후 마사이의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1989년 인구조사에 의하면 나록지구의 마사이 인구는 18만 8천 명. 2만을 조금 넘었던 1940년대 중반에 비하면 8배가량 늘어난 숫자다 (Coast 2001). 더 넓은 방목지가 필요한 마사이족은 마사이 마라 국립보호구내로 들어와 가축을 먹인다거나 아예 보호구 내에 보마를 치는 일이 잦아졌다. 그러면서 야생동물 보호단체와 마사이의 갈등도 불거졌다. 최근 정부에서는 마사이에게 유목 대신 보호구 밖에서 농경을 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 관광 및 여행업, 상업으로 전향한 마사이의 인구도 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