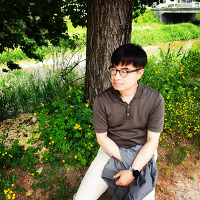헌혈을 했다, 오랜만에
간절히 원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다.
지인의 가족이 위급하다는 호소문이 단체 메신저 창에 떴다.
중환자실에 누워 피가 오기만을 기다린다 했다.
다행히 내 피는 누구에게나 줄 수 있는 타입이라 고민 없이 하기로 했다.
급히 병원까지 찾아갈 필요도 없었다.
가까운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에 가니 몇 가지 검진 후에 바로 피를 뽑을 수 있었다.
혈액도 실시간 이체가 된다는 걸 처음 알았다.
그걸 지정 헌혈이라 한다. 원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기부.
군대에서 처음 헌혈을 했다.
강압적 분위기라 숭고한 의미라거나 그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내무반 앞마당 헌혈 버스에서 피를 뽑고 초코파이를 받았다.
엄지로 알코올 솜을 꽉 누른 채 밤나무 아래서 달콤한 과자를 먹었다.
더 이상 초코파이는 필요 없는데 그 이후에도 누군가를 위해 몇 차례 피를 뽑았다.
주사를 무서워하지만 그 따끔한 순간만 지나면 뭔가 나른하고 시원한 느낌.
그리고 썩 훌륭한 사람이 된 기분.
집에 와서 밥 먹다 자랑삼아 헌혈한 이야기를 했더니 할머니가 무섭게 화를 내셨다.
왜인지 몰라 민망하고 야속했는데 나중에 내 아이의 첫 헌혈증을 보았을 때 나도 이유를 알았다.
이런 마음. 그래서 그런 것이다.
피는 인공으로 만들 수 없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므로 피가 필요하면 전적으로 산 사람의 기증에 의존해야 한다.
그래야 죽어가는 이를 살릴 수 있다.
오랜만에 헌혈하고 기도했는데 안타깝게 내 피는 누군가를 구하지 못했다.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다.
*
20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