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 잡히잖아요! 얼른 일어나요!!!”
“따라 잡히잖아요! 얼른 일어나요!!!”
2016년 9월 우리는 말로만 듣던 스페인의 산티아고 길을 걸어보기로 결심했다. 한국에서 배낭을 비롯하여 순례길 여정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여러 가지 물품들을 준비해서 배낭에 잘 담아 드디어 파리로 향하는 비행기를 탔다. 파리에서 시차 적응을 하며 필요한 추가 물품을 준비하고 기차를 타고 프랑스길의 시작점인 생장으로 향했다.
사실, 한국에서 생장까지 가는 길은 우리가 실제로 걸은 프랑스 길보다 훨씬 먼 거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장까지 이동하는 동안 한 번도 배낭이 무겁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순례자로서의 경험이 없는 우리가 막연한 불안감과 필요할 것이라는 추측에 이것저것 주어 담은 덕에 배낭은 무거워질 대로 무거워졌지만, 그 무게는 우리 대신, 때로는 비행기가, 때로는 기차가 감당해주었다. 우리는 그저 비행기를 타러, 기차를 타러 가는 동안 잠깐잠깐 그 배낭의 무게를 맛만 보는 정도면 충분했다.
막연한 기대감과 함께 도착한 생장은 이제 막 순례길을 시작하려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순례자들로 북적이는 크지 않은 마을이었다. 우리도 여느 순례자와 마찬가지로, 한편으론 세계적인 관광지에 도착한 여행자처럼 설레고 있었다. 우리는 곧바로 산티아고 순례길의 안내를 하는 순례자협회의 공식 사무소에 들렸다. 순례자 여권을 받고, 순례길에 대한 안내를 받는 중에 각자 배낭의 무게를 재어볼 수 있는 저울을 발견했다. 나는 남편과 내 배낭이 각각 10kg가 넘는 것을 보고도 걱정을 하기보단 여전히 신나고 들떠 있었다. 나는 정말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순례자였던 것이 분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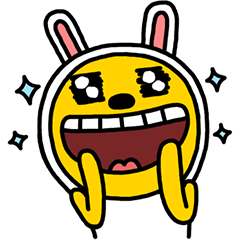
한술 더 뜬 것은 첫날 우리의 행보였다. 보통 순례자들이 첫날 생장에 도착하면 생장에서 그대로 하루를 잘 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출발해서 론세스바예스에 있는 수도원까지 20km가 넘는 거리를 하루 만에 걷는 일정을 소화한다. 이 구간은 험준한 피레네 산맥을 도보로 넘는 것인 데다, 생장에서 출발한 지 얼마 안돼 만나는 작은 숙소들 외에 피레네 산맥을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하면 숙소는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첩첩산중이기 때문이다. 결국 첫날은 어쩔 수 없이 모두가 긴 거리를 걸어야 하기에 첫날은 생장까지 오는 동안 소진된 체력을 잘 보충하고 다음 날부터 시작될 진짜 순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2016년 9월 중순 무렵, 서울역 근처 게스트하우스를 나오며, 땀도 안 나고, 신상 장비를 갖추고, 깔끔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2016년 9월 중순 무렵, 서울역 근처 게스트하우스를 나오며, 땀도 안 나고, 신상 장비를 갖추고, 깔끔함을 유지하고 있었다하지만, 우리는 순례자 여권을 받자마자, 생장 마을도 한번 안 둘러보고 순례길로 향하는 생장 마을의 출구를 나서버렸다.
물론 남편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는 상당히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남편은 이때 군대에서 행군의 경험을 하는 남자의 경우와 달리 배낭을 메고 장거리를 걸어본 적이 없는 내가 걱정이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다른 순례자들처럼 첫날 20km 넘는 거리를 다 소화하려다간 산 중에서 퍼지게 될지도 모르니, 첫날 조금이라도 걸어두자고 제안을 한 것이다. 나는 충분히 설득력 있는 말이라 생각되어 생장에서 6km 정도 떨어져 있는 훈토까지는 오늘 당장 걸어내는데 동의하고 같이 걷기 시작했다. 결국, 지금 생각하면 우리는 순례자 여권을 받고 공식적으로 순례자가 된 지 만 하루도 안된 날 이미 순례길에 발을 내디뎠던 것이다.
첫날 우리의 순례길은, 아무 훈련도 없이 온 우리를 제대로 훈련이라도 시키려는 듯이 가혹했다. 나는 평생 10kg 넘는 배낭을 메고 평지조차 걸어본 적도, 그런 배낭을 메고 30분 이상 서 있어 본 적도 없었다. 그런데 생장을 나서자마자 맨몸으로 걸어도 힘든 급경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비까지 오기 시작했다. 모자에, 우비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을 것 같은 큰 배낭에. 아마 우리는 겉보기에 이 모든 상황을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이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넘치는 의욕을 충분히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순례자로 보였을 것이다.
 2016년 9월 중순 무렵, 서울역 공항철도 타는 곳 근처에서, 힘들다고 느꼈을 때는 사진 한 장조차 기록으로 남길 수가 없었다.
2016년 9월 중순 무렵, 서울역 공항철도 타는 곳 근처에서, 힘들다고 느꼈을 때는 사진 한 장조차 기록으로 남길 수가 없었다. 하지만, 나는 첫날 한 발짝 한 발짝 디딜 때마다, 생각하고 있었다.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나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이렇게 내가 800km를 걸을 수 있을까'
'지금이라도 돌아갈까'
'지금이라도 다른 여행지로 가자고 남편한테 이야기해볼까...'
겉으로는 이 길에 대해 매우 확고한 마음가짐으로 걷는 것 같아 보였겠지만,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망설이고 있었고 후회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800km를 한 달 넘게 걸을 생각을 하니 눈 앞이 캄캄했다.
그러다, 거친 숨을 내 쉬며 등산용 스틱에 온 몸을 의지하고 거의 기어가다시피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한 남편이 잠시 배낭을 내려놓고 쉬자고 제안했다. 비가 오는데도 바로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배낭을 내려놓고 길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았다. 주저앉아서 우리는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지금이라도 돌아갈까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800km,,, 이게 가능하겠어요?”
“전 못하겠어요………………….”
나는 이건 불가능하다, 무모하다, 난 못하겠다라며, 남편에게 나의 고통을 토로하다, 문득 우리가 방금 걸어온 길을 돌아봤다. 우리처럼 힘겨워하며, 하지만 상당한 속도로 성큼성큼 키 큰 순례자 둘이 함께 걸어 올라오고 있었다.
그때 나도 모르게 남편에게 외쳤다.
“따라 잡히잖아요! 얼른 일어나요!!!”
남편도 나의 갑작스러운 외침에 놀라서 벌떡 일어나다, 갑자기 허허 웃으며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