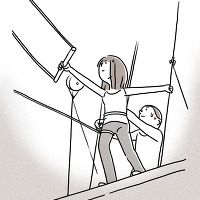소설 _ 19. 언젠가 그런 날 (최종)
소설 _ Flight to Denmark 19.
나는 늘 달을 보며 포기하지 않고 달콤한 선물을 달라고 조르는 어린애 같았다. 어쩌면 눈치 없이 욕심을 내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이었을지도 모르는데 알고도 모른 척, 자꾸만 넘어지고 고꾸라지기만 하는 삶에 빛을 내어 달라고 바라고 또 바란 것이다.
어쩌면 사람들의 기도는 대상 없는 자기 구현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스스로 세운 목적을 향해 외치는 함성에 불과한 것을 신화적 사고의 힘을 빌어 희망을 더하는 의식으로 구분하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세상에 모를 것이 너무 많은 것이, 어느 날 내 꺾이지 않는 의지가 작용되어 나타난 현상인지 아니면 이윽고 달님이 내 끈질긴 기도를 들어주어 준 덕분인지 모를 일이 일어났다. 부모에게 받은 결핍의 유산과 바보 같은 오기로 엮어낸 세 번째 책이 어찌어찌 나오게 되더니 세상의 인정을 받게 되는 일이 생긴 것이다.
제풀에 지쳐 쓰러지길 반복하면서도 포기하지 못한 미련의 보상일까? 세상에서 다하지 못한 내 부모의 선물일까? 나는 갑자기 벌어진 눈앞의 현실이 한동안 믿기지 않았다.
형석의 손을 잡고 있자니, 모든 것을 나의 기도와 내 의지로만 이뤄낸 일인 듯 생각한 것이 미안해지고 말았다. 가게의 일을 마치고 들어와서 지친 기색 없이 다정한 이야기를 나누어 주는 사람, 듀크 조던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기운을 북돋아 주던 사람의 덕 임을 제일 먼저 떠 올렸어야 하는데 말이다. 그리고 오랜 세월 내 글을 읽고 응원해 준 가족 같은 사람들. 세상의 신의와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보이지 않는 그들 곁에서 지금 나는 얼마나 행복한가.
늘 묵묵하지만 살가운 그들은 서점 매대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구석에 끼었다 사라지는 글을 쓸 때에도 어디에선가 나의 곁에 있어 주었고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주었던 사람들. 내 글의 독자들은 분명한 목소리를 내주고 응원을 마다하지 않았다. 또 게으르고 지친 모습으로 돌아올 때에도 가족보다 친구보다 더 넓은 마음으로 곁을 내주었다. 이것이 내게 있는 기적이고 보람이 아닐까?
새해가 밝아 온 어느 이른 아침 일어나자마자 책 한 권을 엄마 아빠 사진 앞에 놓고 가볍게 웃어 보여 주었다. 사진 속의 젊고 사랑스러운 내 부모가 기꺼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집을 나서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강변을 걸었다. 이 강변 즈음에서의 슬픈 기억은 가슴에 묻고 갈 수 있는 날이 언젠가 오겠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애써 지우려고 돌아보지 않는 망각이 아니라 죽은 이들과 내 영혼을 위로하고 보듬으며 잔잔한 마음을 갖게 되는 머지않은 어느 시점의 날이 그려진 것이다.
아름다운 노을에 집중하며 붉고 저녁의 빛을 눈에 담았다. 그리고 지나갈 뿐인 모든 것은 다 아름 다운 것인가 슬픈 것인가 멀리로 시선을 향하며 다시 한번 물었다. 바람이 찰 뿐이었지만 그렇게 조금 더 걸었다.
이것이 삼 년 전의 이야기이고 내 나이 마흔다섯의 끝자락이었다.
.
글 반디울
글의 연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