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희망! _
모로코 피자에는 치즈가 없다?
여행을 통해 희망을 발견하기 : 이른바 "헬조선"을 벗어던지기 위한 여행
찬란하게 아름다운 모로코
얼마 전, 모로코에 갔을 때의 일이다.
내가 보았던 모로코는 첫 번째로는 색상의 도시였다. 도시 곳곳이 형형색색의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아름다운 색상이란 디자인적인 색상이라기보다는, 삶이 물든 색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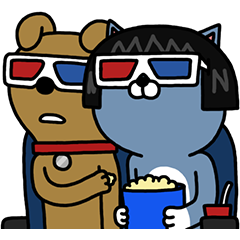
영화를 보는 것과 같은 아름다운 색상이 펼쳐진 곳! 모로코!
여러 색의 염색을 하고 있는 페즈의 염색공장이나, 에사이우라 해변에 물든 눈이 부실 정도로 파란 고기잡이 배의 모습, 그리고 다양한 색의 작은 물품들을 파는 상인들에게서 나는 정말 삶이 녹아든 아름다운 색상을 보게 되었다.
 모로코 페즈는 가죽 염색을 위한 다양한 색상이 펼쳐져 있다
모로코 페즈는 가죽 염색을 위한 다양한 색상이 펼쳐져 있다 고기잡이 배 조차도 아름다운 모로코의 에사우이라
고기잡이 배 조차도 아름다운 모로코의 에사우이라 물건 하나하나도 어쩌면 이렇게 색상이 아름다운지.. 하마터면 지름신이 강림할 뻔 했다
물건 하나하나도 어쩌면 이렇게 색상이 아름다운지.. 하마터면 지름신이 강림할 뻔 했다두 번째 모로코의 인상은 단연 고양이였다. 숙소에서 조식을 먹고 있으면, 어디선가 나타나 한 입 달라고 나와 눈을 마주치는 녀석들, 숙소 앞에서 다소곳이 손을 모아 졸고 있거나, 아기 고양이들이 함께 엉키어 서로의 체온을 전달하고 있는 녀석들, 아이에게 젓을 물리며 사람을 경계하는 녀석들 등 모로코의 고양이들에게는 미안하게도 나는 그들의 영역을 잠시 침범하였다.
 나는 숙소 지킴이.. (인데 왜 이리 졸리냐)
나는 숙소 지킴이.. (인데 왜 이리 졸리냐) 에잇. 결투 신청이닷!
에잇. 결투 신청이닷! 추워!!! 이리와!!
추워!!! 이리와!!
고양이들아! 발길을 잡지 말아줘어어~~~
모로코를 무시한 부끄러움
그러한 모로코의 도시 중 마라케시에 갔을 때의 일이다. 모로코 마라케시는 제마 엘프나 광장이라는 그야말로 혼돈과 공존이 있는 도시이다. 제마 엘프나 광장에는 온갖 기괴한 공연과 상점이 함께 어우러져 한 바탕 축제를 벌이고 있었다.
 마라케시의 유명한 혼돈의 광장! 제마 엘프나!!
마라케시의 유명한 혼돈의 광장! 제마 엘프나!!조금은 조용하게 저녁식사를 하고 싶어, 광장에서 떨어진 마라케시 기차역 주변의 피자 가게에 갔을 때의 일이다. 배고파서 가장 피자의 기본이 되는 마르게리따 피자와 올리브 파스타를 주문하고 음식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얼마 후 피자가 나오는데, 피자라기보다는 너무 오래 구워 딱딱해져 버린 데다가, 치즈가 하나도 없는 피자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피자라니 한 말을 잃어버렸다.

피자가 뭐 이러냐!!!!
그리고 같이 피자를 먹던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모로코 피자는 치즈가 없나봐. 아마 얘네는 피자를 잘 모르는지도 모르겠어”
괜히, 이게 피자냐고 그러면 그들을 무시하는 것 같아, 한 사람당 한두 조각을 베어 물고 있던 차였다. 그제야 올리브 파스타와 마르게리따 피자가 나오는데, 어디서도 볼 수 없을 만큼 풍부한 치즈가 깔려있는 피자가 나온 것이다.
순간 우리 얼굴이 빨개졌다. 겉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모로코를 무시했다는 생각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다.
‘이런 바보 같은... 그렇게 여행을 다니면서 남을 이해해야 해! 배려해야 해!
하면서 고작 피자로 그 나라와 지역을 무시하다니!’
알고 보니, 처음 준 피자 아닌 피자는 모로코의 전통 피자였고, 우리에게 서비스를 내준 것이었다. 남의 음식과 문화를 함부로 무시하다니, 여행은 역시 자랑질이 아니었음을 여실히 느낀 순간이었다.

아... 진짜 할 말이 없다 ㅠㅜ
여행은 삶의 축소판이다
문득 뇌리에 스친다.
“여행이라는 것도 역시 삶의 축소판이구나”
내가 오만하게 생각하고, 먼저 판단해버리면 그걸로 전혀 엉뚱한 결과를 내버리는 것이 여행이고, 삶인 듯하다. 내까짓게 뭐라고 모로코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였는지 부끄러웠고,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여 상처를 주었던 일은 또 얼마나 많았던가.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다.
인도영화 “굿모닝 맨하탄(원제: 잉글리쉬 빙글리쉬)”는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무시당하는 영어를 못하는 한 여인이 맨하탄에 가서 영어를 배우며 자신감을 찾고 사랑을 하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이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이 배우는 영어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바로 “저지멘탈(judgemental)”이다. 즉, 함부로 판단을 해버리는 편견이나 선입견 따위를 말한다. 영화 마지막에 조카 결혼식에서 조카에게 들려주는 결혼에 대한 덕담에서 바로 이 단어를 써서 이야기를 한다.
 굿모닝 맨하탄 포스터 - 발리우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꼭 보길 권해드린다 ^^
굿모닝 맨하탄 포스터 - 발리우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꼭 보길 권해드린다 ^^“가족은 절대 단정 지으면 안 돼(Family never be judgemental). 가족은 서로를 무시하거나, 서로를 하찮게 대해선 안 돼. 가족은 절대 서로의 약점을 비웃어선 안 돼. 가족은 언제나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곳이어야 해”
편견과 배려 사이에서
편견의 반대말을 찾기는 쉽지 않다. 내 생각에 편견의 반대말은 배려일 듯 싶다. 편견을 갖지 않는 것은 단지 내 스스로가 치우친 생각을 갖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스스로 치우치지 않으려면 상대방을 보다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 노력을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않고 그저 바라봐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편견의 반대말은 (사전적으로는 아닐지라도) 배려라고 함이 어떠할까?
사회에서 배려가 사라지면 그 사회는 자신만을 기억하게 된다. 내가 아니면 모두가 적이 되어 버린다. 우리 사회의 최근 들어 나타나는 캣맘, 맘충, 김치녀, 된장남, 김여사 등은 다양한 증오 단어들은 어쩌면 이러한 적개심의 표출 아닐까?
혼자 하는 여행이 아니고서야, 여행은 곧 배려이다. 여행은 짧은 시간 동안 아주 가까이 함께 하는 시간이다. 일상생활보다 더 압축되어 함께 하는 행동하게 된다. 함께 여행하는 사람과 같이 가고, 같이 먹고, 같이 자려면 서로의 목소리를 들어주려 하고, 내 목소리는 조금 덜 내는 편이 좋다. 나 역시 그러한 배려가 안 되어 여행을 가면 동행자와 싸우는 일이 적지 않다. 여행은 서로 배려하면 좀 더 편해지게 마련인데 말이다.

이런 난폭한 모습은 동행하는 여행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해도 여전히 이런 나를 발견한다)
그래서 좋은 여행은 서로를 알아가고, 배려하는 여행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여행을 간 곳의 사람과 문화에 대해서도 배려하고 이해하는 노력도 요구된다. 이 노력이 다시 일상으로 오면 사회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토대가 될 것이며, 보다 서로를 이해하는 배려있는 사회가 되리라 여겨진다. 헬조선이라고 불리는 이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어쩌면 각박하여 나만 알고 남에 대한 배려는 사라진 점이 아닐까? 여행을 함께 하면 이 배려가 조금씩은 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