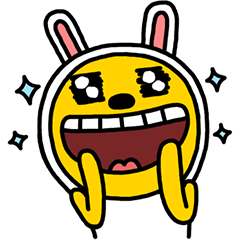호영은의 비밀
#11 오락실에 간 영은이
6학년 겨울방학이 되자 나는 매사에 시큰둥해졌다.
사춘기의 시작이었을까.
텔레비전에 나오는 삐삐 시리즈에도 시시했다.
내 눈에 비췬 삐삐는 너무 못생기고 독특하고 이상해 보였다.
내가 방학이라고 해봐야 할 수 있는 것은 하루 종일 이불 하나 걸치고 책을 읽거나,
수시로 연탄 배달전화를 받거나,
오후가 되어 텔레비전 보는 정도였다.
마음이 답답해진 나는
옷을 걸치고 밖으로 나갔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소금기와 만나
얼굴을 할퀴는 것 같았다.
"아따, 춥다. 진짜 춥대이."
여름엔 생선이 상하는 듯한 역겨움과
미역의 비릿함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강한 냄새보다는
겨울의 청량한 바람이 나았다.
나는 동네 이곳저곳을 쑤시고 다녔다.
사방으로 뻗은 골목을 다 다녀보지도 못했다.
혼자는 무섭기도 했다.
마침 밖에 나간 그날,
대로변에서 한 남성이 은행가는 길을 묻기에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인사하고 헤어지려던 찰나,
그 사람 손이 나의 아랫부분을 만지려 해서
순간 얼어버렸었다.
다행히 살짝 빗나갔다.
나는 조금씩 남자들을 무서워하게 되었다.
나는 사람의 눈빛이 이상한 게 어떤 건지 어렴풋이 알게 되었다.
남자만 보면 겁이 났다. 학교에서도 남자아이들과는 놀지 않았다.
오락실엔 반의 개구쟁이 남학생들이 드나들었다.
나는 오락실에 가볼 생각은 해보지 못했다.
주로 남학생들만 북적이는 곳이었으니까.
그런데, 추운 겨울 방학의 그날 우주오락실이 눈에 들어왔다.
언젠가 가 보리라.
국민학교 앞, 쭉 늘어선 문방구 앞에 있던 미니오락기보다
게임기도 종류도 많고 온갖 뽕뽕, 삐리리 소리들이 울러 펴졌다.
주로 남학생이 많으니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런데 3월 학기가 시작되어
새로운 단짝 명희와 다니면서부터
나는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되었다.
명희는 쉬는 시간이 되면
학교 매점에 가서 만두도 사주었고,
나는 늘 명희와 붙어 다녔다.
나는 따로 단짝까진 있지 않았는데,
명희와 함께 화장실도 가고
하교 후엔 명희 집에 가서 라면도 끓여 먹었다.
명희의 새엄마가 밥도 차려 주었다.
명희네에서 새엄마는
다른 아줌마들을 불러다 화투판을 벌렸다.
나는 엄마가 늘 집안에서 집안일하는 것만 봤다.
연탄일 하면서부터 더 바빠졌지만,
우리 엄마와 사뭇 다른 명희 새엄마를 보고 깜짝 놀랐다.
명희의 새엄마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처럼 얼굴이 조그맣고,
집안에 있을 때도 곱게 화장을 했다.
새빨간 립스틱을 발랐다.
불친절하진 않았지만, 정스러운 느낌은 없었다.
명희는 너구리 라면을 기막히게 잘 끓였다.
그리고 너구리 게임도 잘했다.
명희를 따라 나도 너구리부터 시작했다.
문방구 앞에선 20원으로 가능했다.
똑같이 시작해도 명희는 30분 이상을 하고,
영은이는 처음부터 괴물에게 잡히니
참 답답한 노릇이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승부욕.
나는 명희만큼 잘하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주 가는 수밖에 없었다.
명희와 우주 오락실에도 몇 번 가보니,
역시 오락실에서 하는 재미가 더 좋았다.
한 번 가보니 그다음은 너무 쉬운 거다.
 너구리 마지막 맥주 단계
너구리 마지막 맥주 단계그렇게 나는 오락실에 자주 가게 되었다.
학교 마치고 나면 꼭 한 번 들렀다.
한 판에 50원이었다.
오락실 안이니 다른 사람들이 볼 수도 없을 거라 여겼다.
내가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게임기 화면에 눈에 아른아른거렸다.
다음날엔 더 잘해보리라.
다짐하며 복기하고 고민했다.
살짝 정신이 나간 느낌이 나쁘지 않았다.
처음에는 100원을 들고 가서 딱 두 판만 하자 싶었다.
그런데 잘 못하니까 너무 빨리 끝나버리는 거다.
조금씩 금액이 늘어나고 이전보다 더 자주 가게 되었다.
책이고 뭐고 오락실 생각만 났다.
너구리도 대수롭지 않은 와중에 보글보글이랑 테트리스 등도 너무 재미있었다.
1943은 너무 어려웠다. 오락기 버튼이 다 뭔지도 인지가 안된 상태에서 마구 피하며 눌러대기만 하는 거다.
 보글보글 게임
보글보글 게임아카시아 향기가 코를 찌르던 날,
햇볕은 내려쬐고 중국발 황사가 짙었던 어느 봄날,
내가 학교교문에 들어가는데 아이들이 수근수근했다.
"영은이 오락실 들어가는 게 봤나?"
"그러대, 그럴 아가 아인데."
"모범생도 별 수 없는 기가?"
"선생님한테 꼰지르까?"
급기야 선생님이 하교 후에 나를 불렀다.
"영은아, 니 요새 공부 열심히 안 하네."
"..."
"무슨 일 있나?"
"아무 일 없는데예."
"그라믄 5학년 때 좋던 성적이 와 떨어지노?"
"지는 본래 공부 따로 안 하는데요."
"이제 중학교 갈 건데, 열심히 해야지.'
"예, 알았어예."
나는 담임선생님까지 내가 오락실에 간 것을 알게 된 것이 놀랍고 창피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조금씩 오락에서 손을 뗐고, 발걸음을 끊었다.
명희랑도 예전 같지 않았다.
성향도 관심사도 많이 달랐다.
명희는 나보다 세상 돌아가는 일에 밝았다.
우리 집 보증금이 얼만지, 부모님이 뭐 하시는지 등등 말이다.
세상 물정에 어두운 나는 그런 명희가 대단해 보였다.
여름방학이 다가오던 어느 날, 학교에 다녀와서
집에서 숙제를 하고 있는데, 명희가
남자아이들과 함께 우르르 집에 찾아와서 놀러 가자고 한 이후로
나는 기분이 안 좋았다. 정이 뚝 떨어졌다.
마침 일하다 잠깐 작업복 차림으로 집에 부모님이 들른 차라
너무 부끄러웠다. 명희와 남자아이들은 별 생각이 없었지만,
나는 말도 없이 갑자기 찾아온 친구가 불편했다.
단짝이 생겨서 좋았던 기억도 잠시, 누군가와 너무 가까운 것은 감내할 것이 있었다.
그렇게 나는 명희와도, 또 오락실게임과도 이별을 하게 되었다.
나는 한동안 책 보다 재미있던 오락 대신, 다시 책으로 돌아왔다.
역시 책이 나았다. 읽고 나서 느끼는 감정들이
오락실에서 게임하고 나올 때보다는 확실히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았다.
큰언니가 사다 놓은 책들을 살펴보았다.
헤르만 헤세의 <꼬마 철학자>,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등을 말이다.
무슨 내용인지 알쏭달쏭 하지만 다 읽고 나면 스스로 대견하고 뭔가 알 것 같은 느낌이 좋았다.
하고 나면 허무하고 시간과 돈이 아까운 게임보다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아리송하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마음에 수많은 질문을 쏟아내는 책이 더 나은 것 같았다.
주인공과 셀 수 없이 등장하는 인물들이 조금씩 입체적으로 바뀌는 과정도 좋았다.
명희처럼 맥주까지 가보지 못한 것이 아쉽긴 했지만,
너구리와 보글보글이 있어서 또 재미있게 보낸 날들이었다.
지나치게 빠지지 않는다면 약간의 일탈은 삶을 풍성하게 해 준다.
일찍이 국민학교 시절에 오락을 경험했기에 이후에 다른 게임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다.
지금도 여전히 너구리나 보글보글 아니면 테트리스를 보면 지나치지 못하겠다.
손가락이 근질근질하다.